2017
Jérôme Sans │ A Journey through Immobility
2017
Young Hee Suh │ Geometry of Mind and of Body
2017
서영희 │ 몸과 마음의 기하학
2017
Sungwon Kim │ Archetype of Mind
2017
김성원 │ 마음의 원형
2017
Steven Henry Madoff │ Kimsooja: The Task of Being-Together
2017
스티븐 헨리 마도프 │ 함께-있음의 과제
2017
Hou Hanru │ Create A New Light
2017
후 한루 │ 새로운 빛을 밝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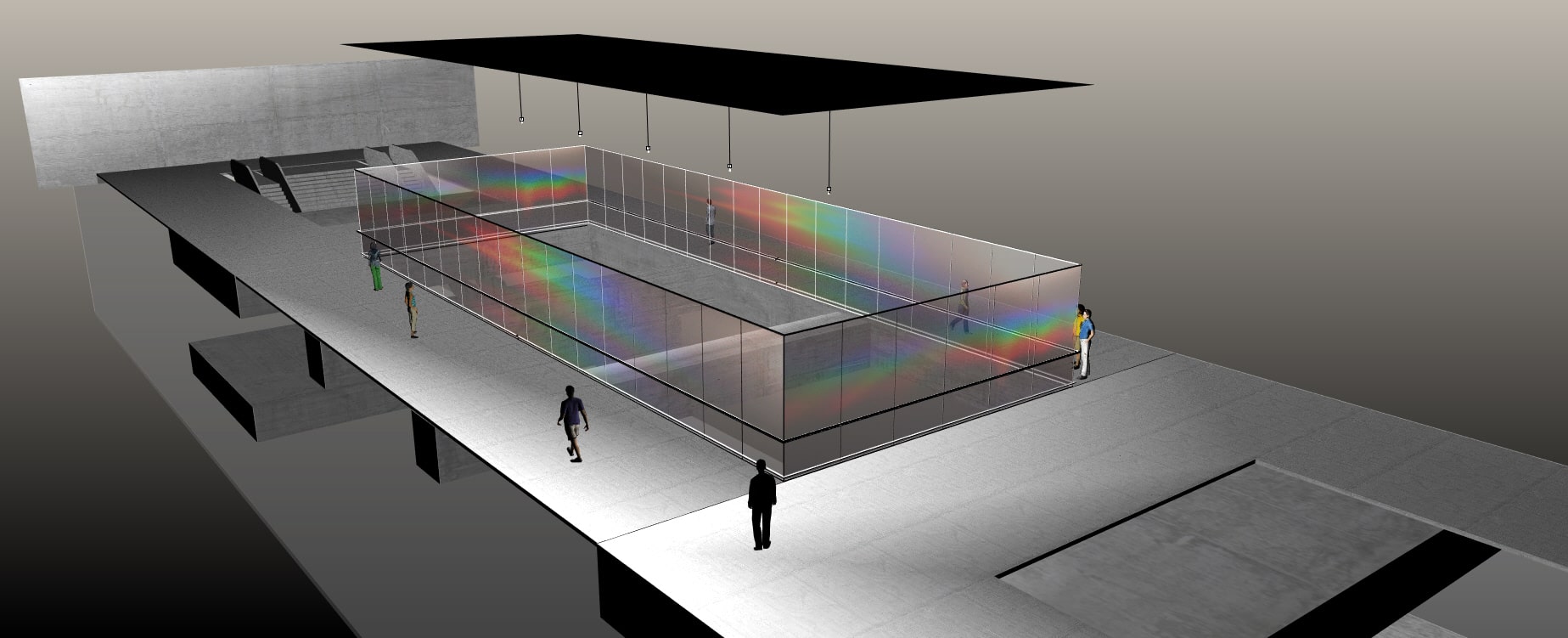 To Breathe, 2017-2021, Rendering of the Site Specific Permanent Installation, Mairie de Saint-Ouen Metro Staion, Paris, France. Commission of the RATP Régie autonome des transports parisiens. Courtesy of the RATP and Kimsooja Studio
To Breathe, 2017-2021, Rendering of the Site Specific Permanent Installation, Mairie de Saint-Ouen Metro Staion, Paris, France. Commission of the RATP Régie autonome des transports parisiens. Courtesy of the RATP and Kimsooja Studio
A Journey through Immobility
2017
-
Jérôme Sans
How would you define your work? -
Kimsooja
I view my work as a threshold: “any place or point of entering or beginning, a magnitude or intensity that must be exceeded for a certain reaction, phenomenon, result, or condition to occur or be manifested.” -
Jérôme Sans
Would you call some of your works self-portraits? Is it important that you yourself are in some works? -
Kimsooja
In some ways, my work could be viewed as a self-portrait. I do not wish to display my personal identity in my work—especially in the video performances when my back is facing the viewer—but the position demonstrated does show a certain kind of identity. I think a person’s back can be one of the most evocative parts of the human body; it isn’t dynamic, but it presents a profound and abstract encapsulation of a person. -
Jérôme Sans
How do you consider the globalized world? -
Kimsooja
A globalized world sounds very positive, dynamic, interconnected: a constant flow of cultural, economic, technological, and intellectual interactions. But we face many visible and invisible divisions created by constant border crossings: racial, economic, political, and religious conflicts. The standardization of daily life under globalism could benefit those who need it most, but we lose the authenticity, spirituality, and the myth of a land and its people. Globalism reduces the uniqueness and specificity of humanity, although new technology will bring a new facet. -
Jérôme Sans
What do you think of migration today? -
Kimsooja
More than five million Syrians have migrated to Greece, Turkey, Germany, and nearby countries; there is a constant flow from Africa to Southern Italy and Spain; people from Mexico and Central and Latin America try to get to the United States. As an artist who has always been concerned with borders, migration, and refugee issues, especially from living near the Korean Demilitarized Zone during my childhood, I am shocked by President Trump’s decision to block borders, deny immigrants a new life in the United States, and deport second-generation immigrants. American citizens have to pay attention to this humanitarian issue, especially since only a few organizations and individuals are focused on the refugee crisis. Major European countries are taking risks to support and help the refugees. Along with global warming, it is the most urgent issue of our time. -
Jérôme Sans
Your work deals with exile and displacement. Do you feel exiled too? -
Kimsooja
Definitely. I have considered myself a cultural exile since 1999. Recently, I’ve collaborated with Korean-specific projects, such as Année France-Corée for a solo show at the Centre Pompidou-Metz in 2015 and the MMCA Hyundai Motor 2016 project. Still, my position as an artist remains that of an outsider rather than insider, even though I’ve been well received. Perhaps it is the fundamental nature of being an artist? -
Jérôme Sans
You have lived in New York for several years, how have things changed for you? -
Kimsooja
Thanks to support from Arts Council Korea in 1992, I was able to participate in the P.S. 1 studio residency program in New York. I met people who understood my work and viewed it objectively, with enthusiasm and generosity. It really opened up possibilities for me. Due to the Korean financial crisis in the late 1990s, I was not able to receive financial and intellectual support for my work. It truly disappointed me and made me realize that I needed to find support outside Korea. -
In the last ten years, this has changed dramatically and Korea is now one of the most supportive countries in the world. However, when I go back to Korea, I am too established to get support from my country. The level of professionalism still needs to be raised, especially in governmental organizations. Where to live, work, and die are big questions. You need a nation to live—but you don’t need a nation to die.
-
Jérôme Sans
The idea of displacement is very present within your work. -
Kimsooja
All good art is made from thinking outside the box. In that sense, having displacement as a condition of life is not a bad choice for an artist. -
Jérôme Sans
In some of your works, like A Needle Woman (1999–2001, 2005, 2009), immobility rather than displacement is present. Is it a way to show personal identity toward the global world? -
Kimsooja
In my practice, the notion of duality and its complex geometry and disorder are always present through my understanding of the world. While I am presenting my immobility, which is impossible in literal terms, a lot of mobility happens in my body and mind, allowing me to reach to the place and moment of my performances. This immobility gives me an anchor to hold onto, so my journey flows through immobility. -
Jérôme Sans
Some of your works and installations are made with bottari, meaning, “to pack for a trip.” Which trip are you addressing? -
Kimsooja
The bottari represent our body and skin, their agony and memory as a wrapped frame for life. Bottari are the simplest way of holding objects or belongings that embody many meanings and temporal dimensions. A trip could be a simple A-to-B, or a relocation, or a separation of a couple in feminist terms, wrapping only the most essential belongings in an emergency—migration, exile, or our final journey: death. -
Jérôme Sans
Do you consider yourself as a nomad? -
Kimsooja
Yes, fundamentally. -
Jérôme Sans
Your work is an invitation to a sensorial and visual trip—a way to travel without moving. -
Kimsooja
We can easily grasp what is going on in this hyper-informed society, but we can’t experience true reality, not in depth. All experiences are limited by the conditions of space and time; I am determined to witness the here and now, living through my eyes and body, sharing my experiences with the audiences. -
Jérôme Sans
In the emblematic work, A Needle Woman, you stand in moving crowds. Who was this needle woman? And who is she now? -
Kimsooja
A Needle Woman is a woman who gazes at the world, gazing at and witnessing the world without acting. She allows us to take a journey to reality and reach for the ontological root—our destiny. She is there as a tool, a question, a permanency; I am here as a temporality. -
Jérôme Sans
In your installation To Breathe – A Mirror Woman (2006), shown in Madrid, we can hear your own breathing, filling the space. What is your relationship to the body and the act of breathing? -
Kimsooja
I’ve always reinterpreted and recontextualized existing concepts, depending on the site, the questions I had, and the relationship to other works and sites. This installation has three different components from past projects. The Weaving Factory (2004), was my first sound performance, I overlapped my breathing and humming; it developed from the idea of my body as a weaving machine, inspired by an old textile factory in Lodz, Poland, for the First Lodz Biennale. Later, I worked on a video installation commissioned by Teatro La Fenice, Venice, called To Breathe (2006), which incorporated The Weaving Factory. La Fenice is an opera house and singing is about breathing. When I was invited to make a work for the Palacio de Cristal in Madrid, I brought all of these elements together, contextualized as a bottari and as a void. Attaching the diffraction film to the architecture was an act of wrapping and unfolding the daylight into a rainbow spectrum. -
Jérôme Sans
One of your upcoming projects is a work for the new subway station at Mairie de Saint-Ouen in Paris. -
Kimsooja
Although it is a site-specific and permanent installation, this project brings me back to the body/work and audience/pedestrian relationships in A Needle Woman. This installation will symbolize another body of mine, one that witnesses the station’s pedestrians. The diffraction film installation will function as my body, standing still in the station and witnessing the pedestrians, while offering the public a forum. -
Jérôme Sans
You were teaching at the École nationale supérieure des Beaux-Arts. What is your connection to Paris? -
Kimsooja
Paris was the first western city I visited; I stayed for six months in the mid-1980s. A scholarship from the French government allowed me to work at the École nationale supérieure des Beaux-Arts in the lithography studio. Whenever I had a project in Europe in past thirty years, I’ve also visited Paris, even if I didn’t have any particular reason.
During my six-month stay in Paris, I traveled to other European cities for the first time, visiting major museums in Germany, Italy, Holland, and England. I was 27 years old. I absorbed the language, art, culture, and life in Paris, they are forever in my memory. In 1985 at the Biennale de Paris, I first encountered John Cage’s work. Although I knew of him as an avant-garde composer, I had never heard his music live, or seen any of his visual works. With great curiosity, I entered an empty railway car to hear his sound piece, but there was only silence and a simple written statement, “Que vous essayez de le faire ou pas, le son est entendu” (“Whether we try to make it or not, the sound is heard”).
It was interesting that I learned so much from an American avant-garde composer, rather than from European art or artists, although I was aware of the French Supports/Surfaces group and the influential artists at the time. After my encounter with Cage’s work, I became curious about American art and culture for the first time.
I’ve shown quite often in France, the French government and institutions have supported many of my works, and I owe them a lot. I was admitted to the Ordre des Arts et des Lettres by the Minister of Culture for my modest contribution to French culture. I have a love for Paris and French culture and want to spend more time working there. -
Jérôme Sans
What new avenues are you exploring? -
Kimsooja
Since 2010 I’ve been working on a 16mm film series titled Thread Routes, filming textile cultures from around the world: Peruvian weavings (chapter I), European lacemaking (chapter II), Nomadic Indian textiles (chapter III), Chinese embroidery (chapter IV), Native American weaving (chapter V), and African textiles (chapter VI). I can’t wait to visit Africa to film soon. Since 2016, I have realized a large-scale participatory installation titled Archive of Mind, firstly for a solo exhibition at the National Museum for Modern and Contemporary Art, Seoul, as part of the MMCA Hyundai Motor Series. This project is evolving and was presented at the Intuition exhibition at Palazzo Fortuny in Venice this year, and opens up to explore the sculptural aspect of my practice from the position of a painter. -
There is also a new installation at Nijo Castle, Kyoto, commissioned by the Culture City of East Asia, with the title Asian Corridor; it’s a ten-panel folding mirror screen on a mirrored floor, entitled Encounter – A Mirror Woman (2017). This is my second East Asian City project, the first, in Nara, was Deductive Object (2016), a black sculpture, inspired by an Indian ritual stone called Brahmanda (a cosmic egg in Hindu culture), installed on top of a mirror panel.
-
These works redefine the geometry of bottari and the surface of the symbolic bottari that represents the totality of the universe. I want to explore further what this could bring to my future practice. I am also starting new clay works. All of these are exciting, new directions to keep exploring, and I am very curious about the outcome.
-
Jérôme Sans
How do you see the future? -
Kimsooja
The future doesn’t exist anymore—it is past.
— Kimsooja: Interviews Exhibition Catalogue published by Verlag der Buchhandlung Walther König in association with Kunstmuseum Liechtenstein, 2018
- This interview was conducted in summer 2017 via email in conjunction with one of Kimsooja’s upcoming projects, a work for a new subway station in Paris.
 A Study on Body, 1981. Silkscreen Print on Paper, 34 x 34 cm. Courtesy of Kimsooja Studio.
A Study on Body, 1981. Silkscreen Print on Paper, 34 x 34 cm. Courtesy of Kimsooja Studio.
Geometry of Mind and of Body
Young Hee Suh (Professor, Hongik University)
2017
-
For her special exhibition at the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of Korea in the Hyundai Motors Series 2016, Kimsooja presented nine artworks, including her most recent, which were displayed in the Exhibition Hall 5 and in the courtyard of the Museum’s Seoul branch from July 27, 2016, to February 5, 2017. The exhibition featured artworks of diverse media, both two-dimensional and three-dimensional works, installations, and audio and video. This exhibition offered a rare opportunity to appreciate the breadth of the artist’s work scope and varied use of materials.
-
Kimsooja is an established, mid-career artist who has been internationally prominent for almost thirty years. In her previous exhibitions, she has used diverse media and implemented creative ways of installing artworks. Audiences have admired her endeavours to push the envelope of her own creative domain, and had high expectations for what the artist would convey on this occasion. In the titles Kimsooja chose, she deliberately asked viewers to ponder certain meanings in her art. She called the two most prominent works in the exhibition Archive of Mind (Geometry of Mind in Korean) and Geometry of Body, which established an overarching theme that extended throughout the exhibition. This was an invitation for the viewers to look at each piece in the context of either the expansion of body or the expansion of mind. More specifically, viewers were confronted with a dualistic interplay of mind and body. Through the visual extrapolation of these two contrasting but inextricable concepts, Kimsooja unfolded a realm in which one could refl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ubstantial and the insubstantial, between the inside and outside of being, or between the self and the world.
-
The artist chose to title the exhibition bilingually: its Korean title, Maeummui gihahak, or Geometry of Mind, together with its English title, Archive of Mind, hinted that the exhibition was more than an illustration of the sensory employment of medium or an experimentation with forms of expression. Rather, the exhibition revolved around the metaphysical notions of mind and body. Serious viewers would realize that her goal in this exhibition was not to differentiate her artistic present from the past by demonstrating certain expressive forms in unexpected or unprecedented ways. They were expected to focus on very specific messages that Kimsooja’s artworks signify and find themselves asking questions like: What is the fundamental motivation for her art-making? What is the consistent theme that runs through her works in this exhibition? How should such profound-sounding titles be construed? This essay aims to help the reader revisit these questions and, in the process of seeking answers, come upon discoveries both intended and serendipitous. This would help us experience the epiphany Kimsooja wished to share with all of us through her reflective project at the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of Korea.
-
In most of the writings on Kimsooja, her work is interpreted through conceptual frameworks borrowed from such disciplines as cultural anthropology, psychology, philosophy, religion, sociology, or feminism. This study does not stray far from those frames of reference, but differs in its focus on the concepts of body and mind as manifested in Kimsooja’s art — a viewpoint that has not been pursued in the past. It specifically strives to expound the relationship between mind and body from the perspectives of both Eastern and Western philosophical traditions; I will try to interleave East Asian and European thoughts in relation to the concepts in Kimsooja’s works. Kimsooja has arranged each bundle of her ideas in non-contiguous spaces, which then have to be stitched together with a metaphysical thread across the gaps of discontinuity. This study is organized in the same way — that is, in a structure of non-contiguous thoughts and their synthesis across the discontinuous boundaries to propose a new condition of contemplation.
Body and Mind: Monistic Dualism
-
The concept of mind is inherently difficult to grasp. In general, the term mind refers to a person’s personality or character; but it can also mean a metaphysical space that contains a person’s thought or emotion. In English, mind represents the spirit or thought of the brain. The corresponding French word âme means soul or consciousness. The meaning of mind differs somewhat whether the Korean or English term is used. This divergence is probably a result of differences in Eastern and Western thought. In many traditions of European origin, mind and material have been disparate concepts. Mind is a human attribute whereas material is an attribute of things. The human mind stands independent of the external, material world and is subject to rational principles, thus forming a dimension that is separate from the material world, to which the body belongs. This way of thinking is called dualism of mind and body, predicated on the premise that mind and body are independent of each other. However, Eastern thought is not compatible with this kind of dualism. In East Asia, mind and material are deemed interdependent or complementary to each other, forming an inseparable relationship. This view, which has become the basic underpinning of philosophical thinking, treats mind and body as two different manifestations of the same entity. It does not hold that the mind governs over a body seen to be inferior. This is a monism of mind and body, or monistic dualism. According to this view, mind and body originate in and ultimately fuse and return to the state of being one. Oneness is deemed as the fundamental principle of the whole universe; it corresponds to the Great Ultimate (??, taiji) in the Confucian book the I Ching or Yijing (??, Classic of Changes), the universal and absolute principle (?, li) in the teachings of Neo-Confucianism, and nothingness (?, kong) in doctrines of Buddhism.
-
Recently, a monism of mind and body has been accommodated by many European thinkers, one of them being Jean-Luc Nancy. In his book Corpus, Nancy focuses on the disparaged status of the body in relation to mind, and attempts to rebalance the conventionally lopsided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The premise of his claims is that the body is der einzelne, meaning that it does not exist in the dominion of the mind, nor is it an existence that is merged with the mind. At the same time, he repudiates the concept of body that is perceived as the opposite to soul or mind. Nancy’s “body” is not a foreign or unfamiliar object to an inner soul (âme, psyché) but a correlator that coexists with soul. To paraphrase, body is the expansion of soul and at the same time the exterior of soul. According to Nancy, the body is opened toward the outside, i.e., it is revealed and unfolded outwards. The body is the soul’s expansion toward the exterior and forms itself as the Other (l’autrui). The soul or the mind, then, is the inner substance of the outer body and, as such, supports the body’s sense of contact. Body and soul form an oppositional pair to each other. This is a monistic dualism as the relationship between body and mind.
-
The concept of mind cannot be apprehended by logic or be defined by certain categories or boundaries. In order to discern the concept of mind beyond this impossibility of knowing or the limit of our rational capacity, one has to dispense with the belief in the mind’s self-sufficiency and experience a break from the closed, egocentric self. One must see that the mind is opened toward the outside — the outside which may be called the body, the Other, and the world or the universe. The process of the mind opening up or unfolding toward the outside — thereby breaking out of the subject-centred closedness that endlessly collapses inwards — is what Nancy calls as the expansion of the soul. Through such a process, the soul transcends the limitation of being immanent in itself and enters what both Emmanuel Levinas and Nancy describe as the altruistic coexisting relationship of “being-with.” The characteriza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mind and body (soul and body) as “being-together” parallels the concept of the “pluralistic singular existence (être singulier pluriel),” which is the essence of ourselves in society. Rather than expand on the relationship of pluralistic singular existence to the democratic community, I intend to connect this concept to the monistic dualism of material and mind, material and non-material, and, by extension, to the monistic dualism of finiteness and infiniteness.
-
In his discourse on the expansion of the soul, Nancy set out by addressing the issue of the body among the many facets of the Other. He argues that when the soul tries to reach the body, which is its own Other, as well as the outside, the soul contacts itself through the outer skin of the body, which is its own exposure (l’exposition du soi, l’expeausition). Owing to the ego outside the ego and the body that is the boundary between the self and the world, the soul is able to maintain its balance without leaning toward the inside or the outside. The concept of body, which stands as neither a subject nor an object, in conjunction with the idea of a balanced soul, offers a valuable clue to understanding Kimsooja’s works in this exhibition.
-
Nancy’s expansive argument about body and soul leads to a discussion of the existential finiteness of the body and its coexistence in a social context. However, in Kimsooja’s Geometry of Body, the finite coexistence of people is not a matter of importance; her focus is on our original existence that confronts the absolute or the infinite. In that regard, Kimsooja’s work diverges from Nancy’s discourse. Additionally, as a means of approaching the infinite that is the limit of existence, most of Kimsooja’s works involve geometrical structures and a balance that symbolically signify the monistic dualism of body and soul. The geometric balance, with its primordial power, brings about an effect by which we are almost unconsciously drawn into the world of the absolute and the infinite. Facing the overwhelming infinite or absolute, we are awakened from the state of our everyday existence and compelled to turn our eyes towards our original existence. We either avoid facing death or lead a life oblivious to it even though the inevitability of death is embedded in the very foundation of our present existence. If existence comes to grips with death through a constant ontological anxiety, it is said to be in fundamental and inherent authenticity (Eigenlichkeit). It was the philosopher Martin Heidegger who set out this ontological perspective and touched on the issue of “authentic existence” in Sein und Zeit (Being and Time). This authenticity of being metamorphoses the state of everyday “being there” (Dasein) into authentic existence. An authentically finite self anticipates its eventual death and projects (Entwurf) itself into authentic being, thus breaking from the self-contained self.
-
In my view, the concept of authentic being is closely aligned with the monistic dualism of mind and body. A human being conceived as a dualistic entity of mind and body is an existence placed on a path to absolute nothingness, or death. Of course, death in Western existentialism is the negation and perishing of being. Little or no attention is paid to the state beyond death. Even though Dasein anticipates its own death, it does not pursue the absolute domain that death ushers in. In contrast, traditional Eastern thought does not consider the death of body and soul to be a perishing, but as either a threshold through which existence enters the absolute world or a stage where existence is united with the infinite world. Therefore the meaning of existence expands to the dynamic absolute (taiji) or nothingness. While the East and the West may differ in their answers to what constitutes authenticity of being, both affirm death to be instrumental in opening up the complete possibility of being, or the ultimate infiniteness that establishes the meaning of our existence.
The Meaning of “Geometry”
-
The monistic dualism of body and mind provides an effective framework when we seek to grasp the significance of “geometry” as specified in the titles of works such as Geometry of Body and Geometry of Mind. It is obvious that the artist did not intend geometry to be a mathematical study dealing with figures or space. Kimsooja’s geometry is an intuitive method to help visualize complex ideas around the metaphysical notions of body or mind. The artist, by employing such a geometric method, reminds viewers of the dualistic and agonistic structure of body and mind — or the dualistic structure of material and consciousness, of the finite and the infinite, and of authenticity and non-authenticity of being. Furthermore, through geometric structure, Kimsooja leads each viewer to think of possible aspects of being. Geometry in this case can be understood as a statistician’s method that transforms a great deal of complex information into visual models, or a logician’s method of deductive reasoning in which concrete and evident facts are laid out as the ground for general principles. This methodological approach has helped the artist to avoid being lured into subjective, emotional traps while rendering images and objects in the visual arts. Kimsooja could better convey her ideas to the viewer thanks to intuitive clarity and deductive facility offered by this geometric method. Thus we could argue that her works can be categorized as conceptual art.
-
Verticality and horizontality, as key elements of a geometric structure, can effectively represent the ideas underlying a monistic dualism of the body and mind. Since the early 1980s, Kimsooja’s works almost without exception have a structure of verticality and horizontality, with intersections of longitudinal and transversal lines in an orderly fashion. The structure of perpendicular lines intersecting each other and extending in opposite directions displays a sense of expanding movement that unfolds toward infinity, while maintaining balance in the four cardinal directions. This structure creates an open-ended space in which the inside communicates with the outside and movement can take place in any direction. When a vertical and a horizontal line intersect, the four directions come into being. As lines are added through that intersection, the number of directions increases to eight, sixteen, thirty-two, sixty-four, and so on. In traditional East Asian philosophy and religion, these numbers signify time and space. In the Yijing, the sacred book of Confucianism, sixty-four trigrams symbolize sixty-four directions and represent divergent attributes of being. In the Buddhist scripture Taejanggaemandara, the eight lotus petals called jungdaepalyeobeon — which contain the four Buddhas of east, west, south and north and the four Buddhas of the northeast, southeast, northwest and southwest — symbolize the omnipresence of Buddha throughout the universe. Additionally, the eight or sixteen spokes of the wheel represent the Buddhist Dharma that permeates all directions of the universe. It is also the archetypal image of wonyoongmuae, which means “all things in all directions with no obstructions and in perfect integration.” The vertical and horizontal structure underlying all these concepts may be viewed as the dualistic structure of yin and yang or of heaven and earth, symbolizing the universe as an unhindered infinite space.
-
The concept of cheonjiinsamjae, as expounded in the Yijing, offers an interesting perspective on how the universe functions in relation to human beings. It adds the human being to the dualistic order of heaven and earth. Even though the universe initially comprised these two fundamental elements, human beings have come to be an indispensable mediator between heaven and earth, enabling the universe to function at its full capacity. A dualistic view of heaven and earth presumes that the world is just spread between the earth and the sky does not accommodate the use of the human mind, and is devoid of any engagement with human mind or attention. In contrast, the theory of samjaeron, the theory of three generative forces, asserts a role for human beings in the operation of heaven and earth. It raises the status of human beings to the same level , while asserting that human beings are the linchpin that holds together the universe. The inclusion of humans alters the traditional view of nature into a humanistic view of the world. Owing to this shift of views, nature philosophy in the East evolved into a humanistic moral philosophy, as manifested in Confucianism. The Doctrine of the Mean, written by the Confucian scholar Zisi, states that a human being is able to assist in change and operation of the universe and, if he or she is willing, can participate in the ranks of the three generative forces. For this, a person should perfect his or her own “human identity” bestowed by the universe. The Doctrine of the Mean dictates that it is imperative for human identity to be in compliance with the principles of the universe, or li. This is called the axiom of sungjeuklee, which means “human identity equal to the principle of the universe,” and is considered the core proposition of Confucianism. Therefore people should always cultivate their own body and mind so that their human identity is in sync with the principles of the universe — that is, in the state of golden mean. This is a state of balance maintained by a steady mind that does not get disturbed or swayed in any direction. A person in the state of golden mean attains his or her original identity, which is aligned with the principles of the universe, and can effectuate a harmonious world. If the human, who is a significant medium in helping to change and operate the world, is absent or disengaged, what would become of the world? Then, heaven and earth would remain indifferent to each other, separate, without relation, which brings us back to a dichotomous dualism. With humans engaged in conscious efforts to realize the principles of the universe, a dualistic structure is replaced by a monistic dualism of the world.
-
Although humans are finite beings, as mediators, they have the potential to reach for heaven in vertical relations and traverse the earth in horizontal relations. The vertical-horizontal structure defines our infinite universe. The encounter of yang, the spirit of heaven, and yin, the spirit of earth, procreates living matter and entities. Of these, only humans can join as the third of the three generative forces of the universe and engage in the operations of heaven and earth. Humans are capable of giving unitary interpretations of the world and of nature, as only humans have mind. According to the Doctrine of the Mean the ideal state of existence is the golden mean, which is alternatively called the middle or composure in the sense that it is the harmonious middle between yin and yang. The notion of composure resonates with ataraxia — “imperturbability,” the composed and stable state of mind and body sought after by the Epicurean School of ancient Greece. They believed human happiness exists in the state of ataraxia just as Confucian scholars asserted that if humans abide by the rule of the golden mean they are able to live a life that is delightful, worry free and happy, a life in which they perceive their own humanity without imbalance or bias.
-
The geometry of vertical and horizontal structure embodies a state of calm and composure that does not tilt to one side — this composure of body and mind is similar to what Confucianism pursued. The most fitting image of the stability of mind and body in the state of composure would be one of a vertical and horizontal structure in balance. Kimsooja may not have intentionally predicated her works on the propositions of Confucianism or, more precisely, Neo-Confucianism, however, it cannot be denied that her framework parallels them quite aptly. Just as Heidegger argued for the existential being to be authentic (to stay in existential anxiety by facing death and thereby overcoming the dualism between existence and nothingness), Confucian philosophies pursued a more positive human existence that communicates with the infinite and the absolute — a spatial and temporal realm that cannot be experienced. Confucianism in particular emphasized the universe as the root of the beginning and end, of the world of yin and yang. The basic tenet of Confucianism lies in the harmonization of human identity with the cardinal rule of the universe and living a balanced life in accordance with the order of yin and yang.
-
Kimsooja’s Geometry of Mind, an installation that was shown for the first time in this exhibition, prompts us to closely analyze the mind and realize it indeed is unified with the body as one and at the same time is related to authentic human identity. As there is no way to define this mind, we instead have to observe what state the mind exists in. When we observe our own mind, we realize that it initially has no shape or movement — it exists in a state of potential. It is only when a stimulus enters that the mind moves and arises; it oscillates to the state of reality filled with perception and emotion. The mind’s tranquil state of potential, while traversing through the time and space of our reality, transforms into a state of “being real” and reveals itself in this process. One of the annotations to the Yijing refers to the state of mind that has not yet been revealed to the outside as “the mind being calm and undisturbed.” In comparison, the state of mind that is revealed and able to respond is referred to as “the mind feeling and communicating.” Cheng Yi, a renowned Confucian scholar, wrote that a “calm and undisturbed state” is the original body of mind, and the state of “mind feeling and communicating” is the operation of mind. He postulated a duality of mind as an a priori state and an experienced state.
-
Since the nature of mind cannot be seen or touched, Confucians viewed it as empty. Buddhists viewed the mind as nothingness. Nevertheless, the mind is not completely empty. The energy of yin and yang is implicitly embedded in the mind. When the mind that has remained calm, it takes an orientation toward something at a given moment, the energy of yin and yang is activated, enabling the mind to feel. This energy allows the mind to realize or embody itself through time and space, and also allows the mind to change into various shapes. Zhu Xi, the founder of Neo-Confucianism in the Song period, compared the nature of the mind to a mirror that is clean and clear, and explained that emotion is something reflected on the mirror of the mind — that is, a reflection of the mind’s mysterious movement. He referred to the change and function of the human mind as “mysterious perception, sensation and judgment”. This mysterious function of mind has two aspects: one is the self-control of trifling emotions and desires generated by the body, and the other is the moral or ethical mind, which is based on human identity. The ethical intelligence refers to a mind that feels shame when it sees something that is not right and detests injustice, a mind of humility and accommodation for other people, and a mind that can discern right from wrong. This mind comes from a place of truth and must be encouraged. This ethical mind provides clues for understanding four personalities: gentle and virtuous, righteous, polite and civil, and wise and sagacious. The mind based on human identity acts as a swinging pendulum, gradually leading us to a state of balanced composure as well as a state of authentic being.
-
Eastern essence-function theory states that the mind would be in a peaceful pause when the body is also paused, and the mind would respond and feel once the body is activated. In other words, states of the mind are understood to match states of the body. This postulation of a mind-body identity is predicated on the theory that both mind and body are subject to the same energies of yin and yang. For this reason, a human being is defined as one and at the same time as two, entailing an argument that a human being can be split in two while maintaining its wholeness. This is the unification of matter and mind. In relation to the tranquility and movement of the mind, Nancy discusses something of note in Corpus. He paraphrased a quotation from Freud that came to light after his death: “the soul is unfolding (étendue) outwards, [but of the movement of being unfolded,] nothing is known.” If we substitute this “soul” for “mind,” we can see that that mind resides peacefully inside and then migrates outward and unfolds itself. The mind is not able to perceive its own movement of expansion because its unfolding is carried out unconsciously and quietly. However, if the unfolded mind makes contact with the body, the body of the mind would move towards the outside and evoke the unification of stillness and movement in the manner of twoness (mind and body) within one (the self) and oneness within twoness. Nancy makes clear that the self’s “unknowing” is the authentic self, and the process of the soul moving toward the outside, registering bodily sensation and going through thoughts and experiences, is the means of the unification of stillness and movement through which the unity of mind and body is exposed to world. Neo-Confucianism long ago explained the phenomenon of the mind being unified with the body (that is its own outside) and expanding toward the world through its essence-function theory.
-
Nothing could illustrate the stillness and then movement of the mind more vividly and persuasively than an experience that came upon Kimsooja one day in 1983, when she was sewing a bedcover with her mother. Suddenly she came to an important realization:
-
Through the banal activity of sewing a bed cover with my mother, I experienced a surprising sensation that my own thoughts, sensitivity and action were all integrated. That unifying sensation was so private and surprising. At that moment, I was able to find some kind of possibility that can include within itself countless memories, pain, as well as affection and love in life, all of which I had buried within me until that moment. The warp and weft as the fabric’s basic structure, the raw sense of colour of our own fabric, the unification of the action of sewing up and through the two-dimensional fabric, the fabric and myself and the strange nostalgia that all of this evoked...with all of this I was completely enchanted.
Later, when describing this experience again, she recounted that when the sharp needle poked into the fabric, she felt the energy of the universe suddenly penetrating through her whole body. This surprising epiphanic experience not only marked the origin of her Sewing series but also helped form the spiritual archetype for her oeuvre. The coincidence of the tension of mind with that of the body in the act of sewing brought memories and emotions that had been buried deep inside the mind to the threshold of the unconscious. This in turn electrified and moved the artist’s body and mind. Kimsooja described how this experience of the unification of her mind and body gave birth to Sewing, in which the meaning of the needle and thread is rooted in oneness of mind and body. Just as mind and body are two sides of a real being, needle and thread are as one and, as a unified entity, do the work of sewing the fabric — which symbolizes the outside world or the infinite space between heaven and earth. In the installation Archive of Mind, the participants are given an opportunity to experience the same kind of epiphany through the ritualistic act of forming clay balls rolled between their hands. -
When one is touched by an artwork, his or her mind is stimulated in response: “the tranquil and unstirred mind” begins to “communicate and stir” in response to the stimulus, thus, revealing itself. In the Sewing series, Kimsooja’s artworks have been structured in a way to best resonate with the stillness and the movement of mind. The bed cover is worked with needle and thread that symbolize the oneness of body and mind. The fabric, smoothly spread out, is a horizontal structure that accommodates the movement of the mind traversing over it. Against the backdrop of the horizontal fabric, the vertical movement of sewing through the warps and wefts represents the unfolding of the mind. The mind, in sync with the hand-movement of sewing, eventually brings to the surface the nature of being and emotion that has been sequestered in the unconscious. It is not just the repetitive hand movement that stirs the stillness of mind; the artist’s mind and body are stimulated on multiple levels. For example, the colorful, traditional fabric Kimsooja uses serves as a strong stimulus for the visual and tactile senses. Furthermore, the artist is inspired by the cultural implications of these silk fabrics. The vertical and horizontal structures in Kimsooja’s work are the most conspicuous visual stimuli that inspire the viewers.
-
...
-
The artist’s working method, which is to join squares of fabric along their widths and lengths and multiply them by sewing, also aligns with the structure of verticality and horizontality. To the question of what Geometry of Mind and Geometry of Body mean, answers may be found if one understands the principles of the three generative forces and the manifestation of heaven, earth, and human. Now let’s delve further into the geometry of the vertical and horizontal structure.
-
As suggested above, the geometry of the vertical and horizontal structure has nothing to do with reifying certain idealistic concepts, nor with the identification and classification of conceptual objects in a geometric lattice. The geometry of the vertical-horizontal structure in this essay refers to a method that helps one intuit the infiniteness of the universe or the intrinsic nature of the uncertainty of being, as well as intuit the state of balance between dualistic, antagonistic elements such as body and mind, or yin and yang. Geometric structuralization is a method to facilitate the observation and reflection of complex, often conceptual, notions. It is necessary to rely on such methods in order to have categorical, systematic or structural unity when contemplating the essence of the indeterminate consciousness called mind. Through this method we are able to reach the intuition of and reflect on such topics as body and mind, or yin and yang, all of which are indefinable by knowledge.
-
In a similar vein, Julia Kristeva, a semiologist, opts for a dualistic system of the semiotic and the symbolic in order to explain how the signification of poetic language is ingenerated from pulsion, which exists under the consciousness. It is, in fact, impossible to formulate the disorderliness and pulsation that flows and moves into a state of segmentation in a self-evident logic or axiom. Nonetheless, Kristeva hypothesizes that pulsion, the drive of desire, generates the ultimate signification of the text. She divides the process of signification into the strata of semiotic and symbolic, and investigates the interaction of these two. Consequently, she claims that signification is ingenerated out of the semiotic field in which the fragmented pulsion is condensed and subsequently connected to the symbolic field in which law, order, and social consciousness are concentrated. In other words, the two conflicting categories are connected in such a way that the semiotic mobility engages with the symbolic order, the former moving into the latter to compose signification.
-
There can be many possible interpretations for the vertical and horizontal structure that characterizes Kimsooja’s work. One would be as follows: (a) the expansion of mind construed as the expansion of the energy of pulsion in the field of the semiotic, (b) the integration of the body with the outside world interpreted as the unification with society and history in the symbolic field, and (c) the monistic dualism of body and mind construed as the formation of signification generated from the cooperation of the semiotic and the symbolic. The mind is the realm that is indefinite and uncertain, like the field of the semiotic. Yet it can be said that the mind’s own expanding energy — that is, the body — creates the meaning of “being” along with the order of the symbolic, such as sewing, the hand movement of rolling clay balls, or the somatic movement of yoga. As for how the pulsion that moves across the artist’s body and mind gives rise to certain meanings in the process of sewing, that is, at the moment of “poking the sharp needle” into the fabric, the artist explained: I experienced a surprising sensation that my own thoughts, sensitivity and action were all integrated. That unifying sensation was so private and surprising. At that moment, I was able to find some kind of possibility that can include within itself countless memories, pain, as well as affection and love in life, all of which I had buried within me until that moment. [...] the strange nostalgia that all of this evoked...with all of this I was completely enchanted.
-
Kimsooja mused that the meaning of her works is forged when subconscious memories and feelings are introduced to the consciousness, causing her to reflect on the innate nature of being. Is this not the true role of art? Art should let the artist’s hidden desires that have been forgotten or hidden in the mundane or everyday to be truly unfolded and expanded onto the horizon of the consciousness, and enable her or him to experience the epiphanic moment of recovering the original emotion and nature of being. It is for this reason that I sincerely recommend viewers immerse themselves and directly participate in the process through which the artist creates the meaning of her art, thereby relishing the opportunity to relive their own memories and feelings as well as intuit the nature of being.
— Extract of Essay from Exhibition Catalogue 'Kimsooja: Archive of Mind' published by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Korea, 2017. pp.156-269.
 A Study on Body, 1981. Silkscreen Print on Paper, 34 x 34 cm. Courtesy of Kimsooja Studio.
A Study on Body, 1981. Silkscreen Print on Paper, 34 x 34 cm. Courtesy of Kimsooja Studio.
몸과 마음의 기하학
서영희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교수)
2017
-
국립현대미술관은 현대자동차 후원의 ‘현대차 시리즈 2016’을 위한 초대작가로 김수자를 선정했다. 2016년 7월 27일부터 2017년 2월 5일까지, 서울관 제5전시실과 전시마당에 작가의 최근작을 포함한 아홉 점의 작품들을 전시했는데, 출품작들은 평면과 입체, 오브제, 설치 그리고 비디오를 오가는 다양한 매체들로 구성됐다. 그만큼 이번 전시는 작가의 폭넓은 작업 영역과 자유로운 소재 사용을 한 눈에 조망해보는 기회가 됐다.
-
김수자는 국제적인 활동 경력만 해도 거의 30년에 달하는 중진 작가이다. 그런 그가 이번 국내 전시를 통해 한국 관객들에게 보여주려 한 핵심은 어디에 있을까? 전시 때마다 기대를 뛰어넘는 다양한 매체와 설치 방식을 선보였던 그지만, 이번 전
시에서는 그 자신이 설정한 작품 표제와 거기에 담긴 의미에 더 큰 주목을 하게 만든다. 가령 이번에 처음 소개되고 유독 눈길을 끈 두 작품에 각각 ‘마음의 기하학’과 ‘몸의 기하학’이란 제목을 붙여놓았을 뿐 아니라, 다른 전시작에서도 제각각 ‘몸’의
확장 혹은 ‘마음의 확장’으로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이런 결정 덕분에 전시를 둘러본 사람들은 작가가 이번 기회를 통해 마음과 몸이라는 존재의 이원적 분화를 게시하고자 했음을 직관적으로 파악하게 된다. 우리에게 친숙한 몸과 마음이란 테마를 통해 그리고 두 개념을 확장시킴으로써, 그는 실체와 비실체, 존재의 안과 바깥, 나와 세계 사이의 관계를 사유할 수 있는 장을 펼치려 했다고 생각된다. -
전시의 제목부터 한글로 ‘마음의 기하학’, 영문으로 ‘Archive of Mind’라고 명시된 점만 보더라도, 이 전시가 감각적 매체 사용이나 표현 형식의 소개에 그치지 않고, ‘마음’이라는 관념적 내용을 성찰하도록 유도하고 있다는 사실이 분명해진다. 신중한 관객이라면, 작가의 의도가 예상 밖의 표현 수단이나 형식을 드러내 보여 자신의 현재를 차별화시키는 일에 있지 않음을 간파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관객들은 관람 내내 무엇을 주목했을까? 아마도 이들은 작품이 어떻게 제작됐는지가 아니고 무엇을 표상하고 있는지를 궁금하게 여겼을 것 같다. 외형적 편차가 큰 이 작품들이 대관절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전체 작품들이 가리키는 의미는 무엇이고 작업의 근본 동인은 무엇인지, 또 이번 전시 작품들을 연결해주는 일관된 주제는 무엇인지를 질문했을 것이다. 필자는 이렇게 가정된 물음들에 대한 답변을 찾아가면서 글을 준비하기로 했고, 글의 방향도 이 독창적이고 사색적인 프로젝트가 재연해내는 내용을 풀어보는 쪽으로 맞추었다.
-
지금까지 김수자의 작품을 분석하거나 설명하는 글들을 보면 주로 문화인류학, 심리학, 철학, 종교학, 사회학, 여성학 등의 범주에서 취한 개념들로 풀이하곤 했다. 필자 역시도 그런 참조의 틀을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다만 선행한 글들과 다
른 차이가 있다면, 본문에서 논의할 핵심 주제가 그동안 다뤄지지 않았던 ‘몸’과 ‘마음’이라는 점과 작품에서 이것이 각각 어떻게 고려되고 표현이 됐는지, 그리고 두 개념이 어떤 관계인지를 밝히려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필자는 동양의 철학, 종
교적 사유와 서양의 사상을 함께 참조할 것이다. 그리고 논점을 수미일관하게 구축하기보다는, 동서양의 관련 사유들을 작은 단위의 글들로 배열할 것이다. 이어 사유의 각 묶음들이 맥이 잘린 상태로 배치된 가운데, 그 결락된 자리에서 작가의 작품을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사유의 새 국면이 돌출되도록 하는 방식으로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 -
몸과 마음, 이원적 일원성
-
‘마음’ 자체를 규명하는 일은 매우 어렵다. 대체로 마음은 사람의 성격이나 품성을 뜻하고, 생각이나 감정을 담아두는 공간을 뜻하기도 한다. 그런데 영어로 마음인 ‘mind’는 머리의 정신, 생각을, 불어로 마음에 상응하는 단어인 ‘âme’는 영혼, 의식을 뜻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한글 ‘마음(心, 心性)’의 뜻과 영어 ‘mind’의 뜻 사이에는 거리가 있다. 이 차이는 동서양의 사유방식의 차이에서 나온다고 여겨진다. 서양에서는 전통적으로 정신과 물질을 이분법으로 나누어 생각해왔다. 정신은 인간의 속성이고 물질은 사물의 속성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사물과 상관없이 저 스스로 사유하는 인간은 정신적 존재로, 물질적 외부 세계와는 무관한 자기 충족적인 실체라고 보았다. 정신의 차원인 마음 역시 물질과 관계없는 자기 완결적 실체여서, 객체인 대상들을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주체로 간주되곤 했다. 따라서 정신으로서 마음은 사유하는 이성적 활동의 영역으로, 신체를 포함한 물질계와는 아무 공통점이 없는 차원으로 구획됐다. 이것이 정신과 물질은 아무런 교섭이 없다는 물심(mind and body)이원론의 근거이다. 하지만 동양 사상은 이것과 다르다. 동양에서는 오래전부터 정신과 물질, 영혼과 육체, 마음과
몸의 양자가 서로 분별되면서도 서로에 대해 열려있고 불가분리(不可分離)의 관계에 있다고 생각해왔다. 마음과 몸이 속과 겉처럼 서로 분별되면서도, 지배와 종속의 대립 관계가 아닌 상호보완의 관계에 있다고 보았던 것이다. 동양의 물심일원론, 즉 이원적 일원론은 이렇게 정신과 물질, 마음과 몸이 실체의 표리(表裏, 안과 밖)라는, 즉 서로 떼려야 뗄 수 없는 내외의 일원화된 관점 위에서 확립되었다. 또한 마음과 몸이 궁극에 닿으면, 파열하여 서로 융합하여 하나로 돌아간다고 본다. 이 하나가 우주만유의 근본이자 본래적 시작과 끝이다. 주역에서의 태극, 유학(성리학)에서의 리(理), 불교에서 말하는 일체개공(一切皆空)의 공(空)이 그것이다. -
최근 정신과 물질의 이원론에서 탈피하여 물심일원론에 공명하는 서양 사상가들도 있는데, 그중 한 명이 장-뤽 낭시이다. 낭시는 자신의 책 『코르푸스 Corpus』에서, 그동안 정신에 비해 폄하되었던 몸에 초점을 맞추고, 통상적인 몸과 마음의 불평등한 관계를 재정립하는 시도를 했다.[1] 우선 그가 내세운 전제는 몸이 단독자로서 정신의 지배 아래, 정신에 합병된 그런 몸이 아니란 것이다. 그에 의하면 몸은 밖을 향해 열려 있으며, 밖으로 드러나고 펼쳐지는 몸, 닫히지 않은 몸이다. 흔한 일상 대화에서 영혼이나 정신에 상반된 것으로 떠올리던 몸, 살덩어리로 꽉 차고 닫힌 독자적인 어떤 것으로서의 몸이라는 개념을 부인한 것이다. 낭시가 말하는 몸은 내면의 영혼(âme, psyché, 마음)에 대한 낯선 객체가 아니라, 영혼과 함께 공존하는 상관자이다. 더 정확히 말하면, 몸은 영혼의 확장이고 그것의 겉이며 바깥이다. 우리가 스스로 저 자신이라 생각하던 마음의 밖으로의 확장이 몸인 것이다. 이렇게 확장과 관련된 몸은 외부로 열려있는 존재인 동시에 영혼에 의해 침투되는 것이어서, 몸은 영혼(마음)의 바깥에 있다고 말해진다. 그러면 몸은 보통 저 자신이라 느끼는 영혼에 대한 차이가 되며, 영혼의 타(l’autrui, the other)로서 스스로를 형성하게 된다. 반면에 몸의 대립 쌍으로서의 영혼은 몸에 대해 무엇인가? 영혼 역시 몸에 대해서 차이이고, 타자이며, 몸의 바깥이 될 수밖에 없다. 몸의 바깥 존재가 영혼 혹은 마음이라면, 이 바깥 존재에 의해 몸은 자신의 안을 가지게 된다. 이를테면 몸은 저 스스로인 마음에 대해서 바깥이고, 이를 뒤집을 경우 몸에게 몸의 바깥 존재는 마음인 거다. 그리고 이 바깥 존재에 의해 몸은 자신의 안, 다시 말해 곧 저 자신이 몸이라고 느끼는 영혼을 가지게 된다. 이때 몸의 안 또는 몸의 영혼이란 몸에의 접촉 감각을 이르는 명칭이다.[2] 이렇게 자기 내면성이 외면성과 마주하고 연결되는 것, 이것이 바로 몸과 영혼의 상관성이며, 서로에 대해 안과 밖이 되는 이 상호 공존의 존재 관계를 이 글에서는 몸과 마음의 이원적 일원성의 관계로 간주하는 것이다. 앞에서 필자는 ‘마음’ 자체를 규명하는 일은 매우 어렵다고 썼다.
-
앞에서 필자는 ‘마음’ 자체를 규명하는 일은 매우 어렵다고 썼다. 왜냐하면 마음을 명확히 알 수는 없기 때문이다. 논리로 파악되거나 어떤 경계로 확정 지을 수 없는 것이 마음이니까. 이 앎의 불가능성, 즉 우리 오성(悟性)의 한계를 넘어서는 마음을 통찰하려면, 자기 완결적 주체에 대한 확신을 깨트려야 하고, 닫힌 이기적 자신과의 결렬이라는 경험을 해야 한다. 이어 마음이 밖을 향해 열려 있음을 확인해야만 한다. 마음의 바깥-이것은 마음의 한계이기도 하다-을 무엇으로 부를 수 있을까? 아마도 존재론에서는 몸, 윤리학에서는 타자, 종교철학에서는 자연, 세계, 우주로 부를 것이다. 스스로를 자기 자신으로 느끼는 이 마음이 바깥의 몸 혹은 물질, 자연, 우주로 열리고 펼쳐질(unfolding) 때-낭시가 영혼의 확장이라고 말한 바로 그 과정-, 비로소 우리는 내면으로 끊임없이 함몰되는 주체 중심의 폐쇄성에서 벗어날 수 있다. 에마뉘엘 레비나스(Emmanuel Levinas)와 낭시가 강조했던 저 이타적인 ‘함께-있음’의 공존의 관계도 이런 것이다. 오직 자아만이 주체라는 자기중심적 억견을 넘어 자기 바깥, 즉 몸, 타자, 공동체로 펼쳐지면, 이 외부와의 접촉(le toucher)을 통해, 영혼은 내재성의 한계를 넘어선
다. 그리고 영혼과 육체, 마음과 몸이 ‘함께 있는’ 존재, 즉 ‘복수적 단일 존재(être singulier pluriel)’가 바로 우리의 실체임을 인식하면, 우리는 안과 밖의 동형 구조인 자아와 타자, 자아와 외부세계 내지는 인간과 자연도 본래 같이 나누고 함께 소통하는 관계임을 저절로 자각하게 된다. 필자는 이 복수적 단일 존재 개념을 민주적 공동체 논리로 확대시키기보다, 보편적인 물(
物)과 심(心), 물질과 비물질, 나아가 유한과 무한, 색(色)과 공(空)의 이원적 일원성 개념으로 연결시키고자 한다. -
몸과 영혼의 이원적 일원성 개념을 개진한 낭시가 핵심 논제인 영혼의 확장에서 가장 먼저 불러낸 상대(l’autrui, the other)는 앞에서 말했듯 몸이다. 영혼은 우선 저 자신의 차이자 타자이며, 바깥인 몸에 가 닿으려 한다. 그런데 영혼과 불가분인 이 몸의 전체 피부와 눈, 얼굴은 내부가 아니라 외부를 향해 돌려진 것이다. 눈이 고개를 돌려 저 자신 속의 영혼을 쳐다볼 수는 없다. 그래서 영혼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 ‘나는 바깥으로부터 나에 닿지, 안으로부터 나를 접촉하는 것이 아니다.’ 바깥을 향한 몸과 접촉하려는 영혼은 이를 위해 에고(ego) 밖으로 나가야 하며, 저 자신의 노출(l’exposition du soi, l’expeausition)인 몸의 피부를 통해 자신과 접촉하게 된다. 몸에 가 닿고 접촉하면 결국 영혼은 마음을 불러일으키게 된다. 영혼의 확장은 이렇게 바깥을 향해, 바깥의 일부로 있는 몸과의 만남으로 구원된다. 에고 밖의 에고, 나와 세계의 경계인 몸 덕분에, 영혼은 주체의 내면으로 기울어짐 없이 균형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평형을 이룬 저울처럼 내면과 몸 양쪽으로 균형을 이루는 영혼과, 주체도 대상도 아닌 채 영혼의 바깥인 몸은 우리의 사유를 새로운 방향으로 접어들게 한다. 김수자 작가의 몸과 마음에 관한 작품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이런 논의로부터 해석의 실마리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
그런데 낭시의 몸과 영혼에 관한 확장적 담론에 대한 참조는 여기서 그쳐야겠다. 그의 이후의 사유가 몸의 실존적 유한성에 대한 논의로 전이되기 때문이다. 사회적 공동체에서 나의 타인을 향한 외존(外存, ex-position)은 어떤 경우에도 지금 여기에 있는 유한한 내 몸과 타인의 유한한 몸이 서로 만나서 이루어지므로, 그렇게 전개가 된다. 하지만 김수자의 ‘몸과 마음의 기하학’ 연작에서는 일상적인 사람들의 유한한 공존 양태가 관건이 아니다. 오히려 초점은 절대 혹은 무한과 마주하는 우리 자신의 본래적 존재 양태에 맞추어져 있다. 그런 점에서 그의 작품은 낭시의 담론을 비켜 나간다. 그리고 존재의 한계인 무한으로 접근하는 경험을 위해, 대부분의 작품들은 몸과 영혼의 이원적 일원성을 상징하는 기하학적 구조와 균형으로 만들어져 있다. 이 기하학적 균형의 추상성은 우리를 직관적으로 또 거의 무의식적으로 절대와 무한으로 다가가게 하는 효과가 있다. 그리고 압도적인 무한 내지 절대에의 접근은 우리를 일상의 평균적인 존재 상태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한편 본래적 실존으로 눈을 돌리게 만든다. 탄생과 죽음 사이에 있는 우리는 보통 존재의 소멸인 죽음을 회피하거나 망각한 채로 살아간다. 하지만 죽음은 엄연히 현존재의 근저에 묻혀 있으며, 가려졌더라도 언젠가는 그것과 반드시 마주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존재의 한계인 죽음은 존재자에게 앞으로 닥칠 유일무이한 가능성이자, 존재자에게 본래부터 있던 원천적이고도 고유한 본래성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다. 요약해서 말하면, 죽음에 이르는 존재가 바로 본래적 존재라는 것이다.
-
이런 존재론적 관점을 처음 피력했던 철학자가 마르틴 하이데거이다. 그는 『존재와 시간 Being and Time』에서 죽음에 이르는 운명의 존재를 본래적 존재라고 불렀다.[3] 그리고 이 같은 존재의 본래성(eigenlichkeit)이 일상의 현존재(dasein)를 본래적 존재인 실존의 존재로 변양시킨다고 하였다. 즉, 유한자인 내가 마음속으로 죽음에 이른다는 것을 미리 예상(anticipation)해둠으로써, 그래서 자신을 죽음을 향해 기투함(던짐)으로써, 죽음-무(無)의 완전한 가능성을 자기 삶 안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결국에는 실존의 존재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말이다. 일상의 우리는 이렇게 존재자의 예상된 조건인 죽음을 인정함으로서 자기 완결적 에고로부터 탈피할 수 있을뿐더러, 존재자의 가능한 전체 존재-탄생 후부터 죽음 직전까지의 존재-를 확보함으로써 자신의 본래적 가능성 앞에 직면할 단서를 마련할 수도 있는 것이다.
-
그러면 이 ‘죽음에 이르는 본래적 존재’ 개념은 앞에서 말했던 몸과 마음의 이원적 일원성 개념과 상관이 있는가? 필자는 양쪽 개념이 서로 상관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몸과 마음의 이원적 실체인 인간은 뛰어넘을 수 없는 죽음이라는 저 하나의 절대적 무를 향해 스스로를 열어가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물론 서양 실존주의에서 죽음은 존재의 부정이고 소멸이므로 그 너머를 적극적으로 사유하지 않는다. 현존재가 자신의 죽음을 예상한다 하더라도 죽음의 실현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추구하는 경우는 없다. 하지만 동양 전통 사상에서는 영육의 죽음을 소멸이 아니라, 존재가 무한한 절대 세계로 들어가는 문턱 내지는 무한과 합치되는 단계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존재의 의미는 오히려 역동적 절대인 태극, 무한한 열림을 뜻하는 공 혹은 무위한 자연의 개념들로 확장이 된다. 그러므로 동서양에서 존재의 본래성을 결정하는 차원이 죽음이든지 아니면 무한한 절대이든지 하는 차이가 있어도, 존재의 완전한 가능성을 개시하는 계기인 죽음 혹은 궁극의 무한이 우리의 존재 의미를 정립한다는 사실을 긍정하는 일은 같다.
-
‘기하학’의 의미
-
몸과 마음의 이원적 일원성에 대한 확인에 이어, ‘몸의 기하학’, ‘마음의 기하학’처럼 작품 제목에 명기돼 있는 ‘기하학’의 의미를 살펴보려 한다. 전시된 작품들 자체가 분명히 입증하고 있듯이, 작가가 의도한 ‘기하학’은 도형이나 공간의 성질을 규명하는 수학 연구도, 원, 삼각형 따위의 도형들을 배열하는 어떤 미술 양식도 아니다. 그의 기하학은 몸 혹은 마음으로 전제된 주제를 수리적 방식이 아닌 직관의 방식으로 시각화해내는 표현 방법에 대한 이름이다. 작가는 이 기하학의 방법으로 다양한 매체들을 사용하며, 관객들로 하여금 몸과 마음, 물질과 의식, 유한성과 무한성, 존재의 본래성과 비본래성 등의 이원적 대립 구조를 환기시킨다. 그리고 기하학적 구조를 통해 각자가 존재의 가능한 양태들을 생각해보도록 이끈다. 이러한 기하학적 표현을 비유해보면, 통계학자들이 많은 양의 복잡한 정보를 도형이나 그래프라는 시각적 모델로 바꾸어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논리학자들이 일반적 원리에 대해 구체적이고 자명한 사실을 논거로 제시함으로써 문제를 연역적으로 확증해내는 방법과 매우 흡사하다. 그만큼 개념적인 표현 방법이다. 때문에 시각예술로서 이미지와 오브제들을 제시하면서도 주관적 감정 표현에 빠져들지 않고, 직관적 인식과 연역법적 개념의 표상으로 공감대를 넓히는 그의 작품은 자연스럽게 개념예술로 분류가 된다.
-
필자는 몸과 마음의 이원적 일원성을 잘 표현해줄 수 있는 기하학적 구조들 중 하나로 수직 수평의 구조를 말하고 싶다. 실제로 1980년대 초부터 현재까지 작가의 작품들은 거의 예외 없이 이 수직 수평의 구조, 즉 수직선과 수평선이 상호 교차해서 균형을 이루는 십자형의 구조를 지니고 있다. 두 상반된 방향으로 진행하는 선들이 만나는 이 구조는 상호 교차하는 접촉점을 중심으로 사방으로 균형을 이루면서 무한하게 펼쳐지는 확장형 운동감을 드러낸다. 안과 밖으로 소통되는 열린 구조인데다, 각도를 돌릴 때마다 방향성이 무한히 변화될 수 있는 구조이다. 또한 수직선과 수평선의 두 선을 직각으로 교차시키는 순간, 4개의 방향이 생기고, 이어 동일한 교차점에서 선들을 두 배수로 거듭 증가를 시키면, 8개, 16개, 32개, 64개… 로 방향을 가리키는 수들이 늘어나게 된다. 동양 전통 종교철학에서는 이 수들을 시, 공간을 암시하는 방향이나 위치로 보아서, 가령 유교의 한 경전인 『주역(周易)』에서는 방향을 가리키는 64가지 기호들인 64괘가 존재의 다양한 속성들을 상징하고, 불교의 태장계 만다라에서는 동서남북의 4부처와 동북 동남서북 서남의 4보살을 각각 담은 8장의 연꽃잎들인 ‘중대팔엽원(中臺八葉
院)’이 중요 도상으로 전래되어 오고 있다. 또한 불교의 법륜(法輪)을 뜻하는 수레바퀴의 8개 내지 16개 바큇살로 온 세상을 가리키는 동시에 이 수레바퀴로 어느 때, 어느 곳이든 굴러가 닿는 부처의 법을, 그리고 천지 사방의 방향에 대한 비유로 어디든 막힘없이 두루 통하는 상태를 뜻하는 화엄종의 ‘원융무애(圓融無碍)’의 원형 이미지가 전해지고 있기도 하다. 이것들은 모두가 본래 음과 양, 하늘과 땅 같은 이원적 구조에서 출발하여, 영원한 시간, 막힘없는 무한 공간의 우주를 상징하는 기하학적 도상들로 전개됐다는 공통점을 보인다. -
한데 『주역』에는 이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천지인삼재’ 개념도 있다.[4] 이 개념은 독특하게 천지의 이원적 체계 위에 세 번째 우주 원리로 인간을 덧붙인다. 우주가 본래 하늘과 땅의 두 근원으로 이루어졌다고는 하지만, 하늘(天)과 땅(地) 사이에 매개체 역할을 하는 인간(人)이 있어야만 비로소 우주의 운행이 제 의미를 띨 수 있다는 개념이다. 세상이 하늘과 땅 사이에 펼쳐져 있다는 천지이원론은 인간(人)의 결여, 즉 인간 부재로 말미암아 ‘마음씀’이 없는 무심(無心)한 자연관이 될 우려가 있다. 그러나 천지자연의 운행에 인간을 참여시킨 삼재론은 인간의 위치를 천지와 같은 수준으로 끌어올릴 뿐만 아니라 천지를 연결하는 중심점이 되게 함으로써, 전통적인 자연관을 인간 중심의 인본주의적 사고로 전환케 한다. 이로써 동양의 자연철학은 인간을 근본으로 하는 윤리학으로 전이되며, 이 후자가 바로 유학이다. 그래서 유학자인 자사(子思)가 저술한 『중용(中庸)』을 보면, 인간이 천지의 화육(化育, 변화와 작용)을 도울 수 있고, 천지의 화육을 능히 도울 수 있어야 인간이 천지와 더불어 삼재가 될 수 있다고 하였다.[5] 이어 인간이 자기를 완성하는 것은 하늘에서 받은 ‘성(性)’을 최대한 발휘하는 것이며,
타자를 돕는 것은 천지의 작용을 돕는 것과 한 가지라고 하였다. 이것이 『중용』이 말하는 명(明, 질서), 즉 인간이 자신을 둘러싼 천지의 질서를 이루는 일이며, 그 실천을 통해서 인간은 세상의 균형과 조화에 참여하는 삼재가 된다는 논리이다. -
그런데 삼재가 되기 위해서는, 인간에게 필히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 있다. 바로 실천적 태도라 할 수 있는 윤리적 태도이다.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성(性)-인간에게 있는 성이 하늘의 이치인 리와 동질이라는 성즉리(性卽理)는 유학의 핵심 명제이다-을 따라서, 자신의 몸과 마음을 항상 수양해야만 한다.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욕심과 비도덕성을 다스리고 혼탁한 감정을 절제하는 수양을 하면, 중용(中庸, golden mean)의 균형 상태, 즉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평상심으로 정도를 지켜 나아가는 상태에 달하게 된다. 이 중용이 이루어지면 인간은 하늘의 이치대로 자기 본연의 성(性)을 다할 수 있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하늘과 땅 사이의 무량한 변화에 조응하며 조화를 이루는 주체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만일 하늘과 땅의 화육을 돕는 매개자인 인간이 부재하거나 혹은 있어도 그런 참여를 하지 않는다면, 세상은 어떻게 될까? 가정해보면, 천지는 각각 독립적으로 분리된 채, 상호 무관한 상태로 머물 고 말 것이다. 하지만 현실에서 인간은 천지와 더불어 삼재가 되는 일이 당연하며, 이 당위성을 토대로 인간은 중용을 실행하려 노력하면서, 천지와 만물을 연결하는 매듭이 되는 것이다. 인간이 마주하는 세상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원적 구조로 정립된 세계이다. 하지만 여기에 인간이 매개자가 되어 개입하면서, 천지(음양)는 서로 어우러져 돌아가게 되고, 이로 말미암아 세계는 이원적 일원성의 실체가 되는 것이다.
-
여기서 거듭 주목해야 할 점은 하늘과 땅의 두 요소가 만나는 균형점이 바로 인간 존재란 사실이다. 비록 그 자신이 유한자일지라도, 인간은 무한한 우주인 수직으로 치솟은 하늘과 수평으로 펼쳐진 땅을 연결하는 잠재적인 접촉점이 된다. 한데 하늘의 기운인 양(陽)과 땅의 기운인 음(陰)이 만나서 이루어지는 존재는 인간만이 아니다. 인간 외에도 삼라만상이라는 만물이 있다. 하지만 천지의 변화와 작용을 도와서 삼재의 우주원리 안에 드는 것은 무심한 만물이 아니라 마음씀이 있는 사람이다. 사람은 천지인의 삼재 가운데서 유일하게 몸과 마음을 가진 존재, 즉 유심(有心)한 존재여서, 무심한 하늘과 땅 그리고 만물을 일원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존재자로 판명된다. 천지의 이치인 리(理)와 동질인 자신의 본성, 즉 성(性)을 충실히 수행하면, 인간은 우주와 합일할 수 있으며, 그 변화에 참여하는 능동적인 주체로 존재할 수 있다. 그래서 자사가 저술한 『중용』에서는 인간이 획득하는 존재론적 차원을 세상 안에서 화합과 일치를 이루는 중화(中和)의 차원이라고 말한다. 이 중화를 다시 인성론의 용어로 바꾸어 말하면 평정 혹은 평정심이다. 인간이 음과 양 사이에서 조화로운 중화에 들면, 몸과 마음이 희로애락에 휩쓸리지 않는 ‘중(中)’의 상태가 되고, 설혹 감정이 일어나더라도 모두 절도에 맞는 ‘화(和)’가 되어, 가장 이상적인 존재 상태가 된다는 것이다. 필자는 이러한 중화가 고대 그리스의 에피쿠로스학파가 추구했던 아타락시아(ataraxia)의 개념과 동일하다고 생각한다. 인간 삶의 행복이 평정하고 안정된 심신의 상태인 아타락시아에 있다고 본 고대 그리스인들과 유사하게 동양 유학자들도 천지의 이치를 따라 심신을 다스리는 중용을 지키면, 불균형이나 치우침 없이 자신의 본성을 인식하는 쾌(快)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본 것이다.
-
이 글에서 언급한 기하학의 의미 다시 말해 수직 수평 구조의 안정된 균형이 암시하는 내용도 그렇게 유학이 지향하는 존재 상태인 심신의 치우침 없는 평정이 아닐까 한다. 성(性)의 이치에 기초한 심신의 안정된 균형(즉, 중화)을 이미지로 표현할 경우, 이것은 자연스럽게 수직수평 구조의 균형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작가가 작품을 통해 의도한 내용이 반드시 유학-더 정확히는 성리학-의 명제들과 일치한다고 장담할 수는 없다. 하지만 하이데거가 존재와 무, 삶과 죽음의 이원성을 일원화하여 죽음에 이르는 실존의 존재를 본래적 존재라고 간주한 것 같이, 동양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무한의 절대적 시공간의 이쪽에 있는 인간 삶을 중심으로, 인간의 능동성을 중시하며 존재의 양태를 규명하고자 한 것은 동일하다고 본다. 다만 유학에서는 존재의 본래적 시작과 끝의 원천이라고 생각되는 우주, 즉 천지의 음과 양의 세계에 더 많은 관심을 두었고, 그래서 인간이 천지의 이치(理)와 결부된 성에 큰 비중을 두고 음양의 조화대로 살아가는 균형을 중요시한 고유한 특성이 있다.
-
한편 이번 전시에 처음 소개된 설치 작품인 <마음의 기하학>을 염두에 두고서, 몸과 하나를 이루며 동시에 본연의 성(
性)과도 통하는 ‘마음’을 조금 더 가까이에서 주목해보자. 이 마음은 무엇이라고 규명되기보다도 어떤 상태로 있는 것인가 하고 질문되어야 하리라. 사실 우리의 마음을 스스로 관찰해보면, 이것이 본래는 모양도 없고 움직임도 없는 잠재 상태로 머문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그러다가 어떤 계기가 생기면, 마음은 비로소 생기는 것 같이 일어나서 지각과 감정을 느끼는 현실
상태로 이동을 하게 된다. 고요한 마음의 잠재 상태가 우리의 시공간을 통과하면서, 겉으로 드러나고 작용하는 현실화된 상태로 전환되는 것이다. 『주역』의 「계사전」에서는 이렇게 아직 밖으로 드러나지 않은 마음 상태를 ‘적연부동(寂然不動, 고요하고 동요하지 않음)’이라 하고, 밖으로 나타나 감응하는 마음 상태를 ‘감이수통(感而遂通, 느끼고 통함)’이라 하였다. 유학자인 정이(程頤)는 이 ‘적연부동’이 마음의 본체(體)이며, ‘감이수통’은 마음의 작용(用)이라 불렀다. 즉, 마음의 상태를
선험적 상태와 경험적 상태로 이원화하는 설명을 한 것이다.[6] -
마음의 본성은 볼 수도 만질 수도 없으므로, 이 심(心)을 허(虛)하다고 말하기도-불교에서는 이를 공(空)이라 함-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음이 아무 것도 없이 텅 빈 것은 아니다. 거기에는 음과 양의 기운이 함축돼 있다. 그래서 고요하게 머물던 마음에 어느 순간 대상에의 지향성이 생기면, 마음 속 음양의 기운이 동하여 실제로 느끼고 작용하게 되는 것이다. 이 음양의 에너지는 마음을 시공간을 통해 현실적으로 발현될 수 있게 하고, 또 여러 모양으로 변할 수도 있게 하는 동력이다. 중국 송대에 신유학을 창안한 주희(朱熹)는 마음의 본성인 성(性)을 아직 아무것도 비추지 않은 깨끗하고 맑은 거울로 비유한 한편, 마음이 동하여 작용하는 정(情)을 저 맑은 마음의 거울에 무엇인가 비추어져서 마음이 신묘하게 움직이는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마음(心)의 변화와 작용을 요약해서 그는 마음의 ‘허령지각(虛靈知覺)’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마음이 대상에 대해 작용하는 허령지각은 하나일 뿐이지만, 그 내용은 두 가지여서, 몸에 의해 생겨난 사사로운 감정과 욕망의 허령지각을 절제해야 하는 반면, 마음의 실체인 성(性)을 원리로 한 허령지각은 측은지심(惻隱之心)·수오지심(羞惡之心)·사양지심(辭讓之心)·시비지심(是非之心)의 도덕적 마음씀을 일으키므로 이를 북돋아야 한다고 말했다.[7] 후자의 네 가지 마음씀은 각각
인의예지(仁義禮智)의 실마리가 된다. 마음은 대상을 향한 허령지각을 주재하는 주체이며. 성(고요함)과 정(느끼어 일어남)을 관통하기에 (心統性情), 성을 원리로 한 마음이야말로 우리를 평정의 균형으로 이끌 수 있을 뿐 아니라 존재의 본래적 상태로 향하게 하는 추가 될 수 있다고 하겠다. -
한편 동양에서는 고요히 멈추어 있는 마음을 정지 상태의 몸으로 비유하고, 감응하는 마음을 움직이고 활동하는 몸으로 비유하기도 한다(體用論). 마음의 고요한 정지와 움직임의 양면을 또한 몸의 쉼과 운동으로 간주하기도 하는 것이다. 이처럼 마음과 몸이 동일하게 간주될 수 있는 근거는 둘 다 음양의 기운을 바탕 삼아 정지하거나 움직이기 때문이다. 실체로서 인간이 하나이면서도 둘(몸과 마음)이고, 둘이면서도 하나라는 물심일원론으로 규명하는 것도 그런 연유에서이다. 마음의 정(靜, 고요함)-동(動, 움직임)과 관련하여, 낭시가 『코르푸스』에서 프로이트 사후에 공개된 메모 하나를 인용한 내용은 흥미롭다. 요약하면, ‘영혼은 밖으로 펼쳐진다(étendue, unfolding). 하지만 그 펼쳐짐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는 내용이다.[8] 즉, 영혼을 마음으로 바꾸어 말하면, 안으로 고요히 머물던 마음이 이동해서 밖으로 펼쳐지지만, 이 확장의 움직임을 막상 마음 저 자신은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마음의 펼쳐짐은 무의식으로 고요히 진행되므로 그러하다. 하지만 이 펼쳐진 마음이 몸에 닿으면, 마음의 몸은 바깥을 향해 움직이면서, 하나(자아) 속의 둘(심, 신)이자 둘 속의 하나라는 방식으로 일치의 정-동을 일으키게 된다. 즉, 낭시는 이렇게 의식 아래에 있는 자아의 알지-못함[un ne-pas-(pouvoir/vouloir)-se savoir]이야말로 진정한 자아의 본모습일 뿐 아니라, 마음(psyche)이 바깥을 향해 움직이면서 몸의 감각을 동요시켜 사유와 경험을 하게 되는 과정이 세계에 노출되는 심신 일원의 일치된 정-동이라고 밝힌다. 마음이 자신의 바깥인 몸과 하나가 되어 움직이며 세계로 확장되는 일, 이를 두고 신유학은 이미 오래 전에 체용론(體用論)으로 설명했던 것이다.
-
그런데 이 같은 마음의 정-동에 관한 한, 김수자 작가의 오래 전 경험담만큼 생생하고 설득력 있는 설명이 될 수 있는 것도 없다. 이 에피소드는 1983년 어느 날 자신의 모친과 더불어 이불보를 시침하면서, 불현듯 중요한 깨달음을 얻는 순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어느 날 어머니와 함께 이불을 꿰매는 일상적인 행위 속에서, 나의 사고와 감수성과 행위가 모두 일치하는 은밀하고도 놀라운 일체감을 체험했다. 그 순간 나는 그 동안 묻어두었던 그 숱한 기억들과 아픔, 삶의 애정까지도 그 안에 내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하게 되었다. 천이 갖는 기본구조로서의 날실과 씨실, 우리 천의 원초적인 색감, 평면을 넘나들며 꿰매는 행위와 천과의 자기동일성, 그리고 그것이 불러일으키는 묘한 향수…. 이 모든 것들에 나 자신은 완전 매료되었다”.[9] 또 훗날 작가는 이 경험을 다시 언급하며, 천에 뾰족한 바늘을 꽂는 순간 갑자기 온몸을 관통하는 우주의 에너지를 느꼈다고 회상했다. 이 우연한 경험의 놀라운 일화들은 그의 바느질 연작의 출발점과 전체 작업의 정신적 원형이 무엇인지 분명히 환기시켜준다. 마음의 집중과 몸의 긴장이 일치된 바느질의 순간-<마음의 기하학> 워크숍에서 관객이 두 손으로 흙 공을 굴리는 순간도 마찬가지다-, 마음속 깊이 파묻혀있던 기억과 감정들이 무의식의 경계 밖으로 솟아나 심신이 감동의 전율을 체험하는 것이다. 작가가 이 경험을 바느질 연작의 출발점이라고 고백한다면, 필자는 이 경험이 작가의 마음과 몸의 일치를 노출시킨 최초의 사건이었다고 본다. 그리고 바늘과 실의 의미가 바로 이 심신 일원의 확장 개념에 뿌리내리고 있다고 생각한다. 마음과 몸이 실체적 존재의 양면이면서도 바깥세계에 대해서는 하나이듯이, 바늘과 실도 서로 연결된 채 하나가 되어 바깥세계 혹은 천지간의 무한 공간을 뜻하는 천들을 꿰매어 나간 것이다.
-
작품에 대한 감동은 현상적으로 가만히 있던 마음이 동요하여 움직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적연부동의 고요한 마음이 어떤 일을 마주하게 됐을 때, 그에 반응하여 감정이 통하고 움직이는 감이수통으로 바뀌기 때문이다. 특히 바느질 연작의 경우, 이러한 마음의 정(靜)과 동(動)의 구조가 매우 확연하게 드러난 편이다. 몸과 마음의 일원성을 상징하는 바늘과 실이 마주하는 이불보, 이 평평하게 펼쳐진 천은 그 위에서 전개될 마음의 움직임을 수용하는 물적 토대이자 수평의 구조이다. 그리고 천의 씨실과 날실 사이를 위 아래로 넘나드는 바느질은 수직 구조의 운동으로 마음의 펼쳐짐 내지 확산 작용을 불러일으키는 전제가 된다. 이렇게 바느질의 손동작에 감응하면서 마음은 급기야 무의식 아래 은폐됐던 존재의 본성과 감정을 의식의 지면 위로 떠올리는 것 이다. 물론 반복된 손동작만이 고요하던 마음을 동요시키는 유일한 계기가 아니다. 작가의 심신은 복합적으로 자극을 받는다. 가령 오방색 이불보의 광택, 색, 질감에 의해 시각과 촉각의 감각이 자극될 뿐 아니라, 오방색 비단 천의 전통적, 문화적 함의에 의해서도 자극을 받는다. 결국 이 모든 마음의 복합적인 변화 과정을 기하학적 이미지로 표현한다면, 그것은 수직 수평 구조의 이미지가 될 수밖에 없다.
-
작가가 1980년대 중후반에 바느질 연작의 제목으로 선택했던 ‘ㄱ, ㄴ, ㄷ, ㄹ’도 역시 수직선과 수평선이 결합된 구조를 보인다. ‘ㄱ, ㄴ, ㄷ, ㄹ’은 한글의 17개 자음자들 중 첫 네 가지 기호들이다. 15세기에 한글을 창안한 학자들은 훈민정음 제자(制字)의 합리적 체계를 위해, 『주역』의 질서정연한 음양오행의 원리와 천지인삼재의 모양을 본뜨는 상형의 원리를 따랐다. 가령 네 기본 자음자들인 ‘ㄱ, ㄴ, ㄷ, ㄹ’은 소우주로 여겨지는 사람의 몸, 그 중에도 발음기관인 혀가 각 기호를 발음할 때의 모양을 본뜬 것이며, 세 기본 모음자들인 ‘•, ㅡ, ㅣ’는 ‘천, 지, 인(하늘, 땅, 사람)’의 모양을 본뜬 상형 원리로 만들어졌다. 그래서 하늘의 형상으로 둥근 점을, 땅의 형상으로 평평한 수평선을, 사람의 형상으로 서있는 수직선을 모음 형태로 삼았고, 음양의 원리대로 하늘-‘•’은 양기(陽氣)를, 땅-‘ㅡ’은 음기(陰氣)를 그리고 사람-‘ㅣ’은 천과 지, 음과 양을 잇는 중성(中性)의 기운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또 한글에서는 자음과 모음이 결합된 글자가 완벽한 기하학 형태인 정사각형의 공간 안에 맞추어지는데, 그 안에서 자음, 모음의 배열은 하늘을 뜻하는 초성, 사람을 뜻하는 중성 그리고 땅을 뜻하는 종성의 순서로 구성이 된다.[10] 이처럼 인간을 중심으로 하늘과 땅의 배열과 음양의 질서를 따르는 한글 제자의 원칙과 동일하게, 바느질 연작에서도 하늘
과 땅, 물(物)과 심(心), 음과 양의 관계를 보여주는 수직 수평의 구조적 원리가 작용한다. 작가가 자신의 첫 작품들-바느질 연작은 그의 데뷔작임-에서 보여준 제작방식, 즉 바느질로 사각형 천들을 가로와 세로로 연결하며 확장해나가는 방식은 가장 최근작들인 ‘마음의 기하학’과 ‘몸의 기하학’이 암시하는 확장적 조형질서, 즉 수직 수평의 기하학적 구조와 그 의미를 이해하는데 매우 유효한 도움이 된다. -
우주 혹은 세계는 본질적으로 확장적이다. 워낙 광대하고 무한해서, 유한한 존재인 인간에게는 절대적인 미지의 타자로 간주된다. 그러면서도 인간 생명의 시작과 끝의 원천인 우주는 인간을 비롯한 만물의 생성과 변화 그리고 소멸을 포용하는 공간이기도 하다. 또한 소우주로 비유되는 인간의 몸과 마음의 작용도 객관의 논리로 설명되거나 질서정연한 체계로 규명될 수 없다. 그러면 이러한 세계와 인간 전체를 수 직 수평의 구조 같은 하나의 단일한 체계 안에 가두어 놓기가 가능한 일일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필자는 김수자의 작품론에서 수직 수평의 기하학적 구조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 짧게 해명해보려 한다.
-
앞글에서 암시했듯이, 수직 수평의 구조라는 기하학은 어떤 이상적 관념을 구체화해서 부동의 사유로 포획하거나 그것을 물신화(fetishize)하는 일이 아니다. 또 객관적 질서로든 ‘나’의 자기동일성을 위해서든 대상을 위계화하거나 대상의 차이를 사라지게 만드는 그런 일도 아니다. 필자가 이 글에서 말하는 수직 수평의 기하학적 구조는 우주의 무한성에 대해 혹은 불확실한 존재의 본래성에 대해 직관하는 방식이자, 몸과 마음, 음과 양 같은 이원적 대립의 요소들을 배타적이 아닌, 즉 다양성을 포용하는 일원화된 관계, 균형의 상태로 직관하기 위한 방식이다. 구조화, 체계화는 그 같은 대상에 대한 관찰과 관조를 가능하게 하는 여건이다. 마음이라는 불확실한 의식의 본질을 관조하는 데는 그에 유효한 통일성, 즉 체계나 구조의 범주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 그래야지 몸과 마음, 타자로서의 우주, 음과 양 등 지식으로 확정지을 수 없는 주제에 대해 직관과 성찰의 시선이 도달할 수 있는 것이다.
비유하자면, 기호학자인 줄리아 크리스테바(Julia Kristeva)가 의식 아래의 욕동(pulsion)에서부터 시적 언어의 의미가 산출되는 과정을 직관하기 위해, 세미오틱(sémiotique)과 생볼릭(symbolique)의 이원적 체계를 선택한 일과 흡사하다. 분절 상태로 흐르고 움직이는 욕동의 무질서와 유동성을 공리화하는 일은 사실 불가능하다. 하지만 크리스테바는 욕망(desire)의 맥동인 욕동(pulsion)이 텍스트의 최종적 의미의 근원이 된다는 전제 아래, 의미 생성의 과정(le procès de la signifiance)을 세미오틱과 생볼릭의 두 층위로 나누고, 이들 두 층위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연구하였다. 그리하여 궁극적으로 의미 생성은 분절된 욕동의 세계를 압축(condensation/verdichtung)한 세미오틱과 법, 질서, 사회적 의식을 압축한 생볼릭이라는 두 대립적 범주들이 서로 연결됨으로써, 즉 세미오틱의 운동성이 생볼릭의 질서에 개입하고 그 속으로 이동(deplacement/verschiebung)하게 됨으로서 의미가 결정된다고 본 것이다.[11]
-
만일 김수자 작품의 수직 수평 구조에 대한 범주화의 모든 다양성을 받아들인다면, 마음의 확장을 세미오틱의 욕동 에너지의 확장으로, 몸의 바깥세계와의 결부를 생볼릭의 사회, 역사와의 결부로 비교하는 일이 그리고 몸과 마음의 이원적 일원성을 세미오틱과 생볼릭의 두 층위가 함께 의미생성을 하는 과정으로 비유하는 일이 가능할 것이다. 마음은 세미오틱의 범주처럼 불확실하고 확정지을 수 없는 영역이지만, 그 기운(에너지)의 확장은 몸 예컨대 바느질이나 흙을 굴리는 손동작, 요가의 몸동작 같은 생볼릭의 질서와 함께 존재의 의미를 만들어낸다고 볼 수 있다. 몸과 마음을 가로지르는 욕동이 바느질의 순간, 즉 천 위에 ‘뾰족한 바늘을 꽂는 순간’에 어떤 의미를 발생케 하는지를 작가는 이렇게 설명했다. “나의 사고와 감수성과 행위가 모두 일치하는 은밀하고도 놀라운 일체감을 체험했으며, 묻어두었던 그 숱한 기억들과 아픔, 삶의 애정까지도 그 안에 내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것이 불러일으키는 묘한 향수…. 이 모든 것들에 나 자신은 완전 매료되었다”. 이처럼 의식 밑에 묻혔던 기억과 감정이 의식 밖으로 표출되면서 그리하여 존재의 본래성을 관조하면서, 작품의 의미는 산출이 된다. 진정한 예술작품은 이와 같지 않을까? 일상에서 잊히고 은폐됐던 욕망이 의식의 지평 위에서 실제로 펼쳐지고 확장되는 일, 그래서 존재의 본래적 감정과 본성의 귀환을 환영하는 그런 소중한 기회가 아닌가 한다. 그러므로 필자는 관객들이 작가의 작품을 통해 욕망과 감수성이 의미를 생성하는 과정에 몰입하거나 가능하다면 그 과정에 직접 참여해보도록, 그래서 몸과 마음의 일치로 자신의 기억과 감정을 되살리고 존재의 본성을 직관해보는 기회를 누리도록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다.
-
<마음의 기하학>
-
몸과 마음에 대해서 말하거나 표현하는 것은 어떤 열려 있고 무한한 대상에 관해 이야기하는 일과 같다. 이러한 경우에 작품에 대한 실증적 사고는 전혀 적합하지 않다. 총괄적 단일화를 요구하는 형식주의 관점도 부적합하다. 몸과 마음에 대한 담론은 이것이 무엇이라고 단정적으로 말하는 일이어서는 안 된다. 결정 불가능한 주제가 직관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이 어떻게 펼쳐지고 드러나는지를 말하는 일이어야 한다. 특히 마음은 몸과 달리 모양도 없으며 분할도 가능하지 않다. 다만 잠재성의 상태로 일정한 질(quality)만을 가진다. 그러면서 마음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작용하는, 즉 지속적으로 차이를 일으키며 분화를 이룬다. 수직 수평의 기하학적 구조가 필요한 이유도 이런 불확정성 때문이다. 기하학적 구조가 그런 마음의 작용을 연역적으로 직관하게 하는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기하학적 구조가 마음을 연역적으로 추론하는 방식일 수는 있어도, 마음을 완벽하게 도해하거나 설명해내는 해결책은 아니다. 그럼에도 해명하지 못함이 그의 작품을 이해하고 감상하는 일을 저해하지는 않는다. 왜냐면 마음은 본래 설명되고 증명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으로 필자는 작가의 최근작인 <마음의 기하학>을 살펴보고, 마음의 작용을 둘러싼 작품의 의미를 밝혀보고자 한다.
-
일반적으로 작품은 작가가 완성한 다음에 전시장에 설치된다. 이것이 작품 전시의 관례이다. 하지만 <마음의 기하학>은 작가의 기획대로 전시장에 설치된 다음, 관객이 작품을 점차 완성해 나간다. 작가가 작품의 일부를 설치했다면, 관객이 작품의 다른 부분을 완성하는 것이다. 작품은 참여하는 관객에 의해 매일 진행되며, 작품의 의미도 전시 기간 동안 계속 생성 중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가령 관객은 전시장 입구에서 제공된 찰흙을 두 손바닥으로 굴려서 작은 구를 만들며, 완성 후에는
이 구를 커다란 테이블 위에 올려놓는 행위를 한다. 관객이 스스로 흙 공을 만드는 이 작업은 작품의 형태와 의미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과정이다. 그래서 이 작품을 관객이 참여해서 완성하는 워크숍이라 부르기도 한다. 한편 관객들이 빚어놓은 흙 공들은 어느 정도 건조가 되면, 정기적으로 테이블 중앙으로 모아지고 촘촘하게 디스플레이 된다. 마른 흙 공들이 테이블 중앙에 모여 있는 장면은 천정의 카메라로 촬영되어, 다른 전시실 벽면에 부착된 TV모니터에 실시간으로 그 영상이 비추어진다. 완성된 흙 공들은 하루 종일 테이블 위에 놓여 있지만, 이후 일정 분량이 되면 저장고로 옮겨진다. 그래서 테이블 위에는 다음 관객들이 흙 공을 만들어 놓을 빈 공간이 늘 확보되어 있다. -
<마음의 기하학>에서 돋보이는 소재들은 커다란 테이블과 그 위에 올려져 있는 흙 공들이다. 전시장에 들어서자마자 보게 되는 길이 19m, 폭 11m에 달하는 타원형의 목조 테이블 덕분에, <마음의 기하학>은 이번 초대전에 소개된 작품들 중 규모가 가장 큰 설치 작품이 됐다. 테이블 위에는 이미 완성된 흙 공들이 펼쳐져 있어서, 금방 입장한 관객들의 시선을 수평으로 확산시킨다. 작품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는 테이블 위에 세워져 있는 작고 둥근 흙 공들이다. 관객들이 이것을 만들기 위해 각자 손바닥으로 흙덩이를 굴리며 고요히 명상에 잠겨있는 모습은 쉽게 잊히지 않을 만큼 인상적이다. 그들이 흙 공을 만드는 과정에 충분히 몰입할 수 있도록, 전시장 조명은 다소 어둡게 설정되어 있다. 천정에서 수직으로 내려오는 빛이 수평으로 펼쳐진 테이블 표면을 환히 밝힐 뿐, 다른 조명은 없다. 관객들을 위한 36개의 의자도 대략 1m 이상의 넉넉한 간격으로 설치되어, 누구든지 익명의 상태로 조용히 흙을 빚고 내면화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 작가는 이것을 관객이 자신의 마음을 흙 공에 담아내는 일 혹은 자신의 마음의 보따리를 싸는 일이라고 비유했다.
-
관객이 자신이 빚고 있는 흙 공에 마음을 투사하는 과정은 비정형의 흙덩이가 차츰 둥근 구형으로 변형되는 과정과 일치한다. 그리고 알 수 없는 마음의 상태는 몸의 두 손 혹은 흙을 굴리는 손바닥의 감각으로 확장됐다가 이어 형태가 없는 흙덩이가 점차 구형으로 변화되는 과정을 통해 세계와 맞닿는 경험을 하게 된다. 두 손바닥으로 흙을 감싸 굴리면서 서서히 완벽한 구형의 오브제를 만드는 행위는 실상 어떤 목적도 염두에 두지 않는 무위의 신체행위이다. 하지만 이 무위의 반복 행위를 통해서, 관객은 자연스럽게 자신의 내면으로 집중하게 된다. 이어 자신의 내면-마음을 관조하면서, 보이지 않는 마음의 본래적 고요함을 인식하는 한편 그런 마음을 움직여서 구체적 실재인 흙 공으로 이환해내게 된다. 그러니까 두 손을 비비면서 둥근 구를 만드는 과정은, 불교에서 수식관(數息觀)을 행할 때, 숨을 다듬고 생각을 가라앉혀서 마음을 정관(靜觀)하는 과정과 다름이 없다. 또 잠재상태의 마음을 바깥으로 분화해내는 과정이기도 하고, 모난 마음을 다듬어 바로잡는 자기수양의 과정이기도 하다. 어느 쪽이든, 둥근 흙 공을 만드는 과정은 가능태로 잠재된 마음을 직관하는 일이며, 더 나아가서는 마음을 다스
리는 수양의 윤리적 의미까지도 실현하는 일이라고 볼 수 있다. 작가는 이렇게 관객이 자신의 마음에서 출발해 기하학적 형태의 구를 빚어내는 일에 주목하여, 이 작품을 ‘마음의 기하학’이라고 명명하고, 또한 각자의 마음을 표상하는 흙 공들이 테이블 위에 쌓이기 때문에, ‘Archive of Mind’란 영문제목을 붙였다고 생각된다. -
테이블과 그 위에 올려져 있는 흙 공들의 이원적 관계를 생각해보자. 수평으로 펼쳐진 테이블과 그 위에 세워진 흙 공들은 작가의 선행 연작들이 보여준 이원적 구조의 연장선상에 있다. 가로와 세로로 연결된 천들을 제시한 <바느질> 연작이나 평평한 장소에 우뚝 세워놓은 <보따리> 연작, 그리고 지구 곳곳의 지면을 밟고 꼿꼿이 서있는 <바늘 여인> 연작, 들숨과 날숨으로 교차되는 <호흡> 연작, 하늘과 땅 사이의 자연 풍경과 씨실과 날실이 직조되는 광경을 보여주는 <실의 궤적> 연작은 경이롭게도 모두 수직 수평의 이원적 구조 내지는 그와 동등한 이원적 질서의 세계를 보여준다. <마음의 기하학>에도 수평의 테이블과 수직으로 서있는 흙 공들 사이의 물리적인 이원적 관계가 있다. 나아가 작품의 의미가 발생되는 측면에서 이원적 일원성의 관계를 주목할 수도 있다. 가령 마음과 흙 공 사이의 의미 생성 관계가 그렇다.
-
마치 보따리 연작에서 보따리를 쌌다가 풀어 펼치고, 다시 싸고 푸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보따리의 의미가 생성되듯이, <마음의 기하학>에서도 마음과 몸 그리고 흙 공으로 이어지는 확장적 펼침이 무수히 반복되면서 작품의 의미가 형성된다. 마음과 흙 공의 관념적 위상은 각각 무형과 유형, 잠재태와 현실태, 가능태와 실제태, 공(空)과 색(色), 무(無)와 물질이다. 하지만 작품의 진행 과정에서 이들 이원적 대립의 쌍들이 차츰 일원적 일치를 이루면서, 작품의 의미의 깊이는 생성되는 것이다. 관객이 자신의 흙 공을 빚어내는 과정은 그의 텅 비어있던 마음이 일어나고 생겨남을 사유하고 경험하는 허령지각의 과정이며, 자신의 무형의 마음을 유형의 물질로 변화시키는 과정이다. 다시 말해 잠재태의 공(空)한 마음이 현실의 흙 공이란 실제 상태로 분화되어 나오는 과정이다. 동시에 비정형의 흙덩이가 자신의 두 손안에서 흙 공으로 변화되는 과정을 관조하거나 혹은 테이블 위에 세워진 흙 공을 관조하는 관객은 유형의 물질을 계기로 그로부터 자기 몰입을 하면서 내면화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 필자는 이 과정을 물질에서 자아를 찾는 일 혹은 정반대로 물질에 집착하는 자아를 비워서 무아(無我)의 단계로 건너가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후자를 불교에서는 색에서 공으로 건너가는 의식 과정이라고 말하며, 도교에서는 작위에서 무위로 전환되는 의식 과정이라고 말한다. 비유하자면 묵주로 기도하는 신자들이 묵주의 작고 둥근 공들을 굴리면서 자신의 마음을 비우고 무아의 단계로 이입되는 일과 같다. 또한 관객이 자신의 마주한 두 손바닥과 그 가운데 흙 공이라는 양 극점 사이에서 힘의 균형을 지각하면서, 자연스럽게 마음의 본래 상태 내지 무위 상태로 들어가 고요한 평정을 발견하는, 즉 다시 말해 심신이 하나가 되는 입정(入靜)을 하는 일과도 동일하다고 본다. 결국 작품의 의미는 이 같은 이원적 일원화 과정(1+1=1)을 통해서 형성되며, 이 일원화를 위해 이원적 위상이 상호 지향적이고 확장적이라는 것은 필요불가결한 조건이 된다고 하겠다.
-
<마음의 기하학>에서 이원적 일원성을 발견하게 되는 또 다른 계기가 바로 우리의 공감각 작용, 즉 감각들 사이의 접촉에 있다. <마음의 기하학>은 관객들이 차분한 관조 상태에 이입되도록 하기 위해 세 가지 감각적 통로를 제시한다. 테이블 위에 세워진 흙 공들을 바라보는 시각 경험과 손바닥으로 흙덩이를 굴리는 촉각 경험 그리고 어두운 조명 아래에서 물 흐르는 소리를 듣는 청각 경험이 그것이다. 물 흐르는 소리의 내용을 더 정확히 말하면, 그것은 작가가 입안에서 가글링하는 소리,
즉 물방울들이 뒹굴고 부딪히는 소리와 그 외 자연 상태에서 물방울들이 떨어지고 구르고 흐르는 소리다. 작가는 이들 총 36가지의 소리들을 15분 31초의 길이로 녹음하여 테이블 아래에 장착한 스피커로 들려준다. 이것이 <마음의 기하학>과 함께 최초로 공개되는 <구의 궤적>이라는 사운드 퍼포먼스 작품이다. 필자는 테이블과 흙 공들로 구성된 설치작품에서 경험하는 시각 촉각의 내용과 <구의 궤적>에서 경험하는 청각의 내용이 상호 교차하면서 감각들 간의 공명 상태를 이룩하는 것을 높이 평가하고 싶다. 낭시가 말한 것처럼, 마음의 확장인 몸을 이미지로 덧씌워 표현하지 않으면서, 실제 우리의 몸을 그대로 쓰는 것이 공감각 작용이다. 이 공감각은 마음과 몸의 간격을 가로지르는 작용일 뿐 아니라, 감각들 간의 접촉으로 인해 실존의 확장을 일으키며 바깥으로 펼쳐지는 ‘몸-쓰기(l’excription du corps)’가 되기도 한다.[12] 그리고 감각들 간의 적극적인 상호 교차적 감각작용은 사유를 촉발시켜, 심신의 동일한 역학적 움직임, 즉 일치하는 움직임을 돌아보게 한다. 테이블 위의 작고 둥근 흙 공의 형태와 사운드가 상기시키는 물방울의 형태는 그것들의 근본적인 물성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둘 다 기하학적으로 완벽한 구형이라는 공통점으로 연결되어 있다. 공감각 작용이 그만큼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셈이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흙 공은 마음이 구체적으로 물화된 시각 촉각의 이미지인데 비해, 물방울의 사운드는 마음을 추상적으로 상기시키는 청각 이미지란 점이다. 또한 흙 공은 부동 상태로 멈추어 있어서 마음의 잠재적 운동성을, 뒹구는 물방울 소리는 마음의 실제화된 운동성을 유추하게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감각의 역동성은 마음과 그것의 확장인 몸의 동역학성과 연동성을 암시하는 최적의 표현임이 분명하다. -
거대한 타원형 테이블 위에 밀집된 채 모여 있는 흙 공들은 우주의 타원형 궤도를 따라 늘어선 행성들의 배열처럼 비추어져서, 테이블의 수평면은 은하계의 별들을 보여주는 스크린처럼 지각되기도 한다.[13] 흙 공의 기하학적 형태인 구가 공간에서 물리적으로 작용하는 중력, 인력 같은 구심력의 상징적 형상임을 의식한다면, 또한 천정에 고정된 카메라로 촬영된 테이블 위의 스펙터클 영상을 볼 때, 색도 크기도 조금씩 다른 수많은 흙 공들의 배열 장면이 구심력을 유지하는 소우주 같아
보인다는 점을 상기하면, 마음의 압축, 마음의 보따리를 뜻하는 흙 공의 본래적 의미에 좀 더 가까이 접근할 수가 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 마음의 보따리는 영구적으로 고정되어서는 안 되고, 반대로 풀려서 밖으로 펼쳐져야만 한다. 사실 보따리는 그 본래 의미대로라면 이산형 (dispersion)의 오브제이다. <구의 궤적>, 즉 ‘Unfolding sphere’의 음향은 물방울이 흐르고 구르고 뒹굴며 확산되는 운동을 하고 있음을 명백히 가리킨다. 그러니까 마음의 기하학적 형태인 구가 이번에는 우주 혹은 세계가 얼마나 리드미컬하고 팽창적인지, 또 마음의 이동도 결코 멈추지 않을뿐더러 항상 잠재적 운동 상태에 있다는 것을 가리키는 기호가 되는 셈이다. -
<마음의 기하학>과 <구의 궤적>에서 각각 지각되는 내용의 차이는 자극을 수용하는 감각기관-눈, 손, 귀-이 달라서라기 보다도, 시각, 촉각이 공간 감각인 반면 청각은 시간 감각이란 차이에서 비롯된다고 하겠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작품은 상호 배타적이지도 않고 대립적이지도 않다. 오히려 작품의 감각인상들은 상호 보완적이며, 서로를 향한 감각전이(sense transference)를 통해, 작품의 의미에 대한 관객의 교감을 증폭시키는 효과를 낳는다. 전자가 후자를 시각 촉각적으로 해석한 작품이라면, 후자는 전자를 청각적으로 해석한 사례이다. 흙 공들이 테이블 위에서 구르다가 멈추어 선 스펙터클을 <구의 궤적>은 소리를 통해 물방울의 끝없는 펼침의 운동으로 전환시켜 놓았다. 멈춤과 움직임, 고요함과 소리, 압축과 팽창, 접음과 펼침 등의 이원적 대립 요소들은 서로에 대한 보완으로 작용하고 또 상호 조응하면서, 결국 지각 효과를 상승시키고 주제인 마음의 의미를 다층적으로 나타낼 수 있게 한다고 본다. 관객의 입장에서도 여러 동시감각의 통로를 따라 작품의 깊이를 다층적으로 관조할 수 있는 여건을 갖는 셈이다. 문학적 기법으로 치자면, 감각의 전이와 결합은 환유와 은유의 형식이다. 공감각으로 인해 그만큼 작품의 의미화(signification) 형식은 더 다양해졌으며, 관객이 작품의 주제와 그 내용의 깊이에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도 더 커졌다고 할 수 있다.
-
<마음의 기하학>에서 드러난 수직 수평의 이원적 구조와 그것이 형성하는 의미를 살펴보면, 성리학의 심론(心論)이 마음의 생성을 설명하는 방식과 유사하다는 생각을 배제할 수 없다. 일단 수평의 타원형 테이블과 그 위에 서있는 구형의 흙 공들은 특정 대상과의 구체적인 유사성(similitude)이 없다는 점에서 초형태적이다. 이 오브제들은 현실의 어떤 대상의 생김새를 모방하거나 재현한 것이 아니다. 구체적인 지시대상(referent) 없이, 엄밀하게 기하학적인 형태로 현시된 이 오브제들은 수직 수평의 구조를 통해서 의미를 산출하는 관념적이고 상징적인 기호들이다. 일반적으로 언어학, 기호학 그리고 우주론(cosmogony) 내의 생성론에서는 무한과 유한, 불변과 변화, 부동과 유동이 서로 연동하는 이원적 대립쌍의 개념들이라고 이해한다. 앞에서 언급한 동양의 『주역』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음과 양의 대립적인 두 기운이 연결된 채, 우주의 보이지 않는 에너지로 잠재해 있고, 마음 역시 이 한 쌍의 기운들에 의해 생겨나거나 소멸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본래적 마음 상태-공(空)과 허(虛), 무(無)의 상태-에서는 음과 양의 에너지가 부동이고 불변이어도, 마음은 언젠가 일어나고 변화하기 마련이므로, 마음의 본성은 항상 음과 양의 에너지로 연동될 수 있는 가능태 (dynamis)-아리스토텔레스, 들뢰즈(Gilles Deleuze)가 사용한 개념로존재한다고 간주된다. 그러다가 계기를 만나면, 잠재된 에너지가 가능태에서 현실태(actuality)로 전이되어, 현실 속 실재로 변화된다고 보는 것이다. 이처럼 에너지가 잠재태에서 현실태로 혹은 가능태에서 실재태로 전이됨으로서, 우주 만물이 생성된다는 대개념은 동서양에서 우주와 사물의 생성을 설명할 때 보편적으로 적용이 된다. 존재론에서 주체의 형성을 설명할 때나 기호학에서 의미의 생성(le proces de la signifiance)을 설명할 때도, 역시 이 개념은 적용된다.
-
마찬가지로 성리학에서도, 음과 양의 기운을 지닌 마음은 존재의 정지된 근원이 아니라 인식과 지각의 능동적인 주체로서 고려된다. 심지어 마음은 우주의 이치인 리(理)와 연결되어 있어서, 마음의 성즉리(性卽理)의 원리로 온갖 윤리적 판단 및 감정과도 통한다고 여겨진다. (心統性情). 하지만 본래적 마음은 부동이고 불변이어서 고요하고 공허(虛)하기만 하다. 그러다가 타자와의 관계 내지는 사물과의 접촉이 생기면, 마음은 현실적으로 생겨나고 작용하며, 지각하고 변화한다. 가령 <바느질> 연작에서 실과 바늘이 천을 뚫고 움직이니까 마음이 감응하는 것이고, <마음의 기하학>에서도 두 손으로 흙을 만지며 비비니까, 그 접촉으로 인해 마음이 일어나고 작용하는 이치이다. 이런 관점으로 마음을 살피기 때문에, 성리학에서는 마음의 정동(靜動)을 매우 중시하여 설명하는 경향이 있다. 즉, 마음이 고요함에서 일어난다거나, 잠잠함에서 동함으로 변화하는 현상을 주목하는 것이다. 그런 맥락에서 주희와 퇴계 이황은 ‘적연부동 감이수통(寂然不動 感而遂通, 고요히 움직이지 않다가, 느껴서 통하다)’이라는 『주역』의 「계사전」의 문구를 빌려서 마음의 부동과 동을 해설했다. 그리고 마음이 사단칠정(四端七情)[14]을 발할 때, 이 마음의 작용을 잘 통제하여 존재의 본성과 본래적 감정을 놓치지 말도록 권유한다. 작품이 수직 수평의 기하학의 구조로 마음의 균형을 포착하려는 의도도 이렇게 존재의 본래적 상태를 파악하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필자는 작가가 <마음의 기하학>에서 궁극적으로 산출하려는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확신한다.
-
<몸의 기하학>
-
<몸의 기하학>은 작가가 2006년부터 2015년까지 거의 10년 동안 매일 사용했던 요가 매트를 오브제로 사용한 평면 작품이다. 이 짙은 적갈색의 평범한 요가 매트 위에는 일반 회화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것과 달리, 아무런 형상도 붓질 자국도 없다. 단지 오랜 신체 접촉으로 인해 생긴 자국들이 천이 마모되고 염색이 바랜 채 나타나 있다. 굳이 작품의 이미지를 말한다면, 몸이 만들어낸 흔적들, 즉 손과 발이 셀 수 없이 반복해서 닿았음을 증명해주는 매트 위의 허연 자국들이다. 이 무형의 얼룩 자국들은 요가를 위해 바닥에 수평으로 펼친 매트와 그 위에 수직으로 서거나 앉은 몸이 서로 교차한 접촉 지점들이다. 그런데 이것들은 지면과 몸 사이의 수평·수직의 균형 속에서 생겨난 흔적일 뿐 아니라 또한 몸과 마음 사이의 평형이 낳은 흔적들이기도 하다. 몸이 몸 바깥의 자연 혹은 우주의 힘과 균형을 이루어야 하듯이, 몸은 자신의 안이라 할 수 있는 마음 혹은 영혼과도 평형을 유지해야만, 요가는 성립될 수 있다. 사실 요가의 핵심은 서로 대응하는 이원적 요소들 간의 조화로운 관계를 추구하는데 있다. 아트만(atman)으로 불리는 본래적 자아와 우주 사이의 조응을 위해, 요가는 신체의 힘과 자연의 힘 간의 균형을 추구할 뿐 아니라 몸과 마음(영혼) 사이의 평형, 호흡인 들숨과 날숨의 균형 등 그야말로 실체와 비실체 사이의 소통과 일치의 관계를 지향하는데 주력한다.
-
요가 경전인 『요가 수트라』 제1장에서 정의하는 내용을 보면, 요가는 명상과 호흡, 몸의 긴장과 이완이 결합된 몸과 마음의 수련법이라고 되어 있다.[15] 요가라는 어휘도 몸과 마음을 조화롭게 결합한다는 뜻의 산스크리트어 ‘yuj’에서 비롯됐다고 한다. 따라서 요가에서 중시하는 몸과 마음의 결합, 즉 둘 사이의 평형의 문제는 이번 전시에서 다루고자 하는 ‘몸과 마음의 기하학’이 추구하는 균형의 문제, 즉 심신의 이원적 일원화와도 부합하는 것이다. 이렇게 안(마음)과 밖(몸)을 연결하여 소우주인 자아(atman)를 성찰하는 일이 요가의 목표라고 하면, 역시 몸의 균형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마음의 평형일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해서 마음의 번잡한 움직임을 가라앉히고 고요한 내면으로 집중하는 실천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이것이 요가의 명상 수행이다. 잡다한 생각을 지우고 마음을 깨끗이 비우는 이 명상의 의미를 유학에서는 허명(虛明)한 본래 마음으로의 회귀로, 불교의 경우에는 공(空)의 실천이라고 바꾸어 말한다. <몸의 기하학>이 제목으로 명시한 몸을 직접 보여주지 않는 이유도, 요가 수행자의 몸과 하나 된 보이지 않는 마음을 암시하기 위함이며, 결국 몸과 마음의 잠재적 일치 내지는 양자의 이원적 일원성을 직관하도록 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생각된다. 매트 위에 드러난 비정형의 흔적들은 따라서 신체와 물질 간의 접촉만이 아니라 몸과 마음 사이의 균형을 나타내는 자국들이 된다. 또한 어둠 속 섬광이 남긴 흔적처럼, 비실체적 형상인 마음이 몸 위를 스치고 지나간 자국이라 보아도 무방하다. 왜냐면 심신의 관계에서 몸은 마음의 궤적이고 흔적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일정한 형상을 표현하지 않은 <몸의 기하학>, 그 침묵을 통해 관객은 더 효과적으로 내면화되고, 흔적이란 잠재적 실체에의 암시를 통해 본래적 존재 의미를 직관할 수 있을 것이다.
-
<몸의 기하학>이 표현하고 있는 몸은 확실히 종래의 형이상학이 자기 충족적이라고 규정해왔던 방식의 단독자로서의 몸이 아니다. 작가가 이 작품에서 말하고 있는 몸은 마음과 함께 공존하는 몸인 동시에, 마음과 분절되면서 안과 바깥으로 열린 몸이다. 안의 마음을 바라보면서도 바깥에 기입된 몸(l’excription du corps)인 것이다. 작품이 나타내고 있는 것, 즉 수평과 수직의 방향으로 교차하며 접촉하는 매트와 신체의 균형은 몸과 마음의 이원적 균형과 일치를 암시하며, 그로 인해 관객은 존재의 본래적 의미를 관조하게 된다. 작품의 의미가 이렇게 마음과 몸, 안과 바깥 사이의 경계에서 양자의 접촉을 통해 생성된다는 사실은 필자로 하여금 다시 한 번 더 낭시의 『코르푸스』로 되돌아가게 한다. 왜냐하면 여기서 낭시는 몸이 구체적인 살덩어리의 실체임을 전제하면서도, 동시에 몸이 마음(영혼)의 바깥 존재이며, 외부세계로 열려있는 실체라는 관점을 제시해주기 때문이다. 이 유익한 관점에 기대어서, 필자는 몸이 내면과 외면이 있는 보자기로 상상될 수 있다고 본다. 몸이 내면으로는 마음을 감싼 보자기면서, 동시에 외면으로는 세계에 그 마음을 펼쳐 보이는 실체로서의 보자기라는 뜻이다. 몸-보자기가 마음을 감싸고 풀어낼 때마다, 몸과 마음 사이의 접촉은 당연히 흔적을 남길 수밖에 없다. 그리하여 <몸의 기하학>에서 매트에 나타난 흔적은 일차적으로는 실체인 몸이 외부세계 물질과 접촉하면서 남긴 흔적으로 간주되나, 이차적으로 몸이 마음이라는 내재적 원인과 접촉하면서 생성된 흔적이기도 하다라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
매트 위에 보이는 비정형의 흐릿한 흔적은 미분화된 상태로 남아있던 마음의 잠재적 상태를 매우 잘 암시한다. 그리고 잠재적 층위의 마음이 몸과의 접촉으로 차츰 분화되면서 모양과 질을 가지고 서서히 현실화되는 과정을 설득하는데, 이보다 더 효과적인 이미지는 있을 수 없다고 여겨진다. 이것을 들뢰즈의 ‘되기(devenir)’ 개념과 ‘펼침 (unfolding)’ 개념으로 다시 살펴보아도 마찬가지로 설득력을 잃지 않는다. 마음이 살아있는 알처럼 내재적 원인으로 잠재되어 있다가(잠재성의 층위), 몸이라는 실체와의 접촉과 자극에 따라 분화되면서(개체성의 층위), 구체적인 형태의 흔적 혹은 형태를 가지게 되는(현실성의 층위), 이 일련의 마음의 현실화 내지 펼쳐짐의 과정은 이번 전시에 소개된 작품들 중 <몸의 기하학>이 가장 잘 표현해내고 있는 부분이다. 심지어 크리스테바가 언어의 의미생성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설정한 이중 구조인 코라-세미오틱의 심층적 미분화 상태와 생볼릭의 표면적 현실화도 두 영역 간의 교차적 연동 작용으로 인해 수직 수평의 이원적 구조로서의 인용이 가능하다.
-
<몸의 기하학>이 전시된 공간 안에는 몸이란 테마를 중심으로 몸과 마음의 이원적 존재 양상을 표현하는 세 가지 다른 작품들도 함께 소개되고 있다. <숨>과 <연역적 오브제>, 그리고 <몸의 연구>가 그것이다. 이들 세 작품들은 <몸의 기하학>과 마찬가지로, 몸이 자기가 아닌 마음 혹은 외부세계로 열린 존재 상태임을 제시하고 있으며, 접촉과 만남의 관계를 통해 심신의 이중적 일원화를 보여준다. 가령 디지털 자수 작품인 <숨>은-작가가 1992년 바느질을 중단한 이후, 2004년에 재개한 최초의 자수 작품-들숨과 날숨의 숨소리 퍼포먼스를 시각화한 것이다. 2004년의 작품인 <직물공장>에서 관객들에게 들려주었던 작가 자신의 호흡 사운드를 이번에 음파 그래픽으로 전환하여 디지털로 수놓은 것이다. 몸에서 호흡이 끊어지면, 생명도 끊어지고 만다. 그래서 호흡의 지속은 곧 생명의 지속으로 은유된다. 들고 나는 호흡, 즉 들숨과 날숨의 규칙적 음파를 이미지화한 자수는 씨실과 날실의 직물 사이를 위, 아래로 누비는 수직 수평 구조의 바느질을 통하여, 음과 양, 삶과 죽음, 존재의 이원적 순환을 이미지로 재연한다고 볼 수 있다. 호흡이 몸과 마음의 확장이듯이, <연역적 오브제>(석고 조각과 목조 테이블의 설치 작품)와 <몸의 연구>(1981년의 신체 퍼포먼스 자료를 재생한 실크스크린)가 보여주는 작가 자신의 신체적 자세도 마음과 몸의 기하학적 균형과 일원화된 존재 양태를 상징한다. 두 작품은 신체와 공간의 관계를 구조적으로 확인해준 대표적인 경우이다. 특히 <몸의 연구>에서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인체비례도>처럼, 신체를 기하학적 구조를 따라 공간에 펼치고, 신체의 확장으로 공간을 점유하는 실험들을 보여준다. 몸 자체가 자나 컴퍼스가 되어 공간에 완벽한 평면 기하학의 도형을 그리고 있는 이 작품에서도 몸과 정신의 균형 관계는 요가에서처럼 중요한 문제이다.
우리가 이번 전시에서 이해해야 하는 점은, 몸과 마음 사이에 이루어지던 모든 종류의 위계화, 즉 몸과 마음의 이원적 분리 및 마음에 대한 절대 관념화 혹은 몸의 마음에 대한 굴종 같은 일련의 불균형한 편견의 전통을 탈피하고, 몸과 마음이 상호 연결된 평형 관계에 있음을 그래서 동양의 음양이론에서와 같이 심신의 이원적 일원성으로부터 존재의 본래적 양태를 직관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김수자 작가의 대부분 작품들은 수직 수평의 이원적 구조로 형성되어 있으며, 그 기하학적 구조의 균형을 통해 심신의 이원적 일원성 내용을 표현한다는 것을 밝힐 수 있다. ‘몸과 마음의 기하학’도 그 중의 하나이다. 몸이 마음에 병합되거나 마음이 몸을 귀속시키는 법은 없다. 양자의 차이는 소멸되지 않은 채, 절대 혹은 무한과 마주한다. 그리하여 앞에서 말했듯이, 실존적 한계 너머의 우리 자신의 본래적 존재 양태를 돌아보게 한다. 또한 이원적 일원성은 곧 그리고 언제든지 다원적 일원성으로 전개될 수 있다. 이로서 우리에게 ‘하나는 만물이고 만물은 하나이며, 티끌 하나가 온 우주를 담고 있다’는 불교 화엄종의 법성게(法性偈) 가르침이 떠오른다.[16] 즉, 현상계의 모든 사물이 서로 차별하는 일 없이 일체화되어 있다는 일즉다 다즉일(一卽多 多卽一)의 유연한 관계와 열린 만남의 사고가 마치 앞으로 작가의 작품에서 풀어야 할 화두처럼 떠오름을 발견하게 된다. 작가가 가장 자주 사용하는 수직 수평의 기하학적 구조는 궁극적으로 바로 이러한 사실, 즉 이원적 일원성의 균형 속에 미처 현실화되지 않은 수많은 존재적 의미의 가능성들이 잠재되어 있음을 가리킨다는 점에서 대단히 고무적이지 않을 수 없다.
[Note]
[1] Jean-Luc Nancy, “Corpus,” “Etranges corps étrangers,” Corpus (Editions Métailié, 1992/réédité en 2000), pp. 7-11; 장-뤽 낭시, 김예령 옮김, 「코르푸스」와 「기이하고 낯선 몸들」, 『코르푸스』(문학과지성사, 2012).
[2] 낭시에게 존재란 곧 몸이다. 영혼인 프시케 역시 하나의 몸으로 인식된다. 영혼-프시케의 확장이 몸이며, 이것이 존재 그 자체라는 것이『코르푸스』의 기본 전제이다. 자크 데리다는『코르푸스』에 관한 연구서인 『접촉: 장-뤽 낭시 Le toucher: Jean-Luc Nancy』에서, 몸과 영혼의 상관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영혼의 확장을 다음과 같이 기술했다. “Psyche is extended, stretched out (ėten-due). In her essence, she is some extension [de l’ėtendue] (extensio). She is made extended, made of extension. She is the extension/extended-noun and attribute.” Jacques Derrida, On Touching: Jean-Luc Nancy, trans. Christine Irizarry (Stanford/California: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5), p. 12
[3] Martin Heidegger, Being and Time (Sein und Zeit, 1926), trans. Joan Stambaugh (revised by Dennis J. Schmidt. Albany) (New York: SUNY Press, 2010). 마르틴 하이데거, 이선일 옮김, 「죽음에 이르는 본래적 존재: 선구」, 『존재와 시간』(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출판, 2003), pp. 206-211.
[4] 천지인삼재는 동양 철학에서 말하는 우주를 구성하는 요소로, 각각 하늘, 땅, 사람을 뜻한다. 『주역』의 「계사전 (繫辭傳)」에 의하면, 천지인의 세 가지 도(道)는 일원적인 도의 내적 삼분을 의미한다. 하지만 도의 본질은 천지인에게서 동질적이다. 서양 기독교 교리인 삼위일체에서 하늘의 성부, 땅에 임재한 성자, 그 둘을 연결하는 성령의 세 가지 격이 일원화되는 개념과 비교될 수 있다. 정병석, 「해제」, 『주역』(을유문화사, 2010), 참조.
[5] 『중용』은 유교의 경전으로, 『논어』, 『맹자』, 『대학』과 함께 유교의 사서(四書) 중 하나로 꼽힌다. 유교 사상을 가장 명료하게 정리한 문헌으로 알려져 있으며, 저자는 공자의 손자인 자사라고 전하고 있다. 본문의 내용은 『중용』 제22장의 마지막 문장을 해제한 것이다: “能盡物之性,則可以贊天地之化育. 可以贊天地之化育,則可以與天地參矣.” 『중용』(Upaper, 2012)의 이홍표 역주.
[6] 이창일 외, 『심경 철학 사전』(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08), pp. 71, 137-138
[7] 본문에 언급한 네 가지 마음 즉 측은지심, 수오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은 윤리적 인성(人性)을 설명하는 신유학 즉 성리학의 주요 개념들로 줄여서 사단(四端)이라고 한다. 이와 대립하는 사사로운 감정의 마음을 희(喜)·노(怒)·애(哀)·구(懼)·애(愛)·오(惡)·욕(欲)으로 분별하여, 이 일곱 가지 마음은 경계하도록 권고했다. 본래 공자가 정립한 유교에서는 인간의 심성 문제에 대해 깊이 있는 설명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신유학인 성리학에서는 유학을 심성 수양의 윤리학으로까지 확대하였다. 또 체계적인 세계관을 수립하려 했던 성리학에서는 인간의 심성 문제에 대해 이론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었기에, 마음이 사물에 감응하지 않은 상태를 성(性)이라 하고, 마음이 사물에 이미 감응한 상태를 정(情)이라 고 구분했다. 결국 성이 발한 것이 정이므로, 사단의 네 가지 마음과 칠정의 일곱 가지 마음 모두 근본적으로는 정이라는 점에서는 같은 범주에 속한다. 그러나 주희는 사단을 ‘이지발 (理之發)’로, 칠정은 ‘기지발(氣之發)’로 설명하여, 리에서 비롯된 사단이 마음의 본연지성이므로 기에서 비롯된 사사로운 칠정보다 더 도덕적일 수밖에 없음을 논하여, 양자를 구분하였다. 위의 책, pp. 156-157 참조; 『주자대전(朱子大全)』 卷55 (예문동양사상연구원, 2011) 참조
[8] Jean-Luc Nancy, “Psyche ist ausgedehnt,” Corpus, p. 22.
[9] 작가노트, 현대화랑 팸플릿(1988).
[10] 홍기문 외, 『증보정음발달사』(역락출판, 2016) 참조함.
[11] Julia Kristeva, “I. Sémiotique et Symbolique-2. La ‘chora’ sémiotique: l’ordonnancement des pulsions,” La révolution du langage poétique (Paris: Edition du Seuil, coll. Points essais, 1974/2012), pp. 22-30. 줄리아 크리스테 바, 김인환 옮김, 『시적 언어의 혁명』(동문선, 2000), pp. 25-33.
[12] Jean-Luc Nancy, “Soit à écrire le corps,” Corpus, pp. 12-13.
[13] 타원형 테이블이 행성들로 밀집된 우주라는 비유가 비약적이긴 하지만, 아주 근거 없는 상상도 아니다. 이번 전시회의 야외전시장에 설치된 조각 작품 <연역적 오브제>의 이미지가 바로 인도 힌두교의 우주 탄생을 뜻하는 도상인 ‘브라만다’에서 착상됐다는 점에서, 필자는 이 비유를 확신할 수 있다. 브라만다는 ‘브라마 신(梵天)의 알’이라는 용어로, 그 모양은 커다란 타원형이나 구형으로 묘사되곤 한다. 힌두교 우주창조설에서는 이 브라만다를 만물의 근원인 우주로 간주한다. <마음의 기하학>과 <연역적 오브제>는 둘 다 대규모의 타원형 형태를 사용하고 있다. 차이가 있다면, 전자가 타원형의 테이블을 수평으로 설치한데 비해, 후자는 타원형의 입체물을 수직으로 세웠다는 데 있다.
[14] 사단(四端)은 인간 본성에서 우러나오는 네 가지 도덕적 감정인 반면, 칠정(七情)은 인간 본성이 사물을 접하면서 사사로이 경험하는 일곱 가지 감정이다. 각주 7번을 볼 것.
[15] 비야사(Vyāsa), 정승석 옮김, 「요가 수트라와 요가 철학」, 『요가 수트라 주석』(소명출판, 2012) 참조함.
[16] 법성게(法性偈) 중 일부를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法性圓融無二相(현상과 본성은 원융하여 두 모습이 없으며), 諸法不動本來寂(모든 법은 움직이지 않으니 본래 고요하여), 無名無相絶一切(이름할 수 없고 모양도 없고 일체가 끊어져) 證智所知非餘境(증득한 지혜로 알 것이요 범부의 경계가 아니네). (…) 一中一切多中一(하나 가운데 전체가 있고 전체 가운데 하나 있
으니). 一卽一切多卽一(하나가 곧 전체요 전체가 곧 하나이네). 一微塵中含十方(한 티끌 그 가운데 시방을 머금고 있으니) 一切塵中亦如是(전체의 티끌 가운데도 역시 시방을 머금었네).
- — Essay from Exhibition Catalogue 'Kimsooja: Archive of Mind' published by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Korea, 2017. pp.156-269.
 Deductive Object, 2016, site specific installation consisting of painted welded steel, aluminum mirror panels, Sculpture: 2.45 x 1.50 m, Mirror: 10 x 10 m. Installation view at Kimsooja - Archive of Mind at MMCA, Seoul. Courtesy of MMCA and Hyundai Motor Co. and Kimsooja Studio. Photo by Aaron Wax.
Deductive Object, 2016, site specific installation consisting of painted welded steel, aluminum mirror panels, Sculpture: 2.45 x 1.50 m, Mirror: 10 x 10 m. Installation view at Kimsooja - Archive of Mind at MMCA, Seoul. Courtesy of MMCA and Hyundai Motor Co. and Kimsooja Studio. Photo by Aaron Wax.
Archetype of Mind
Kim Sung Won (Professor,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2017
- While a group of people is working diligently around a large oval table, a mysterious sound reverberates through the dark space. The exhibition Archive of Mind (2016) begins with these curious, almost cosmic sounds, along the huge empty table. The accumulation of small, solid balls of clay on the tabletop forms an image that perfectly complements the sound, creating the central work Archive of Mind (2016). The delicate combination of the sound and image coax the viewers to consider a primal time and space that existed before civilization.
Galaxy of Mind
-
The sound that continually echoes through the space of Archive of Mind is a mixture of the sound of dried clay balls being rolled across the table in different directions and the sound of the artist gargling water. The recorded sound, which is amplified from underneath the table, travels between 32 speakers, transforming the space into a meditative arena. When the volume is low, the sound of the clay balls is clear and vivid, but when the volume is raised, the sound becomes a storm of thunder and lightning. The cosmic dimension of the work is particularly intriguing, given that the artist Kimsooja described Archive of Mind as a “galaxy of mind.” She continued to say that the “sound of the clay balls rolling over the flat surface represents the horizontal trajectory, while the gurgling sound of water represents the vertical trajectory of traversing one’s diaphragm.”[1] Hence, the work visualizes a psychological geometry that arises from the coexistence and dynamics between these horizontal and vertical trajectories. Moreover, the sound of the round balls rolling across the table provides viewers with an auditory experience of geometric shapes. Thus, through sound, Archive of Mind evinces both the material surface and the surrounding void. Archive of Mind encompasses the sound of Unfolding Sphere along with the performance of the people forming the clay balls, yielding an immersive experience that transcends polarities and dualities, enacting a unity that may be seen as the motivating power behind Kimsooja’s art.
-
Although her interest in ceramics can be traced back about ten years, Kimsooja has only recently begun to create works with clay. The clay balls first appeared in 2016, when Kimsooja was invited to participate in Water Event, the solo exhibition of Ono Yoko (b. 1933) at the Musée d’Art Contemporain de Lyon.[2] For that exhibition, Kimsooja exhibited a single ball that she had shaped from a handful of wet clay. Rather than transforming clay into utensils or objects, she is primarily interested in the material characteristics of the clay, as well as the dual possibility of emptying and filling. The act of making a ball of clay requires the use of both hands to cover, press, and roll the clay. In order to form a perfect sphere, all points of each hand must be focused and directed towards the center. Each clay sphere, consisting of earth and water, is a microcosm of our planet as a living organism.
-
This simple and repetitive process is also related to the concept of Bottari, Kimsooja’s artistic trademark. “Bottari” refers to the practice of bundling goods or possessions in a traditional wrapping cloth for easier transportation. Considering this universal act, Kimsooja said, “Like these forms gradually converging to the center, my mind also converges. Moreover, these acts embody the moment when materiality is transformed into immateriality and ‘void’.”[3] Here, rolling a clay ball is no longer a frivolous act of play. Instead, it becomes a type of ritual in which a mind is formed and shaped by shaving off the sharp corners. Also, the repetitious act of rolling balls of clay between one’s palms can leave people enchanted, like a spell.
Completion of Works and Audience
-
At the entrance of Kimsooja’s Archive of Mind, clay is provided for visitors; they may take as much as they like, with the understanding that they will roll it into one or more balls and place them on the table. It is crucial to note that Kimsooja has never incorporated this type of audience participation in any of her previous works. As such, it seems to necessitate some explanation and justification. In the contemporary art world, works involving audience participation are generally well-received, in part because they are almost guaranteed to draw a large audience. At the same time, however, they have been criticized for pandering to popular tastes. Of course, just because an artwork or exhibition generates a positive public response does not necessarily mean that it has pandered to popular tastes, just as works that are not well-received cannot automatically be classified as progressive or experimental. Moving beyond such issues, we should focus on the details of audience participation in this work. In particular, how do the audience’s actions (i.e., entering the exhibition, choosing clay, rolling it into a ball, putting it on the table, leaving the exhibition) connect and contribute to the overall meaning and context of Kimsooja’s existing oeuvre?
-
In her works, the audience has always been one with the artist, sharing the artist’s thoughts and point of view. To understand her works, we must examine how the artist-subject is transformed into the audience-subject. In A Needle Woman and A Laundry Woman, for example, the audience is forced to focus their attention on a woman’s back. As such, the audience virtually wears the clothes of the artist, and sees the world from the position of the artist. For her Bottari works, discarded clothes are bundled inside used blankets and sheets of unknown origin; the resulting parcels are then carried to various parts of the world by a searching subject. Thus, the subject is once again conflated with the audience. In Kimsooja’s works, the audience is not a passive recipient of the artist’s ideas or perspectives; instead, the audience is transformed into an active and initiative subject who shares various forms of life that are guided by the artist. In Archive of Mind, the audience takes on an even more active role by clasping and rolling clay, an act that distinctly recalls the packing and wrapping of Bottari parcels. Like the active subject who symbolically becomes the artist’s body and envelopes the world, the audience of this exhibition participates in a kind of ritual by forming balls of clay, thereby helping to complete this work by unfolding their own “Archive of Mind.”
Geometric Experiences
-
For people who know Kimsooja primarily through A Needle Woman or her Bottari works, the theme of this exhibition might be a little surprising. Notably, however, the displayed works still feature two fundamental characteristics that have defined her work for over thirty years: a horizontal-vertical structure and a dynamic spatial relationship. In her art, Kimsooja uses geometric thoughts and experiences to unify dualities, thus yielding a new type of space. This psychological geometry tends to emphasize the quality of space, rather than the quantity, often creating new forms by transitioning from one condition to another.
-
In A Study on Body (1981), an early work that she made while she was in her twenties, Kimsooja explored geometric shapes by using her own body as an axis, around which her various joints bend both vertically and horizontally. The documentation of her performance demonstrates how bodily movements can enact basic geometric shapes, such as triangles, squares, circles, and semicircles. Indeed, A Study on Body lays the framework for understanding the recurring vertical-horizontal cross structure that has now characterized Kimsooja’s works for more than thirty-five years. In the early 1980s, when there were many regulations limiting international travel for Koreans, Kimsooja went to Japan for the first time, as part of an exchange exhibition. Almost immediately, she noted the difference between the cultures of the two countries. From that point forward, she began emphasizing structural and formal characteristics that are inherent to Korea, such as austerity, incompletion, unique colors, and the principle of the “Three Ultimates” (i.e., Heaven, Earth, and mankind). She began utilizing the dynamism of the cross structure to interpret everything from aspects of daily life to grand concepts of life and death. This is the context from which A Study on Body emerged. Indeed, this structure has remained a consistent element of her subsequent works (e.g., Bottari, A Needle Woman, A Mirror Woman, To Breathe), functioning like an archetype of her practice. Furthermore, this structure provides the primary meaning and connection among the diverse works presented in this exhibition, such as A Study on Body (1981), Geometry of Body (2006-2015), and Archive of Mind (2016).
-
One of the main characteristics of contemporary art is the mixture of temporal and spatial attributes. In this sense, Kimsooja’s Geometry of Body can be said to visualize the invisible by spatializing time. This work involves a yoga mat that the artist has used since 2006, such that it is now embedded with traces of her body, forming a perfect self-portrait. The colorless traces left by countless pressings of her hands and feet cause us to imagine gravity and her momentary movements. The yoga mat also extends the concept of the “readyused,”[4] which characterized her earlier works with bottari, blankets, and sheets. Here, however, the object is used to visualize the body and to reveal ephemeral motion and gravity. In a similar vein, One Breath (2004/2016), which originated as part of Kimsooja’s sound performance of The Weaving Factory (2004), is a digital embroidery drawing that reproduces the wavelength of a single breath of Kimsooja. During a breathing performance, a monitor tracks the artist’s inhalations and exhalations; then, one full breath is chosen at random and rendered as digital embroidery. The peaks and valleys of regular respiration are recorded as a graph, followed by a horizontal line that marks the moment of respiratory arrest. The prominent vertical-horizontal structure and depth of the breathing performance represent an extension of the circular loop that she had earlier represented in her sewing works, which she stopped making in 1992.
Deductive Space
-
Deductive Object (2016), a sculpture of the artist’s own arms, is Kimsooja’s first work involving life casting. The two arms are facing one another, with the thumb and index finger touching to form the void. At first glance, it looks like a rather straightforward example of life casting sculpture. But upon further consideration, the distinctive position of the thumb and index finger inevitably makes us think of holding a needle. Kimsooja views this connection as another form of weaving, constructing a void within the act. This gesture calls to mind her earlier series Deductive Object (1992), which consisted of wrapped objects. That series was an extension of Kimsooja’s early sewing works, wherein she used the motion of the needle to represent the repeated penetration of the horizontal by the vertical. Similar to Bottari, the act of sewing connects dualities, weaves separate entities to form a new relationship, and proposes an aesthetic of tolerance and embrace. Installed in the museum’s courtyard, the new version of Deductive Object (2016) is Kimsooja’s second outdoor sculpture; the first was A Needle Woman: Galaxy Was A Memory, Earth Is A Souvenir (2014), a work involving nanotechnology, which was installed on the campus of Cornell University in New York. Deductive Object (2016) was inspired by the Brahmanda (black stones sometimes called “cosmic eggs”) an Indian symbol of the birth of the universe. According to Indian tradition, the black surface of the Brahmanda is rubbed until it becomes reflective, like a mirror. Learning about the Brahmanda, Kimsooja recognized various points of connection with her own work, particularly related to the attitude and significance of her Bottari works. These affinities led to the creation of a huge ellipsoid decorated with Obangsaek (five-colored bands – include description in footnote). In Kimsooja’s early Bottari works, the two-dimensional surface (or tableau) of fabric became a three-dimensional sculpture through the simple act of tying.[5] For this exhibition, Deductive Object enacts a new type of transformation, with the geometry of Bottari now visualized as a five-colored ellipsoid. Moreover, this unique transformation is reflected and expanded by the mirrored pedestal that holds the ellipsoid.
-
A cosmic egg placed on a mirror, Deductive Object coexists with To Breathe (2016), a site-specific work made with diffraction grating film. For To Breathe, Kimsooja transformed the windows and walls of the museum’s courtyard into a giant Bottari, a technique she had previously employed with A Mirror Woman (2006) at the Crystal Palace in Madrid.[6] In the current work, the walls are covered with the diffraction grating film that radiates an array of colors and sunlight in all directions, filling the space with a brilliant spectrum. Through this site-specific work, the courtyard becomes a welcome respite where the audience can rest and meditate. In addition, the ground is lined with mirrors that reflect everything, highlighting the immateriality and void of the five-colored ellipsoid. To Breathe extends the void of space onto the surfaces, thereby “immaterializing” the duality of Bottari into the language of light. Therefore, the work maximizes the symbolic power of the unity between sculpture and flat surface, between the material and immaterial.
Weaving the World
-
The only video work in the exhibition is Thread Routes – Chapter V (2016), the fifth in Kimsooja’s Thread Routes series (2010-) documenting her travels throughout the world. This edition, set in North America, merges cultural anthropology, unique geology, and astounding natural scenery. The artist combines images of a spinning wheel with scenes of basket weaving by the Navajo and Hopi tribes, against the magnificent scenery of Shiprock and Canyon de Chelly in the Southwest United States, along with ancient ruins of the Chaco Culture. The huge mountains and caves, formed over eons of time by water, wind, and soil, move both spatially and temporally until they become connected to overhead wires, long stretches of road, and eventually, the industrial environment of a huge metropolis. The video ends with an aerial view of the massive ramps, freeways, and intersections of Los Angeles. Using an anthropological exploration, the video reveals how the fabric of the world is shaped by acts of weaving, enveloping, and unfolding.
-
Although the first chapter of the Thread Routes series was finished in 2010, the series can actually be traced back to 2002. At that time, Kimsooja drew the inspiration for “Thread Routes” from the tradition of weaving lace in Bruges, Belgium, which she examined within the context of various architectural features. Through the series, she has explored other European and Asian traditions of lace weaving, crafts, and embroidery, as well as the spinning wheel of Native American nomads. On one hand, the series may be seen as a type of cultural anthropology, but at the same time, it overwhelms us with lyrical beauty, and thus might be called the poetics of nature and civilization. Although the new video does not include any of Kimsooja’s most recognizable motifs (e.g., a needle, bottari, the artist’s back), it deftly posits a grand unity by addressing various dualities (e.g., self and others, man and woman, wrapping and unfolding, spirit and material, civilization and non-civilization, traditional and contemporary, city and nature).
-
Wrapping and unfolding, tying and untying, connecting and disconnecting are the basic acts of Kimsooja’s art. While these acts play a prominent role in her art (especially her bottari and breathing performances), they are not merely formalistic executions. Instead, operating within a vertical-horizontal structural relationship, they link various dualities and enact a shift from material to immaterial. Archive of Mind is the geometry of wrapping and unfolding, acts that enable dots, lines, and planes to come into contact with one another. In that moment, the immaterial is changed into the material, and vice versa. Hence, this geometry of unfolding-and-wrapping is an incessant exploration of the space of materiality and immateriality. Archive of Mind is a psychological geometry that reveals the dynamic relationship between movements and forms, producing surfaces and structures with the potential for motion, while simultaneously searching for a formless form. Summoning the psychological archetype from the “archive of mind,” these works ultimately guide our attention towards an empty void and an intangible space.
[Note]
[1] Interview with the artist on October 22, 2016.
[2] Yoko Ono, Invitation to Participate in a Water Event (1971, new version 2016), Musée d’Art Contemporain de Lyon, 2016.
[3] Interview with the artist on October 22, 2016
[4] The preexistence of an object was conceptualized through the transition from “readymade” to “readyused.”
[5] Ryu Byeonghak, “Special Interview: Kimsooja,” Art in Culture (February 2010), pp. 126-137.
[6] A Mirror Woman (2006), exhibition catalogue published by the Museo Nacional Centro de Arte Reina Sofía, Madrid, Spain
- — Essay from Exhibition Catalogue 'Kimsooja: Archive of Mind' published by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Korea, 2017. pp.118-155.
 Deductive Object, 2016, site specific installation consisting of painted welded steel, aluminum mirror panels, Sculpture: 2.45 x 1.50 m, Mirror: 10 x 10 m. Installation view at Kimsooja - Archive of Mind at MMCA, Seoul. Courtesy of MMCA and Hyundai Motor Co. and Kimsooja Studio. Photo by Aaron Wax.
Deductive Object, 2016, site specific installation consisting of painted welded steel, aluminum mirror panels, Sculpture: 2.45 x 1.50 m, Mirror: 10 x 10 m. Installation view at Kimsooja - Archive of Mind at MMCA, Seoul. Courtesy of MMCA and Hyundai Motor Co. and Kimsooja Studio. Photo by Aaron Wax.
마음의 원형
김성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2017
-
정체를 알 수 없는 신비한 소리가 검은 공간을 감싸고, 거대한 타원형 탁자의 주변에는 사람들이 둘러앉아 무언가를 열심히 만들고 있는 광경이 어슴푸레 드러난다. 우주를 연상케 하는 사운드와 텅 빈 타원형 탁자에서 시작된 <마음의 기하학>은 수많은 사람들과 수많은 시간이 빚어낸 작은 찰흙 구들이 타원형 탁자를 채우면서 서서히 완성된다. 작고 단단해 보이는 찰흙 구들로 가득 찬 공간과 우주의 소리를 방불케 하는 사운드, <구의 궤적>의 절묘한 결합은 마치 우리를 문명 이전의 태초의 시공간으로 안내하는 듯하다.
-
마음의 은하수
-
공간을 지속적으로 감싸는 이 신비로운 사운드 <구의 궤적>은 서너 명의 사람들이 단단하게 건조된 찰흙 구들을 탁자 위에서 서로 각기 다른 방향으로부터 굴리는 소리와 작가가 물로 가글링하는 소리를 믹스한 사운드 작업이다. 볼륨이 낮을 때는 구슬들이 굴러다니는 듯한 영롱한 소리로 들리다가, 볼륨의 세기가 점점 커질수록 천둥 번개가 치는 소리 같기도 하고 우주의 행성들이 부딪히는 굉음처럼 들리기도 한다. ‘마음의 은하수’라는 작가의 시각적 표현과 더불어 이 작업의 우주적 차원은 작품에 흥미로움을 더한다. 이 작업에서 “찰흙 구들이 평면 위를 굴러다니는 사운드는 수평 궤도를 반영하고 물로 가글링하는 사운드는 신체의 횡격막을 가로지르는 수직 궤도를 반영하며”,[1] <구의 궤적>은 수직・수평 궤도의 공존과 그 역학 관계에 의해 생성되는 심리적 기하학을 가시화하게 된다. 더불어 이것은 사운드를 통해서 표면의 기하학과 보이드(void)의 기하학을 시각화하고 있으며, 마모된 찰흙 구의 모서리들이 표면에 맞닿을 때, 그것의 기하학적 형태를 청각적으로 경험하게 한다. 한편, 이 작업의 영어 제목인 ‘Unfolding Sphere’ 사운드 퍼포먼스와<마음의 기하학>에서 찰흙 구들을 ‘둥그렇게 감싸는’ 퍼포먼스는 서로 쌍을 이루며 김수자 작업의 동력이라 할 수 있는 양극성과 이원성의 화합을 청각적, 촉각적 경험으로 풀어내고 있다.
-
작가가 도자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1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그가 흙으로 작품을 한 것은 아주 최근의 일이다. 2016년 초 리옹 현대미술관에서 열렸던 요코 오노 개인전의 ‘워터 이벤트’에 초청받아 만든 작은 찰흙 구가 그의 첫 흙 작품이었다.[2] 그는 마르지 않은, 물을 머금은 찰흙 한 줌으로 작은 구를 한 개 빚어 그것을 그대로 미술관에 보냈다. 사실 작가는 흙으로 용기나 오브제를 만드는 것보다는 ‘비움과 채움’의 가능성을 가진 흙의 재료적 특성에 더 끌렸다. 찰흙으로 구를 만드는 행위에는 양 손바닥에서 점토를 끊임없이 감싸고 누르고 어루만지는 행위가 수반된다. 이 행위는 손의 양극을 싸는 모서리들이 중심을 향해 모아져야 하며, 모든 모서리들이 중심을 향해서 모였을 때 하나의 구가 형성된다. 이렇게 형성된 작은 찰흙 구는 그 자체가 물을 담고 있는 용기일 뿐만 아니라 생명체로서의 지구를 은유하기도 하며 나아가서는 김수자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보따리의 개념을 연장하는 것이기도 하다. 누구나 한 번쯤은 해봤을 이 단순하고 평범한 행위에서 김수자는 “형태가 점점 중심을 향해 모아지면서 마음도 함께 모아진다는 것, 그리고 그런 행위를 통해서 물질성이 어느 순간 비물질성, 즉 ‘보이드’로 변형되는 순간”을 인식하게 된다.[3] 이제 찰흙 구 만들기는 그저 단순한 놀이가 아니다. 마음의 형태를 만들고 그 모서리를 깎아 나가는 일종의 ‘의식(ritual)’과도 같다. 양 손바닥으로 흙을 빚는 반복적 행위는 가히 주술적이라 할 만큼 사람들을 빠져들게 만든다.
-
작업의 완성과 관객
-
김수자의 <마음의 기하학>은 관객들이 전시장 입구에 준비된 다양한 점토들을 선택하고 원하는 양만큼 덜어가서 둥글게 빚은 후 탁자 위에 올려놓는 것이 주가 되는 작품이다. 이러한 관객의 참여는 그의 기존 작업에서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시도인데 그렇다면 이것의 의미와 그 당위성을 밝히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 현대미술에서 관객 참여형 작업은 대중적 흥행을 담보한다는 점에서 최근 들어 환영받고 있기도 하나, 동시에 현대미술의 대중 영합적 측면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기도 하다. 물론 대중의 호응도가 높다고 무조건 대중 영합적인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다고 해서 실험적이고 진보적인 것도 아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관객이 전시장에 들어서서 점토를 선택하고 동그란 구를 빚어 탁자에 올려놓고 나오는 행위가 김수자의 기존 작업의 맥락과 어떻게 연결되며, 여기서 ‘관객의 행위는 무엇에 일조하는가’라는 답을 찾는 것이다. 김수자의 작업에서 관객은 언제나 작가와 하나가 되어 작가의 시선과 사유를 공유해 왔다. 그의 작업에서는 ‘작가-주체’가 ‘관객-주체’로 이행되는 과정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관객이 <바늘 여인>, <빨래하는 여인 A Laundry Woman>의 ‘뒷모습’에 주목하는 순간, 관객은 ‘작가 몸의 옷’을 입고 바로 작가가 선 자리에서 작가가 바라보는 세계 그 이상의 것을 바라보게 된다. 출처를 알 수 없는 그 누군가가 사용했던 이불보로 버려진 헌 옷들을 싸며 그것을 싣고 이 세상 곳곳 을 찾아 나서는 <보따리 Bottari> 작업의 주체와 관객과의 관계 또한 동일한 맥락에서 읽힐 수 있을 것이다. 김수자의 작업에서 관객은 더 이상 작가가 제시하는 관점을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수동적 주체가 아니라 작가가 안내하는 삶의 다양한 형태들을 공유하는 적극적이고 능동적 주체로 전환된다. 이러한 능동적 관객은 이번 <마음의 기하학>을 통해서 찰흙을 감싸고 굴리는 행위가 보따리를 싸고 아우르는 행위와 동일하다는 것을 입증한다. 또한 작가의 몸이 되어 세계를 감싸 안으며 작업을 완성시키는 능동적 주체와 마찬가지로 이 전시의 관객은 찰흙 구의 모서리를 깎는 일종의 ‘의식’에 동참하며, 각자의 ‘마음의 기하학’을 품어냄으로써 이 작업의 완성에 일조하게 된다.
-
기하학적 경험
-
김수자를 <보따리>와 <바늘 여인>의 작가로만 알고 있던 관객에게는 이번 전시의 주제어라 할 수 있는 ‘기하학’이 다소 생경하게 다가올 수도 있겠다. 하지만 수직・수평 구조와 공간의 역동적 관계는 지난 30년간의 김수자의 모든 작업을 관통하는 근본적 개념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될 것이다. 김수자의 작업에서 기하학적 사유와 경험은 이원성과 양극성의 화합을 통해서 새로운 유형의 공간을 창조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다. 이 심리적 기하학은 공간의 양보다는 공간의 질, 즉 한 조건에서 다른 조건으로의 이행을 형태화하는 것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
-
그의 아주 초기 작업인 <몸의 연구>는 몸을 하나의 축으로 잡고 몸의 마디를 수직과 수평으로 접으면서 몸의 기하학적인 형태를 연구한 작업 이다. 이는 삼각형, 정사각형, 반원, 원 등의 기본적인 기하학의 구도 안에서 신체 동작들이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보여주는 퍼포먼스를 기록한 결과물이다. <몸의 연구>는 작가가 20대 때 시도했던 초기의 작품이지만 30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김수자 작업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수직・수평 구조(십자 형태)를 이해하는 데 단초가 된다. 여행이 자유롭지 않았던 1980년대 초에 작가는 일본에서 열린 교류 전시를 계기로 처음 일본 문화를 직접 경험하고 양국의 문화가 다름을 인식한다. 이후 작가는 우리 삶에 배어 있는 소박함, 미완성, 독특한 색감 그리고 천지인삼재(天地人三才)에 근거한 구조적 특성에 주목하게 되고, 일상의 모든 것, 삶과 죽음까지도 십자형 구조의 역학관계로 해석하기 시작한다. <몸의 연구>는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탄생한 작업이며 수직・수평 구조와 공간의 역학 관계를 잘 보여주고 있어 그 이후 지금까지 작가의 ‘마음의 원형’처럼 작동하고 있다. 이것은 작가의 <보따리>, <바늘 여인>, <거울 여인 A Mirror Woman>, <호흡 To Breathe> 작업을 호출하는 한편, 이번 전시에서 볼 수 있는 <몸의 연구>, <몸의 기하학 Geometry of Body>(2006~2015), 그리고 <마음의 기하학>의 연결 고리를 발견하고 그 의미를 되새기게 한다.
-
시간과 공간의 속성을 혼합하는 것이 오늘날 현대미술의 특징 가운데 하나라고 한다면, 김수자의 <몸의 기하학>은 시간을 공간화하며 비가시성을 구체화한 작업이라 할 수 있다. 2006년부터 10년간 사용한 작가의 요가 매트, 거기에 새겨진 몸의 흔적은 작가의 완벽한 하나의 자화상으로 전환되며, 우리는 역설적으로 작가의 손과 발이 남긴 요가 매트의 색 바랜 흔적에서 순간적인 동작과 중력을 상상하게 된다. 이 매트는 또한 기존의 ‘보따리’나 ‘이불보’가 다루었던 ‘레디유즈드(readyused)’[4]의 개념을 연장하는 동시에 비가시적인 동작과 중력이 시각적으로 드러난 인체 페인팅으로 전환된다. <숨 One Breath>(2004/2016)은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한 숨’의 파장을 재현한 디지털 자수 드로잉이다. 작가의 호흡 퍼포먼스인 <직물공장> 중에서 들숨과 날숨의 한 ‘세그먼트(segment)’를 임의로 끊어서 디지털로 자수를 놓은 작업이다. 날숨과 들숨의 극점들이 서로 연결되는 과정이 그래프로 표현되고 수평으로 가로지는 선은 호흡이 정지된 순간을 의미하게 된다. 김수자의 호흡 퍼포먼스는 1992년에 바느질을 그만둔 이후 바느질이 상징하는 수직・수평 구조와 깊이 그리고 순환 고리의 개념을 연장하는 작업이기도 하다.
-
연역적 공간
-
김수자의 작업에서 최초의 라이프 캐스팅(life casting) 작업인 <연역적 오브제>(2016)는 작가의 두 팔을 캐스팅한 조각 작품이다. 양손의 엄지와 검지는 동그란 원을 그리며 맞닿아 있고 이 두 팔은 서로 마주보게 설치되었다. 단순한 신체 캐스팅 조각으로 보일 수 있는 이 작품에서 엄지와 검지가 맞닿아 있는 모양은 자연스럽게 ‘바느질’ 행위와 연결된다. ‘바느질’은 수평적 세계에 물리적으로 관통하는 수직의 세계를 상징하는 김수자의 초기 바느질 작업의 연장선상에 있는 오브제 감싸기 작업인 <연역적 오브제>(1992)을 호출하며 ‘보따리’와 함께 양극을 잇고 타자와의 관계를 직조하며 수용과 포용의 미학을 제안한다. 이번 전시의 또 다른 <연역적 오브제>(2016)는 미술관 중정(中庭)에 설치된 야외 조각이다. 2014년 코넬 대학교에 설치된 나노 테크놀로지 조각인 <바늘 여인> 이후 두 번째 야외 조각인 이 <연역적 오브제>는 우주의 탄생을 상징하는 인도 브라만다의 검은 돌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된 작업이다. 검은 돌이 거울처럼 될 때까지 문지르는 인도의 브라만다 전통과 ‘우주의 알(cosmic egg)’이라는 이름에서 작가는 자신이 <보따리> 작업에 임하는 태도와 보따리의 의미가 연결될 수 있는 지점을 발견했고, 이는 오방색 띠로 장식된 거대한 타원체가 탄생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초기 보따리 작업에서 ‘천’이라는 2차원의 평면(tableau)이 단순히 ‘묶는’ 일상적인 행위를 통해서 3차원의 조각이 된다는 ‘변형(transformation)’에 주목했다면,[5] 이번 <연역적 오브제>는 이러한 ‘보따리의 변형’을 재정의한 작업이다. 즉, 이 오방색 타원체는 그것을 반영하고 확장하는 거울을 좌대 삼아 우주의 기원과 순환을 상징화하면서 보따리의 기하학을 시각화했다.
-
거울 위에 놓인 우주의 알(<연역적 오브제>)은 특수필름을 이용한 장소 특정적 작업인 <호흡>(2016)과 공존하고 있다. 이 <호흡> 작업은 크리스털 궁전에서와 마찬가지로[6] 미술관 중정을 둘러싸고 있는 유리 벽을 하나의 보따리로 상정하고, 빛의 세기와 방향에 따라 다양한 스펙트럼을 발산하는 특수필름을 유리 벽에 설치하면서 중정을 감싼다는 개념을 제안하고 있다. 태양 광선이 회절되며 오색찬란한 빛의 스펙트럼이 확산되는 이 사각형의 중정은 관객이 명상과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장소 특정적 작품으로 전환된다. 모든 것을 반사하는 거울 바닥은 오방색 타원체의 비물질성을 반영하고 그것의 보이드를 시각화한다. 아울러 이 작업은 공간의 보이드 개념을 표면으로 확장하고 보따리의 이원성과 양극성 개념을 빛의 언어로 비물질화하면서 조각과 평면, 물질과 비물질의 화합의 상징적 효과를 더욱더 극대화한다
-
세계를 직조하기
-
이번 전시의 유일한 영상 작업인 <실의 궤적 V>은 2010년부터 전 세계를 종횡무진하며 기획 중인 <실의 궤적> 시리즈 가운데 다섯 번째 작업으로, 북미 지역을 무대로 하고 있다. 이 영상은 애리조나의 배를 닮은 거대한 바위 봉우리인 십락과 캐니언 드 셰이 협곡의 기묘한 지형과 환상적인 자연, 그리고 뉴멕시코 차코 문화의 오래된 폐허 건축 등 문화인류학적으로도, 지질학적으로도 경이로운 경관을 배경으로 나바호 족과 호피 족의 물레질, 바구니 만들기, 갈퀴로 직조하는 장면과 오버랩된다. 오랜 세월 동안 자연의 흙이 조성한 거대한 산, 동굴, 물회오리 등의 자연 환경은 시・공간을 자연스럽게 이동하며 도로의 전기선들과 연결되고 거대 도시의 산업적 환경과 조우하게 된다. LA의 거대한 도시 교차로를 항공 촬영한 장면과 함께 끝나는 이 영상 작업은 세계라는 직물을 짜고 감싸고 풀어내는 행위를 인류학적 탐구로 풀어낸다.
-
<실의 궤적> 시리즈의 첫 번째 장이 완성된 해는 2010년이지만, 사실 이 작업의 시작은 200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작가는 벨기에 브뤼주의 전통인 레이스 뜨기와 건축물의 구조적 특징에 주목하면서 <실의 궤적>에 대한 영감을 얻었고, 그 이후 유럽의 레이스 뜨기, 인디언 유목민들의 자수와 물레질, 아시아의 다양한 직조나 공예적 전통을 수집하며 <실의 궤적>의 장을 하나씩 완성해 갔다. 이 영상 시리즈는 그 자체가 하나의 문화인류학적 보고(寶庫)이기도 하며, 자연과 문명의 시학이라 할 만큼 서정적 웅장미로 우리를 압도한다. 여기에는 바늘이나 보따리, 혹은 작가의 뒷모습은 찾아볼 수 없지만 자아와 타자, 남성과 여성, 펼침과 감싸기, 정신과 물질, 문명과 비문명, 전통과 현대, 도시와 자연과 같은 이원적 요소들이 절묘하게 다루어지며 이중성과 양극성의 대화합을 노래하고 있는 듯하다.
-
감싸고 펼치고, 묶고 풀고, 잇고 끊는 것은 김수자 작업의 기본 행위이다. <보따리> 퍼포먼스, <호흡> 퍼포먼스, 그리고 김수자의 작업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이 행위들은 단순한 형식주의적 실행은 아니다. 이것은 매번 수직・수평의 구조적 관계 속에서 양극을 연결하고 이원적 요소들을 결합하며 물질에서 비물질로의 전환을 주도한다. <마음의 기하학>은 펼침(unfolding)과 쌈(wrapping)의 기하학이다. 싸고 펼치는 행위는 점, 선, 면을 서로 접촉시키는 것이며 이때 비물질이 물질이 되고 또 물질이 비물질로 전환되는 것이다. 물질과 비물질의 공간에 대한 끊임없는 탐구로서 ‘마음의 기하학’은 움직임과 형태의 역동적 관계를 드러내고 잠재적으로 이동 가능한 표면과 구조를 형성하며 무형의 형태를 찾는 심리적 기하학이다. 이것은 마음의 기록 보관소(archive of mind)에서 심리적 원형(archetype)을 호출하고 완벽하게 비어 있는 상태, 비물질적 공간을 향해 나가는 데 해답을 제시하고 있다.
[Note]
[1] 작가와의 인터뷰(2016. 10. 22.) 중에서.
[2] 요코 오노, ‘워터 이벤트 초청(1971, new version 2016)’(리옹 현대미술관, 2016)
[3] 작가와의 인터뷰(2016. 10. 22.) 중에서.
[4] 레디메이드(readymade)에서 레디유즈드로의 이행을 통해 오브제의 선재성(先在性)을 개념화한 것.
[5] 류병학, 「스페셜 인터뷰: 김수자, 지수화풍(地水火風)에서 생명을 보다」, 『아트 인 컬처』11권 2(2010. 2), pp. 127-137.
[6] 《호흡: 거울 여인》, 2006, 레이나 소피아 현대미술관, 스페인 마드리드.
- — Essay from Exhibition Catalogue 'Kimsooja: Archive of Mind' published by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Korea, 2017. pp.118-155.
 Archive of Mind, 2016, participatory site specific installation consisting of clay balls, 19 m elliptical wooden table, and sound performance Unfolding Sphere, 2016, Installation at Kimsooja - Archive of Mind at MMCA, Seoul, Photo by Aaron Wax ,Courtesy of MMCA and Hyundai Motor Co. and Kimsooja Studio
Archive of Mind, 2016, participatory site specific installation consisting of clay balls, 19 m elliptical wooden table, and sound performance Unfolding Sphere, 2016, Installation at Kimsooja - Archive of Mind at MMCA, Seoul, Photo by Aaron Wax ,Courtesy of MMCA and Hyundai Motor Co. and Kimsooja Studio
Kimsooja: The Task of Being-Together
Steven Henry Madoff (Professor, the School of Visual Arts in New York)
2017
-
The world is torn by conflict and yet each tear, each micro-struggle and clash is toward its own version of unity. All conflict is a nostalgia for and trajectory toward a totalizing scheme. Of course, there are different structures of totalization, some that suppress difference and others that support a democratic ethos. In the broadest sense, the idea of totalization is captured by Martin Heidegger’s term “Being-in,” for which the simplest definition is offered by
Peter Sloterdijk as “something with something in something.”[1] The social example of Being-in is that we are each a something, and so we are somethings together within the something that is society. Society: from the Latin socius, a being-together of social beings. Civitas: from the Greek word for city and which leads to the word “citizen,” or those who live together in organized space. Polis: from the proto-Indo-European pele, an enclosed space, so that the polis is an enclosed space of citizens in which to Be-in is to live under the organization of social codes, of codes among social beings, though the codes, as all the annals of human time tell us, are always in a state of both schematized and anarchic disruption carried forward into negotiation and revision. -
Socius. Civitas. Polis. In the art of Kimsooja, there are two assumptions that underlie the symbolic social intention running throughout her career of making. One of these assumptions is journalistic in its basis, accepting the daily and historical record of events. This assumption is that humans are (by the evidence of actions always and everywhere repeated) violent, destructive, and intolerant. The other assumption, in contrast with the first, is that we seek wholeness and rely on healing and care in its many forms to address the iniquities of human destructiveness. Indeed, these counterpoised signatures of human conduct are the needle dipping in and out of the cloth of being human and the belief structures underlying our nature, both theological and philosophical. The biosphere, the life codes, the sociality, the deistic principles, the ethical apparatuses – whether it is a war in our blood, a crisis of political sovereignty or a crisis of religious faith – these constructs torn asunder or joined together in unified consensus toward the co-existence of difference are within the praxis of Being-in.
-
Society within itself has, from the time of Aristotle, asked the questions of what is the good life and how can we live together? This is the subject of ethics. But in the short space of this essay, I would like to specify this thinking about ethics as a questioning of how we should act toward one another in order to live in consensual understanding and agreement, and by doing so mediate violence toward the social whole. Can we, therefore, understand Being-in in the limited sense of its social format of being-together? Can we understand totalization not as universalism and absolutism, but as a space of closeness in which otherness and improvisation act as fulcrums in a continual rising and falling of chaos and order? And can we then define this being-together as the responsibility of the socius to overcome its violence toward wholeness, its lacerating shards that are the fragmentation of the enclosed space of society and the undoing of unifying social forms?
-
In this case, unification does not void the presence of violence, but envisions a flexibility of social codes under the contingencies of circumstance so that recodings can take place through consensual agreement, by deliberation and plebiscite. Ethical wholeness is understood as the agreement among selves alert to their equality, for the ethical self is the self that bears responsibility for its actions toward other selves, and therefore ethics is a questioning of actions and a listening to the answers of others toward resolution. This is a form of critique in which the social self is formed in the crucible of the exchange of questions and answers about how to act on and in this being with others, this being-together, which is always a mapping of the social space, the space of what could be called ethical intimacy. Ethics in this sense is a form of creative practice that takes into consideration contingency, agency, and the mutuality of deliberation.
-
I come to this thinking about ethics in light of the overall project of Kimsooja’s art, as it seems to me that her questions and propositions in the argument of her work are fundamentally presented as what I will call a gestural ethics. Her work over the years and in its various forms offers itself as a symbolic representation of an aspirational being-together. The opacity of individual selves is not so much taken into account as an idealized transparency of recognition of selves who may move through the violent complications of human nature toward a valorized sociality of tolerance. Commonality is a feature of the artist’s proposal of what being-together can mean, and to this point, we see a repeated figural gesture in her art, for whenever we see Kimsooja in a video or photograph, her back is to us, she is facing other people, other things, as if to always say, “How can I be with you if we are to be together in light of our differences from one another, in light of the possibility of agreement?” As if to insist on a dance of the reciprocity of identities, “Who am I in you and who are you in me?”[2]
-
In fact, a constant in the artist’s works is the sense of collective presence, of watching and participating in the dance of selves with selves performing that dance. In this movement of I-with-you,there is an implicit proposal of the similarities and conjunctions among disparate things in environments of work and contemplation – seen, for example, in moving-image works such as A Needle Woman and Thread Routes. These are spaces that feel hermetically concentrated, given to an almost ethnographic scrutiny, narrowed by a gaze that looks to the weighted significance of hands and figures focused by the charged intensity of enclosed space. Kimsooja’s camera may establish its point of view in open air, as we see continually in her films and videos, but there is always a sense of motions framed, cropped, pulled inward. Meditative attention is paid to the study of human movements whose results are linked at once to embodied presence, sociality, material labor, and, at the same time, to the ethereal abstraction of repetition.
-
The artist’s installations are underwritten by this sense of collective intimacy, this gestural ethics in which space presents itself as the enraptured site of an enlightened stitching of things, one to another. Light itself and the symbolic value of colors imbue this being-together. I think of her Deductive Object (2016), an ovoid welded steel form painted with stripes in the colors of the traditional Korean Obangsaek, colors representing the five cardinal directions – east, south, center, west, north – and the five elements as established in Korean culture: wood, fire, earth, metal, and water. Touch, sight, breath, weight, durability, time’s duration, the direction of the sun, what the body needs to sustain itself, where it will travel, hearth and tool… all speak to the idea of Being-in as a home in the world, the world of life, of what the Greeks called zoē, as Giorgio Agamben notes, zoē as “the simple fact of living common to all living beings,” and here also, the Greek bios, the way of living as an individual and in being together.[3] These dual flows of living, crossing one into the other as streams of unbridled and governed energies, are indicated in the coded colors and the completed geometry of this sculpture, whose title confers its reasoned status as a physical artifice deduced from a totalizing metaphysical proposition. Kimsooja undergirds this symbolism by placing her Deductive Object on a mirrored plinth in an enclosed courtyard so that it sits at a center, an omphalos of the socius that amplifies this Being-in and being-together, above it a sky that brings light from every direction.
-
Around this sculpture, which towers at nearly two-and-a-half meters like a heroic obelisk, are the museum’s windowed walls that the artist has covered with a special diffraction grating she has often used. It refracts the light into a rainbow’s spectrum. It is a pictorial device, as it turns every windowed view into a frame in which details are dissolved into vaguely abstract shapes alive with angles of color. The abstraction activates an optical demater ialization, one thing melting into another, and this too underscores a theme of unified being, returning us from matter to metaphysical belonging. Even the title of the work, To Breathe, intends to dissolve boundaries, suggesting that seeing and breathing are one with the other, a kind of synesthesia, a sensory miscegenation. This trajectory toward fluidity and fusion is a perennial current in the Kimsooja’s work: bodies together in repeated acts of attention, of moving, of making; bodies that float on mirrored surfaces, suspending materiality, that are abstracted and generalized, that are corporeal but are oftentimes inflected by a sound recording variously of the artist’s breathing, humming or gurgling that hovers in the air, which she uses recurrently to suggest the shedding of the body, of the liquefaction of inside and outside, the original version of which was titled The Weaving Factory from 2004, and the most recent, Unfolding Sphere, from 2016. It’s as if, in this art, the consecrations of repeated actions and motifs form a ritual of conjoined being – this gestural ethics in which the rendering of a ceaselessly various but continuous activity of negotiating the sociality of I-with-you is predicated on the idea of repetition as order, repetition as an emblem of the establishment of norms, of practiced ways of being-together that are open to play, to process and change.
-
So it is that the communal performance of Kimsooja’s installation titled Archive of Mind (2016), which is also the name of the exhibition here at the MMCA in Seoul, presents us with a nineteen meter elliptical wood table set out with lumps of clay to be rolled between each guest’s hands to form spheres, the table filling with them like a model of a domed city or the map of a constellation dense with newborn planets. Clay, of course, is the material from which we are made in origin myths of the world, that a Godfigure shapes, breathing into that clay of the raw human form to “inspire” it – from the Latin inspīrāre, meaning literally to fill with breath – to bring the body to life. These clay spheres, then, bear the symbolic inspiration of the hand that makes, shapes, encloses, a marking of self and selves, of recognitions, as recognition itself is a conscious acknowledgment of the other. And here this recognition is an acknowledged mutuality that is premised on the playful pleasure of the communal act, of hands directed toward similar motions with a single material, producing similar sounds as they transform this clay and momentarily themselves, transfigured by this act of the mutual (for the word “mutual” originates in the Latin mūtāre, to change). Mutuality and mutability are one with the other, just as the philosopher Jean-Luc Nancy notes of the I-with-you, of the transformation in being together:“I can only recognize myself recognized by the other to the extent that this recognition of the other alters me.”4
-
It is the transformative act of recognition of self and other, of the reciprocity of the I and you that makes way for social discourse, for dissensus and consensus in the negotiation of how we can be together. This discourse is always mobilized by circumstance, though the frame of ethics is based on a durable plinth of reason reflecting upward to present the possibility of a complementary perspective from the grounds of interdependence. In Archive of Mind, bodies address each other through the motion and task of hands, entering into the sociality of being. Through
this act of making, of the manual activity of those sitting in the ellipse of this table, watching each other, listening to each other, and listening together to the amplified recording of balls rolling and Kimsooja’s body gurgling (that audio work, Unfolding Sphere), these closed circles of unifying actions present a normative purpose that instantiates the recognizability of I-with-you, of each with the other’s being-together. -
Still, the project of Kimsooja’s work is not limited to the human self as subject, but proposes that we are things among other things, a broader ethics, an idea of agency that is animistic in its reach. All things are woven in this proposition, as in a web that catches each thing that exists as a generative machine of correlation and, with hope, affiliation that populates the Being-in. This is made manifest in the artist’s series of six 16-milimeter films entitled Thread Routes (2010 - ). Take, for example, the most recent of these, Thread Routes – Chapter V(2016), whose method, as we also see in the previous works in the series, is to show in a documentary yet poetic style a global range of landscapes and peoples and their practices of weaving. In Thread Routes– Chapter V, we see wicker baskets being made. We see various women working with handlooms, and I am reminded that the loom was the progenitor of modern computation, so that a web of woven yarn is parent to the billions of strands of data on the Internet’s World Wide Web, and that the Internet as an active form of ordering, of interwoven streams of electricity
and light, is only a microcosm of the still more universal zoē and bios, a marker in a much greater, constellated vastness. -
That is the artist’s documentary point, as the images of human actants are inter cut with close-ups held like a long breath so that our attention is steadied and concentrates on natural things – grasses, currents of water, clouds, floral patterns, even the dense strands of hair on someone’s head – that suddenly appear in their knitted forms, just as yarn and wicker do. What we are presented with in this film and the others in the series is the motif of similitude, the way one thing is a formal echo of another, and it isn’t necessary that every single thing has agency, but that we
can see in all things their common parentage in the composition of the world and discern by a leap of ontological inference an originary intelligence. This prelapsarian, ante-methodological, originary ejaculation of active materiality is presented as evidence, as I have said, of all zoē, all life in its primordial and blossoming forms, whether abject or ecstatic, by which the “thread route” is the thread of this originary intelligence through all matter, and threading is equivalent with marvel, equivalent with “something with something in something,” and equivalent, therefore, with the wovenness of Being, as if the world in the thread of all time and before time were shrunk to a miracle of emblematic presence displayed in a glass vitrine, a cosmos in a teacup, all threading as the gesture of the genomic impulse toward supreme order hung like an amulet on Being’s many-bodied and bodiless body. -
These woven likenesses in Kimsooja’s artworks suggest an expansive mise en abyme among materially different things; a mirrored reciprocity of othernesses in constant address that are therefore exemplars of a gestural ethics that invokes the obligation of one thing to another to find a normative frame in which Being-in in its aspect of being-together can give account of an agora of reparative promise. This ethical work, because of its openness, in which all things, human and nonhuman, may participate and are envisioned as participating, rests on anecdotal moments of local histories, geographies, politics, and the most localized gestures of bodies in rooms together, at the same time that it is pan-political and trans-temporal through the artist’s regular investment of symbolism in materials, colors, gestures, and forms. Ethical relativism, the moral systems of individual cultures, is simultaneously acknowledged and contravened, imagined within a supreme coefficiency of thing with thing, a breath elongated, a
light refracted and spread, in the artist’s overarching imagining of Being-in, this task of intimacy, of being-together.
[Note]
[1] Peter Sloterdijk, Bubbles: Spheres I, trans. Wieland Hoban (New York: Semiotext(e), 2011), p. 542.
[2] My thinking about ethics is touched specifically in this essay by Jürgen Habermas, Moral Consciousness and Communicative Action, trans. Christian Lenhardt and Shierry Weber Nicholsen (Cambridge, MA: MIT Press, 1990) and Judith Butler, Giving an Account of Oneself (New York: Fordham University Press, 2005).
[3] Giorgio Agamben, Homo Sacer: Sovereign Power and Bare Life, trans. Daniel Heller-Roazen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8), p. 1.
[4] Jean-Luc Nancy, quoted in Judith Butler, op.cit., p. 26.
- — Essay from Exhibition Catalogue 'Kimsooja: Archive of Mind' published by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Korea, 2017. pp.86-117.
함께-있음의 과제
스티븐 헨리 마도프 (뉴욕 스쿨 오브 비주얼 아트 교수)
2017
-
세계는 끝없는 갈등으로 인해 분열되어 있지만 눈물 한 방울 한 방울, 작디작은 갈등과 충돌 하나하나조차 모두 나름대로의 통합을 지향한다. 어떤 갈등이더라도 그것은 전체 구조에 대한 노스탤지어이자 전체를 향해 가는 길의 궤적이다. 물론 각양각색의 전체화 구조들이 존재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차이를 억압하는 구조도 있고 민주적인 질서를 지지하는 구조도 있다. 가장 광범위한 의미에서 전체화라는 개념은 마틴 하이데거(Martin Heidegger)의 용어인 ‘무엇 내에서 존재함(being-in)’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가장 간단한 정의로는 페터 슬로터다이크(Peter Sloterdijk)의 “무엇 안에 무엇과 함께하는 무엇(something with something in something)”을 들 수 있다.[1] ‘무엇 내에서 존재함’의 사회적 실례를 들자면, 우리는 각자 하나의 무엇이고 따라서 우리는 무엇과 함께 하는 사회라고 하는 무엇 안의 존재이다. 사회(society)는 공존하는 사회적 존재라는 의미의 라틴어 ‘socius’에서 유래했다. 그렇다면 사회는 곧 ‘함께-존재함’이다. 시민(civitas)은 도시(city)를 뜻하는 그리스어에서 유래한 말로서 ‘시민(citizen)’, 혹은 조직화된 공간 내에서 함께 살아가는 사회적 존재로 귀결된다. ‘폴리스(도시국가, polis)’라는 단어는 ‘경계 지어진 공간’을 뜻하는 원시 인구어(原始印歐語, the proto-IndoEuropean) ‘pele’에서 유래한 말인바, 폴리스는 곧 경계 지어진 시민들의
공간이고 이 공간에서 ‘존재한다(to be-in)’는 것은 사회적 코드들, 즉 사회적 존재 간에 유통되는 코드들의 체계에 따라 함께 산다는 것이다. 물론 인간과 동물이 살아온 시간에 대한 모든 기록들이 말해주듯, 코드들은 언제나 도식적인 동시에 무정부적인 분열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다. 따라서 다시 협의되고 수정되는 과정에 노출된다. -
‘사회(socius)’, ‘시민(civitas)’, ‘폴리스(polis)’. 김수자의 작업 세계 전체를 관통하며 흐르는 상징적 의도는 두 가지를 전제로 한다. 하나는 저널리스트적 태도로 일상적인 사건들을 역사적 시각으로 기록하는 것이다. 그 전제는 언제 어디서나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행동들에서 볼 수 있듯이 인간은 폭력적이고 파괴적이며 관용이 없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인간이 온전함을 추구하며 파괴성이라는 인간의 사악함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치유와 보살핌에 주목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김수자의 작품을 보면 이러한 상호 균형적인 인간의 행동들이 천의 안팎을 관통하는 바늘로 표현되고, 이것들이 인간 본성의 바탕을 이루는 신학적이고 철학적 믿음 체계들을 통해 구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생물권(生物圈)과 삶의 코드들, 사회성, 그리고 이신론 (理神論)적 원리들과 윤리적 장치들은 모두 ‘무엇 내에서 존재함’의 방식에 따라 차이의 공존을 지향하는 통합적 합의하에 철저히 분열되거나 서로 탄탄히 결합하는 구조를 띠고 있다.
-
아리스토텔레스 시대부터 사회 내부적으로 선한 삶이란 과연 무엇인지, 또 모두가 함께 살아갈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을 해 왔다. 이는 윤리학적인 문제이다. 하지만 이 글의 제한된 지면상 필자는 이러한 윤리학적 사유의 범위를 합의된 인식과 동의에 근거하여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찰로 제한한다. 이를 통해 사회의 전체성을 성취하기 위한 폭력의 중재를 꾀하고자 한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일련의 질문을 제기할 수 있다. ‘무엇 내에서 존재함’을 사회적 형태인 ‘함께-존재함 (being-together)’이라는 제한된 의미에서 이해할 수 있을까? 전체화를 보편주의나 절대주의의 관점이 아닌 타자성과 즉흥성, 혼란과 질서가 끊임없이 번갈아 오르내리는 지렛대의 지렛목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함께-있음’을 사회(socius)가 짊어져야 할 책임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 즉 전체성의 성취를 위해 사회 내부의 폭력을 극복할 책임, 그리고 사회라는 경계 지어진 공간의 파편화와 사회적 형태들의 해체, 다시 말해 사회 내부의 분열을 극복할 책임 말이다.
-
이 경우에 통합은 폭력의 현존을 무효화하는 것이 아니라 폭력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사회적 코드들의 유연성을 상정함으로써 신중한 판단과 투표를 통한 합의하에 재코드화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윤리적 전체성(wholeness)은 평등을 예리하게 인식하는 자아들 간의 합의로 이해할 수 있다. 왜냐하면 윤리적 자아란 다른 자아들에 대한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는 자아를 일컬으며, 이때의 윤리란 행동에 대한 물음이고 해결을 위한 타자들의 대답에 귀 기울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사회적 자아가 형성되는 하나의 비평 형식으로서 타자들과 ‘함께-있음’, 즉 윤리적 친밀성이라 부를 수 있는 사회적 공간을 어떻게 그려나갈지, 그 속에서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에 대한 치열한 문답의 장(場)을 통해 비로소 형성된다. 이러한 의미에서의 윤리는 어떠한 사태, 행위자의 능력, 의논 과정에서의 상호성을 고려 대상으로 하는 창의적 실천의 한 형태이다.
-
윤리에 대해 필자가 이러한 사유에 이르게 된 데에는 김수자의 예술이 기여한 바가 크다. 김수자가 자신의 작업을 행하는 과정에서 제기하는 문제들은 근본적으로 ‘행위의 윤리학’ 형태로 제시되고 있다. 여러 해에 걸쳐 다양한 형태로 진행된 그녀의 작업은 염원적 ‘함께-있음’에 대한 상징적 재현이라 할 것이다. 개인적 자아들의 불투명성은 고려의 대상이 되고 있지 않다. 그보다는 관용이라는 어떤 안정된 사회성에 이르는 길목에서 인간 본성의 복잡한 폭력적 단계들을 거치는 자아들에 대한 이상화된 투명한 인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함께-있음’에 대해 작가가 내린 정의의 특징은 공통된 일상성에 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김수자의 작품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인물의 행위를 감지하게 된다. 영상 또는 사진 작품에서 김수자는 항상 우리를 등진 채 다른 사람들, 다른 사물들을 마주하고 있다. 마치 “서로의 다름을 인지하고 합의의 가능성을 감안해서 우리가 함께해야 한다면 어떻게 내가 당신과 함께할 수 있는가?”
라고 말하는 것처럼. 마치 독자적 정체성들의 호혜적 춤을 고집하려는 것처럼. “당신 안의 나는 누구이며 내 안의 당신은 누구인가?”라고 묻기라도 하는 양.[2]
-실제로 작가의 작품들에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것은 자아들의 춤과 그 춤을 지켜보고 동참하는 집단적 존재감이다. ‘나-더불어-너(I-withyou)’라는이 움직임에는 작업과 사색의 여러 환경에서 이질적인 것들 사이의 유사점들과 접점들에 대한 암시가 존재한다.[3] 이는 <바늘 여인>, <실의 궤적>과 같은 영상 작품들을 통해 잘 예시되고 있다. 이 작품들에서 보이는 공간들은 긴밀하게 농축되어 있으며 민족지학(民族誌學)적인 정밀한 현미경 렌즈를 통해서만 인식할 수 있는 듯하다. 게다가 폐쇄된 공간의 밀도가 강조하는 손들과 인물들의 묵직한 의미에 주목하는 응시에 의해 공간은 좁혀지고 있다. 김수자의 영상 작품에서 지속적으로 관찰되는 것처럼 그녀는 카메라의 시점을 공중에 위치시키고 있다. 그럼에도 그녀의 작품에서 예외 없이 감지되는 것은 작품에 표현된 운동감이 어떠한 틀에 의해 제한된 듯, 잘린 듯, 그리고 안쪽으로 당겨진 듯하다는 점이다. 인간 신체의 움직임에 대한 사색적인 고찰의 흔적이 보이고, 이는 지체
없이 존재감과 사회성, 물리적 노동의 구현으로 표현되는 동시에 반복에 대한 지극히 가벼운 무게의 추상적 표현으로 연결된다.
-
작가의 설치 작품에는 이러한 집단적 친밀감이 흠뻑 스며 있다. 앞서 언급한 행위 윤리학의 접근으로 인해 공간은 사물들을 서로 연결하는 깨우침의 바느질이 만들어 내는 희열의 장으로 변모한다. 빛과 색채들의 상징성은 이 ‘함께-있음’에 가득 투사되고 있다. <연역적 오브제 Deductive Object>(2016)에서 작가는 강철을 용접한 난형(卵形)의 형태에 기본 방향(동, 남, 중앙, 서, 북)과 5가지 원소(목, 화, 토, 금, 수)를 표상하는 한국의 전통 오방색으로 색띠를 그려 넣었다. 촉감, 시각, 호흡, 무게, 견고성, 시간의 지속, 해의 방향, 신체가 지탱을 위해 필요로 하는 것들, 신체가 가는 장소, 가정 그리고 도구, 이 모든 것들이 세계 내의 집, 생명 또는 삶의 세계로서 존재와 연결되고 있다. 다시 말해 그리스인들이 ‘zoē’라고 부른 것과 그리스어 ‘bios’, 즉 개인으로서 ‘함께-있음’의 삶의 방식에 대해 말하고 있다.[4] 이러한 삶의 이중적 흐름, 걷잡을 수 없으면서도 통제된 에너지들의 흐름들이 서로를 거쳐 지나치며 작품의 코드화된 색채들과 완성된 기하학을 통해 구현되고 있다. 한편, 이 작품의 제목은 전체성의 형이상학적 명제로부터 연역된 물리적 방법론으로서 작품의 논리적 지위를 한층 강조한다. 김수자는 <연역적 오브제>를 사방이 막힌 뜰에 놓인 거울 대좌 위에 위치시키며 이러한 상징주의적 효과를 더욱 강화한다. 따라서 작품은 중앙, 즉 사회(socius)의 중심(omphalos)에 자리하게 된다. 이를 통해 존재함과 ‘함께-있음’의 강도가 한층 더 증폭되는 가운데 작품 위의 하늘은 방향을 가리지 않고 사방으로 빛을 비춘다.
-
약 2.5m 높이로 마치 거대한 오벨리스크처럼 치솟아 있는 이 조각 작품 주변은 작가가 자주 사용해 온 특수 회절격자 필름으로 뒤덮인 미술관의 유리 벽들이 에워싸고 있다. 이로 인해 빛은 무지갯빛 띠로 굴절된다. 창을 통한 모든 전경은 하나의 틀이 되고, 이 틀로 인해 세부 요소들은 색채의 각도에 의해 살아 움직이는 어렴풋한 추상적 형태들로 녹아든다. 이러한 점에서 조각 작품을 둘러싸고 있는 유리 벽은 하나의 회화적 장치라 할 수 있다. 이 추상화의 과정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시각적 비물질화를 유도하고, 통합된 존재라는 주제를 더욱 부각하면서 우리를 물질에서 형이상학적 관계로 되돌려 보낸다. 이 작품의 제목인 ‘호흡’조차 경계들을 흐리려는 의도에 일조하면서 보는 것과 호흡하는 것이 서로 함께함, 병치되는 일종의 공감각적 작용 또는 감각적 혼혈 생식을 암시한다. 유동성과 융합을 향한 이러한 궤도는 김수자의 작업에서 일종의 다년생 식물의 생명 주기처럼 계속 반복되는 요소이다. 집중하고 움직이며 무언가
만들기를 반복하는 신체들은 물질성을 유예한다. 이러한 신체들은 거울 표면 위에서 부유하며 추상화되고 일반화된 형체를 가졌으나 대개의 경우에는 종종 녹음된 작가의 호흡, 콧노래, 또는 가글 소리로 부풀어 공기 중에 떠돌게 된다. 이러한 소리는 작가가 신체의 발산, 즉 안팎의 용해를 암시하기 위해 되풀이하는 방법론적 요소인데, <직물공장 The Weaving Factory>(2004)에서 처음 사용되었고 이번 <구의 궤적>에서도 이러한 방법론을 사용하고 있다. 여기서 반복되는 행위들과 모티브들의 봉헌은 마치 하나의 결합된 존재를 위한 제의(祭儀)인 듯하다. 이 또한 ‘나-더불어-너’라는 사회성을 성사하는, 쉴 새 없이 변화하면서도 지속적으로 활동함을 표현하는 것은 질서로서의 반복, 규범의 확립, 언제든지 변화될 수 있는 ‘함께-있음’의 숙련된 방식들의 확립에 대한 상징으로서, 반복이라는 개념에 근거를 두고 있는 행위의 윤리학임을 여실히 증명해준다. -
김수자의 설치 작품이자 전시의 제목이기도 한 <마음의 기하학>의 집단 공동체적 퍼포먼스는 관람자가 19m에 달하는 타원형 나무 탁자 위에 놓인 찰흙 덩어리들을 손으로 굴려 구 형태를 만드는 것으로 완성된다. 구로 가득한 탁자는 돔으로 덮인 도시의 모형, 또는 신생 행성들이 군집한 별자리 지도의 형태를 띠기도 한다. 찰흙은 천지창조 신화에서 인간을 만드는 데 쓰인 재료이다. 신화에서는 신의 형상을 본떠 만든,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인간 형태의 찰흙에 숨을 불어넣음으로써 영감을 ‘불어넣어(inspire)’ 생명을 부여한다.[5] 인식 자체가 타자에 대한 의식적인 인정(認定)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이 찰흙 구들은 만들고 형태를 부여하고 다듬는 손에 의한 상징적 영감(靈感)의 구현이며, 자아와 자아들, 그리고 존재 인식의 표식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은 인정된 상호 관계로 해석되며, 이 상호 관계는 집단 공동체적 행위의, 단일 재료로 여러 동작들을 반복하는 손의 유희적 즐거움을 전제로 하고 있다. 동시에 찰흙을 변
형시키는 행위 도중에는 유사한 소리들이 발생하기도 한다. 찰흙을 변형시키는 와중에 사람들은 순간적으로 자신들을 변화시키기도 하는데, 이러한 상호적(mutual) 행위에 의해 변모되는 것이다. 이때 상호 관계(mutuality)와 변형성(mutability)은 같은 것이 된다. 즉, 이것은 철학자 장-뤽 낭시(Jean-Luc Nancy)가 ‘나-더불어-너’에 대해 ‘함께-있음’에 있어서의 변형에 대해 “내가 타자에 의해 인식된 나 자신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는 타자의 나에 대한 인식이 나를 변화시키는 정도와 비례한다”라고 말한 것과 같다.[6] -
우리가 어떻게 함께 있을 수 있느냐에 대한 사회적 담론의 길을 터주는 것은 다름 아닌 ‘자아와 타자’에 대한 인식, ‘나와 너’의 호혜성에 대한 인식이라는 변형적 행위이다. 여기서 이 담론은 항상 정황에 의해 활성화된다. 다만 윤리의 틀은 이성이라는 견고한 토대 위에서 상호 의존의 장에서 비롯되는 상호 보완적 관점의 가능성을 반영하지만 말이다. <마음의 기하학>에서 신체들은 손의 동작과 작업을 통해 서로에게 말을 걸며 존재의 사회성에 진입한다. 만드는 행위를 통해 탁자의 타원 주위로 앉아 서로를 바라보고 서로에게 귀 기울이게 된다. 동시에 <구의 궤적>에서 공이 굴러가는 소리와 가글 행위의 신체적 소음에 귀 기울이는 상호 활동을 통해 사람들은 통일된 행위들로 인해 닫힌 구조의 원을 그리며 ‘나-더불어-너’에 대해 인식하는 하나의 규범을 보여주게 된다.
-
그러나 김수자의 작업은 주체로서의 인간 자아에 그 프로젝트를 국한하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는 인간이 다른 사물 속에 있는 사물임을 인식하며, 하나의 보다 광범위한 윤리에 있어 물활론(物活論)적인 행위자의 능력이라는 개념을 제안한다. 이 제안에는 모든 것들이 서로 얽혀 있다. 상관 관계와 ‘무엇 내에서 존재함’으로 이주를 유도하며, 소속성을 생성하는 기계로 존재하는 것은 무엇이든 포착하는 그물같이 말이다. 이는 ‘실의 궤적’이라는 제목을 가진 여섯 개의 16mm 영상 작품들에서 분명하게 보인다. 이 중에서 가장 최근의 작품인 <실의 궤적V>(2016)을 예로 살펴보면, 이전 작품들처럼 시적인 요소가 가미된 다큐멘터리 형식을 통해 전 세계의 전경들과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직조 작업을 보여준다. <실의 궤적 V>에서 우리는 바구니가 만들어지는 과정, 그리고 수직기 (手織機)로 작업하는 여인들을 볼 수 있다. 여기서 필자는 베틀이 현대컴퓨터의 원형이었다는 생각을 해본다. 그렇다면 직조된 방적사의 망은 인터넷상의 수억 가닥 데이터의 어버이인 셈이다. 또한 배치, 배열의 적극적 형식으로서, 복잡하게 얽힌 전기와 빛의 흐름의 형식으로서 인터넷은 훨씬 더 보편적인 ‘zoē’와 ‘bios’의 소우주, 다시 말해 훨씬 더 엄청난 성좌가 형성된 광대함의 작은 표식에 지나지 않는다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작가의 다큐멘터리적 특징이다. 확대된 이미지에 행위자들의 영상들이
심호흡하듯 삽입되어 있어 우리의 주의력은 안정적으로 균형을 잡고 방직사나 바구니처럼 편직된 형태로 갑자기 등장하는 풀, 물의 흐름, 구름, 꽃무늬, 심지어는 누군가의 숱 많은 머리와 같은 자연적인 것들에 집중하게 된다. 이 영상이나 앞서 말한 시리즈의 다른 작품들에서 우리에게 제시된 것은 다름 아닌 ‘유사함’이라는 소재이다. 즉 하나가 다른 하나의 형식상 메아리로 기능하는 방식을 보여주고자 한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물이 그 원초적 원인을 반드시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아니다. 단지 우리는 모든 사물에서 체계상 그들의 공통된 혈통을 발견할 수 있으며 존재론적
추론을 통해 근원적 정보를 포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듯 적극적 물질성을 선사시대의 전(前) 방법론적이고 근원적인 방식으로 표출한다는 점은 어떤 대상을 절망이나 무아지경으로 몰아가는 것과는 상관없이 ‘zoē’, 모든 생명이 원초적이고 개화(開花)적인 형식으로 함께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로 인해 ‘실의 궤적’은 모든 물질을 관통하는 근원적 ‘정보의 실’이 된다. 그리고 실 꿰기는 경이(驚異)와 등가(等價)이고 ‘무엇이 무엇과 함께 무엇 내에 있음’과 같으므로 존재의 직조성(woven-ness)과도 등가이다. 마치 모든 시간과 시간 이전의 실의 세계가 유리 진열장 안에 전시된 상징적 존재로서 경이로운 사물로 오그라들 듯 집약되는 것과 같다. 다시 말해 ‘실 꿰기’는 찻잔 안의 우주처럼 존재의 다(多) 신체적, 그리고 무(無) 신체적 신체에 부적처럼 걸려 있는 지상명령(至上命令)을 향한 게놈(genome)적 충동의 몸짓이다. -
김수자의 작품에서 드러나는 이 직조된 유사성은 물질적으로 상이한 것들 간에 존재하는 포괄적인 미장아빔(mise en abyme)을 넌지시 암시한다. 한편, 끊임없이 언급되는 행위 윤리학의 모범적 전형이기도 한 다름들의 거울적 호혜성과 행위 윤리학의 하나가 다른 하나에 대한 규범적인 틀을 찾아낼 의무를 작동하면, 이 틀 내에서 ‘무엇 내에 존재함’은 그 ‘함께-있음’의 요소로 치유 가능한 아고라(agora)를 설명할 수 있다. 그 개방적 특성으로 인해 인간적 개체든 비인간적 개체든 상관없이 모든 것들이 공존할 수 있다. 참여하는 것으로 상상되는 이 윤리적 작품은 지역 역사의 일화적 순간들, 지리, 정치, 그리고 신체들의 가장 국지적인 몸짓들에 기초하는 동시에 범정치적이고 초시간적이기도 한데, 이는 작가가 재료, 색, 몸짓, 형식에 규칙적으로 상징성을 부여하는 데에서 기인한다. 윤리적 상대주의, 즉 개별 문화들의 도덕적 체계들이 동시에 인정되기도 하고 위배되기도 한다. 또한 사물과 더불어 있는 사물의 최대 계수(係數) 내에서 상상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작품의 호흡은 길어지며 빛은 굴절되고 확산된다. ‘무엇 내에서 존재함’에 대한 작가의 폭넓은 상상의 장에서 이 친밀함의 작업, ‘함께-있음’의 작업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Note]
[1] Peter Sloterdijk, Bubbles: Spheres I, trans. Wieland Hoban (New York: Semiotext(e), 2011), p. 542.
[2] 이 글에서 다뤄지고 있는 윤리에 대한 나의 사유는 특히 위르겐 하버마스(Jürgen Harbermas)의 영향을 받았다. Jürgen Habermas, Moral Consciousness and Communicative Action, trans. Christian Lenhardt and Shierry Weber Nicholsen (Cambridge, MA: MIT Press, 1990)과 Judith Butler, Giving an Account of Oneself (New York: Fordham University Press, 2005).
[3] 이 글에서 언급되는 ‘나-더불어-너(I-with-you)’라는 개념은 필자의 표현이다.
[4] 조르조 아감벤(Giorgio Agamben)은 ‘zo
ē’를 “모든 살아있는 존재에 공통으로 적
용되는 살아있다는 혹은 살아간다는 단순한 사실”로 정의한다. Giorgio Agamben,
Homo Sacer: Sovereign Power and Bare Life, trans. Daniel Heller-Roazen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8), p. 1.
[5] 라틴어 ‘inspīrāre’는 문자 그대로 ‘숨으로 채운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
[6] Judith Butler, 앞의 책, p. 26에서 재인용.
- — Essay from Exhibition Catalogue 'Kimsooja: Archive of Mind' published by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Korea, 2017. pp.86-117.
 Archive of Mind, 2016, participatory site specific installation consisting of clay balls, 19 m elliptical wooden table, and sound performance Unfolding Sphere, 2016. Installation view at Kimsooja - Archive of Mind at MMCA, Seoul. Courtesy of MMCA and Hyundai Motor Co. and Kimsooja Studio. Photo by Aaron Wax.
Archive of Mind, 2016, participatory site specific installation consisting of clay balls, 19 m elliptical wooden table, and sound performance Unfolding Sphere, 2016. Installation view at Kimsooja - Archive of Mind at MMCA, Seoul. Courtesy of MMCA and Hyundai Motor Co. and Kimsooja Studio. Photo by Aaron Wax.
Create A New Light
A Conversation between Kimsooja and Hou Hanru
2017
-
Hou Hanru
Let's start with travel. Today, we are constantly traveling: last week we were in New York and now you're in Berlin and I'm in Rome. Traveling has become a norm of contemporary life, both in the everyday and in the artistic... -
Kimsooja
Yes, traveling has become increasingly common in this era. In a way, we are living and working on the move. -
Hou Hanru
So this is really a state of being. Traveling is also a very important aspect in your work. From the beginning, you reflected on the question of identity from a female perspective, using traditional Korean textiles with your Bottari works. This question is also addressed from another perspective, that of an artist who is constantly traveling and moving. You look at the world through the lens of a nomad. Traveling has become a common motivation for people to reflect on the subject of identity. -
Kimsooja
Yes, definitely. -
Hou Hanru
On the other hand, travel has become a way of life, don't you think? -
K : Traveling has always been a part of my life. From a young age, I lived in various cities and villages, moving every couple of years within South Korea, including the Demilitarized Zone where my father served. Sorok Island, where my husband and I lived during his military service as a psychiatrist, was especially isolated from the public because it was used as a national hospital for leprosy patients. As a member of a nomadic family, traveling became my reality. My visual experience and perspective on nature and humanity have developed significantly from these transitory places and moments. One important experience was in 1978 when Hongik University, which I attended, started an exchange program with Osaka University; it was an eye opening experience about Korea and Korean cultural identity. Although Japan is only a short distance away, the trip altered my perception of Asian cultures and their differences. This began my investigation of my culture, such as the structural elements of architecture, furniture, language, nature, and sense of colors. I rediscovered that the aesthetics, the sensibilities of colors and forms, are very different in Korea and Japan. This period coincided with my investigation of the horizontal and vertical structures in nature, canvas, and all types of cruciform visual elements. This was the subject of my thesis, focusing on the cross in ancient and contemporary art. In 1984, I received a scholarship to the …cole nationale sup Èrieure des Beaux-Arts, Paris, to study printmaking for six months. It was my first exposure to European art and ancient culture; as a result, I started to inquire what is new in art and culture after European art history, and became interested in learning about American culture.
-
Hou Hanru
This led to a new direction in your life and work. Also, your traveling changed from national to international, from local to global. In the meantime, the image of bottari was introduced to represent this tension, between trying to be at home and travelling across the world. . . . -
Kimsooja
I didn't realize that my family had been wrapping and unwrapping bottaris all the time until I worked on Cities on the Move ─ 2,727 km Bottari Truck (1997), a performance and video project for the Cities on the Move exhibition, which you and Hans Ulrich Obrist curated in 1997. It marked a turning point in my work from local to global travel. I hadn't considered that I was dealing with global travel, as the journey was deeply personal. It was a record of my family's roots, but many people thought the project was dealing with globalism. Maybe that's true, in the sense that the performance can represent migration. Cities on the Move traveled to so many cities; the title served as its destiny and global exchange in the arts had been launched. -
Hou Hanru
Can you talk about your move to New York? -
Kimsooja
I consider my move to New York as a cultural exile from Korean society. It was the moment when I made more critical performances: the series A Needle Woman (1999-2001), A Homeless Woman (2000-2001), and A Beggar Woman (2000-2001). I made them right after I moved to New York during a transitional period I felt like I was stepping off a cliff, with one foot already in the air. This risky move made me reflect on my surroundings and the human condition more critically. I started living in Berlin recently, although I am not sure if it will be for the long term. It's interesting because it brings me back to when I established myself in New York in the late 1990s. That was a very difficult moment for me, every single step of the way, adjusting to a new society. Currently I am located in the Moabit area, which is a multicultural neighborhood. I like it, but I feel alienated. As an artist, I cherish this ambiguous state; distance and alienation bring me to a more objective and critical perception. I want to keep that critical distance all the time and New York provides that. Each time I arrive back in New York, I find a new definition, or have a specific feeling about New York, one that I haven't had before. When I feel that I'm losing perspective, I relocate myself, but I cannot deny that I somewhat respect the familiarity and rhythms of mundane life. -
Hou Hanru
You have spoken of being a Korean woman growing up in a family influenced by Confucianism. Obviously, you were aware of very important social and political changes in Korea in the 1980s and 1990s. Maybe growing up in a military family allowed you to experience this change in a way that other people would not? How much has this background influenced your way of thinking and art making? Was there was a moment of emancipation from this background? -
Kimsooja
Both of my parents were from Catholic families and very open-minded; however, as my father was the only son, he had to follow the traditional Confucian ways, which were deeply rooted in Korean society. -
As a military family, we lived in temporary and sometimes dangerous places, like refugees, migrating from one place to another. During my elementary school years, I lived near the Demilitarized Zone, in and around Cheorwon and Daegwang-ri, the second to last stop on the Kyung-Eui train line, which used to run all the way to North Korea. We often heard stories about North Korean spies who snuck into South Korea, and there were casualties every now and then. We didn't live far from a mined area; kids played with the spent bullets and would get injured by the landmines. I am of the generation, born a few years after the Korean War, who really experienced the conditions of the war and the conflict that it brought to our daily lives. Iive always been aware of the Other, because of my daily experience with the border. My thoughts on borders and those living on the other side made me question the relationship between myself and the Other. The idea of a border and questioning it had to do with being a painter reacting to the canvas as another border. I tried to overcome this border, or limit, in front of me, and connect with the Other. This was also part of the psychology in my sewing practice. The act of wrapping, with bottaris, is a way of three-dimensional sewing; it is unifying in that sense. Borders have always been part of an underlying psychology and challenge in my work.
-
Hou Hanru
In the 1980s Korea transitioned from a military dictatorship to a democracy. You began exhibiting your work during this period, can you describe your early exhibition experiences? -
Kimsooja
I started showing in 1978 when I was in my third year at Hongik University; it was a two-person show at the Growrich Gallery in Seoul. I hung a series of transparent films on a laundry line; they were silkscreened with images of a traditional Korean doorframe taken in a forest, one showed me holding it from behind and one was without me. I also installed two pieces of wood, inserting Plexiglas between them, with the wood blocks slightly tilted and following the curves of the wood. The other artist was my classmate Lee Yoon-Dong, who experimented by dripping black coal tar pigment on canvas; the work questioned gravity and materiality and its rhythm. I showed a few times in Japan and Taiwan in the mid- to late-1980s and in the US after the early 1990s, but it was not until the mid-1990s that I started to exhibit more globally. Some shows included Division of Labor: Women'ss Work in Contemporary Art at the Bronx Museum of the Arts, which traveled to the Museum of Contemporary Art, Los Angeles (1995), the First Gwangju Biennale (1995), and Manifesta 1 at the Museum Boijmans Van Beuningen, Rotterdam (1996). -
Hou Hanru
Globalism has expanded and affected much of our thinking about our way of making art, and our way of living. It seems almost inevitable to work globally, especially as I work a lot with site-specific performances, installations, and videos. Many female artists were extremely active and audacious in their work often performances during this transitional period in the 1990s. Lee Bul is another well-known female artist. How did you feel about this? And why did you decide to leave Korea in 1999, right after participating in the Twenty-fourth S„o Paulo Biennial (1998)? -
Kimsooja
In the 1990s, female artists, including myself, were engaged in performances using their bodies. I think that had to do with womenís social status in Korea at that time. Many female artists were associated with feminism. But performance art was already popular in the 1970s and 1980s in Korea, under the rubric of Happenings or Events, mostly by the Avant-Garde group, or the S. T group, which was entirely male, except one female artist, Chung Kang-Ja. During the mid-1990s, women did not have the equality they have now much of our daily lives was governed by a patriarchal Confucian value system.
After my residency at P.S. 1, Long Island City, NY (1992ñ93), my first solo show was at Seomi Gallery in Seoul; I showed three of my first performance videos Sewing into Walking ─ Kyungju, Yang Dong Village, and Mai Mountain (1994), and a Bottari installation. Used clothes were also installed on the gallery floor together with rows of TV monitors with Bottaris as a ìmedia Bottari,î and surveillance camera footage of re-wrapping the space of the wrapped Bottaris. These works could have been easily associated with feminism, but I refused the feminist label, owing to the formal and conceptual elements of my Bottaris, and my approach to universality. As a female artist, it was not easy to survive in this hierarchical and patriarchal society, or even in the global art world, until now. I noticed Korean social and cultural issues more clearly after my return from the P.S 1 residency. At the same time, economic development changed Korean society, which was quickly shaken by the financial crisis starting in 1997. I was chosen to represent Korea for the Twenty-fourth S„o Paulo Biennial, but I couldn't get any state support, only from a couple of individuals and a commission from ARCO. Korea wasn't able to ship my Cities on the Move ─ 11,633 Miles Bottari Truck (1998) from Korea to S„o Paulo. I felt hopeless and disappointed by my country, and I had to accept personal support from Korean-Brazilian immigrants who had heard about my situation. This situation confirmed my decision to find support elsewhere, so I moved to New York. -
I established myself as an artist without much support from my home country until recently. After the late 1990s financial crisis, the slowly growing Korean art market and Korean journalism often misled audiences by promoting marketable and status-oriented artists. My career trajectory is totally different from that of older and younger generations, who constantly receive support from the state and their galleries.
-
Hou Hanru
Around that period, several important art movements were created by students to oppose the power of the establishment. -
Kimsooja
Minjung Art was one and there were many modernist and postmodernist group activities that were against the established movements, such as Nanjido and Metavox from the mid-1980s. The newer groups were organized by artists from Hongik University, where I studied. Other groups Museum, TARA, Logos and Path were also around. I kept myself completely independent, although I was friends with some of the members. -
Hou Hanru
Minjung Art and artists from your generation represented a tendency toward conceptual and experimental forms of creation, especially performance and installation. What was your role? -
Kimsooja
Prior to my generation, there were experimental modernist group movements, such as the Avant-Garde and S. T. groups, which coexisted with the Dansaekhwa artists. I didnít follow Dansaekhwa art theory or practice, although the theories were predominant at Hongik University. Also, there was a big age gap between my generation and the Dansaekhwa members.
When I was at Hongik University attending undergraduate and graduate school (1976-1980 and 1982-84), the Minjung Art movement was slowly happening and I knew a few of the leading members. We would meet casually in a study group, as I was intellectually interested for some time, but when they wanted me to join, I couldn't because I always had a certain resentment about focusing only on political issues and such dogmatism. I couldn't connect with the aggression of some of the political art. At that time I was making art that was abstract, performative, conceptual, and spiritual. -
I had zero interest in any group or collective activities. I always kept myself independent by questioning the monopoly of the Dansaekhwa group, to which most of my professors belonged. I voiced my opinions in classes to open up the dialogue, offering my fellow students different possibilities and perspectives. I kept myself completely isolated, to be independent from political and artistic hierarchies, to preserve my own integrity. It has been a long and lonely path. To address further your question about my role in performance and installation in a Korean art context: the large scale of my site-specific installations and global performance projects in the 1990s and early 2000s might have influenced a younger generation in Korea, as I see many are expanding their practices. live noticed that some of my interests the notion of the needle, thread, wrapping, and unfolding have achieved wider currency in current contemporary art, particularly in art concerned with the body, textiles, and everyday life.
-
Hou Hanru
People often identify you as a leading figure, together with a few younger artists such as Lee Bul or Choi Jeong-Hwa. They express similar positions, confronting the status quo, social and political situations. Lee Bul's work is a kind of counter-violence against oppression, while your work is much more related to meditation and transcendence. You use intimate materials such as textiles and bottaris. How did you arrive at this language? -
Kimsooja
I cannot associate with any type of violence or raw expression. In that sense, Iive been working closely with non-violence and that is my position to the individual and society. I couldn't and didn't engage directly with political issues. The artistic language that I created has always stemmed from a healing perspective, maybe because of my compassion for humanity and my vulnerability to violence. -
This vulnerability might be rooted in my childhood experience of living near the Korean border, among others. I felt innately vulnerable. I cannot watch scenes of violence and my inclination has always been to embrace and connect with those around me. However, it is true that I gain strength through resistance and patience. Maybe this mindset originated when I discovered sewing and needlework as a methodology for healing despite the violent potential of a needle. Searching for my own medium, I focused on vertical, horizontal, and cruciform structures in the world. In 1983, when I was making a bedcover with my mother, I was about to push the needle into the brilliant, soft, and silky fabric but when the needle touched the fabric, I experienced a revelation, as if the whole universe's energy passed through my body to the tip of the needle. I immediately recognized the relation with this border, the surface, and the vertical and horizontal woven structure that was penetrated by the needle. The fabric had a woven vertical and horizontal pattern (warp and weft) and I saw this as a way to investigate the surface of a structure as a painting. This action and experience was the moment that I interwove myself as a person who is innately vulnerable, seeking to connect with and embrace those around me.
-
At the same time this experience coincided with my artistic struggle to redefine the structure of the surface of a canvas. I'd been trying to find an original painting methodology for a number of years, since beginning college. That was the moment I discovered sewing as a methodology for painting, using the fabric of life as a canvas and the needle as a brush. The concept of needle and sewing evolved naturally into social, cultural, and political dimensions and has expanded with a broader context into my current practice.
-
Hou Hanru
For many years, you have developed this process of wrapping and unwrapping bedcovers, carrying them on your travels, and showing them as installations. They are more than luggage, more like real companions. They have become your partner as you travel. It's like having a life that you can carry around with you in your global displacements. During the last few years you extended this interest, engaging with textiles from other cultures and places. For example, you went to Peru to work with the local women and filmed the weaving culture, called Thread Routes ─ Chapter I (2010). -
Kimsooja
Yes, Thread Routes continued with Chapter II (2011) filming lace making in European countries, block printing, embroideries and weavings in India (Chapter III, 2012), embroideries in China (Chapter IV, 2014), and basket weavings in Native American communities (Chapter V, 2016). I am also planning to film weaving in African cultures (Chapter VI). -
Hou Hanru
That gives your vision broader cultural dimensions. -
Kimsooja
I consider the Thread Routes films as a retrospective of my formal practices related to thread and needle, with the textile as a canvas and a structural investigation. It was conceived in 2002 in Bruges, when I first saw a bobbin lace maker on a street. It immediately inspired me to juxtapose it with the local architectural structures, as a sort of masculine lacemaking, but it took a long time to start the actual film. I finally started, using 16 mm film, with textiles in Peruvian culture. It's a non-narrative documentary film, using only visual juxtapositions with minimal environmental sound. I wanted to approach this project as anthropological poetry, capturing the long, silent journey of textile cultures around the world, revealing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different production methods. Through the camera's lens, I wanted to reveal each culture's craftsmanship as a living form in textile, in architecture, and in nature. -
I didn't use Korean secondhand bedcovers because I was interested in orientalism or local aesthetics, but because they were part of my daily life in Korean society. It's the same reason that Europeans or Americans use their local materials, so there is nothing exotic about them, although Westerners might view them that way. The material I chose for the Bottari works was not originally wrapping cloth. Initially, I chose a bedcover for wrapping as the bed is the place for our bodies to rest, as a frame of life where we are born, love, dream, suffer, and die. This symbolic site carries all of our dreams, love, agony, pain, and despair throughout our lives. The colors are striking and have extreme contrasts, but I didn't choose the colors for aesthetic reasons, they just came with the fabric as cultural symbols, symbols of the daily life that I lived. I accepted what was created and what was handed down from our parents upon marriage. The wrapping and unwrapping is another language I discovered when looking at an existing bottari bundle in 1993. Bottaris are common universal objects, existing in all cultures, but the bottaris I discovered at my P.S. 1 studio appeared to me in a completely different context: a totally different object that was a painting in the form of a wrapped canvas, a ready-used object, a sculpture, and a performed object that unifies the form as a totality.
-
Hou Hanru
One of your recent projects, An Album: Sewing into Borderlines (2013), is on the American-Mexican border, initiated a few years ago under the federal General Services Administration Art in Architecture Program. In the beginning, you wanted to work with people who had been deported from the US, but since the GSA could not accommodate that project, you shifted to working with migrants who cross the US-Mexican border every day to work. -
Kimsooja
In the end, I focused more on the positive, welcoming aspects of migration for the different generations of Mexican immigrants traveling to the US. It was during the Obama administration, when artists were supported during the economic crisis more about hospitality than despair. -
Hou Hanru
But now the policy of the new government forces you to raise new questions about the issue. The political structure under Trump is a different situation. How will this change influence your project? You have been interested in female migrants, who have a very different life and experience with migration than men do. -
Kimsooja
Women are central to the migration chain; they are the major nexus, connecting everyone in the family. Women travel on more visible routes like trains, cars, and buses, which makes them more vulnerable to arrest. Generally one-third of women are deported. Men use riskier methods, on foot through the desert or by boat. There are even tunnels dug under the border. Female migration is more transitional. Women work for others, generally in homes or little stores during their migrations. They stay in one place for a short time, earn some money, and then move on. -
Hou Hanru
You developed this project along the US-Mexican border, where migrants are both caught and detained. -
Kimsooja
The GSA project, which is a permanent installation at the land port of entry in Mariposa, Arizona, was installed right on the border. I installed large LED screens with portraits of the immigrants who cross the border, commuting to work every day. I filmed each portrait from the front and back, showing each person's psychological journey in a durational gaze. I would call their names and they would turn to the camera, creating a psychological border between themselves and the Other first the camera and then the public. I focused on the juxtaposition of their psychological borders with the political border where the work is installed. -
I learned a lot about the border situation between Mexico and the US. Lately, the social, political, and cultural geography has shifted because of Trump's immigration policies, especially with Mexico. This new view on immigration is the most urgent and critical issue to address right now.
-
I began to research the new reality Mexican immigrants are facing since last year. There are interesting organizations that support women's migration, including El Instituto para la Mujeres en la Migracion (Institute for Women in Migration). Interestingly, the organization is supported mainly by American non-profit organizations. I researched the conditions of women migrating in South America, especially in Mexico. There's a constant migration through Mexico. The organizations support detained family members, women, or children, by providing shelter, educational programs, and further support. Families get separated, sometimes women are detained and sent back to Mexico, but if their kids were born in the US, then the children enter the care of these organizations. The children are then moved to a shelter where their mothers cannot see them. Once in the shelters, American families can adopt the children and change their names. Basically the mothers no longer have any rights to their children after they are adopted. So, there are efforts to reunite these families. It is not only a migration issue; it's also a whole family-related issue.
-
The importance of the women's role in a family experiencing migration made me think of dealing with women as central figures. For this new Mexican immigration project, yet untitled, I want to have female performers wearing national flags. The location will be a former route from where the Spanish conquered Mexico. I'll film the performance between two volcanoes in the Valley of Mexico, one of which, IztaccÌhuatl, is also know as the Mujer Dormida or the Sleeping Woman. There is a myth surrounding these two volcanoes (the other one is PopocatÈpetl): they symbolize grief and the eternal love between a man and a woman.
-
Hou Hanru
Obviously, this covers issues far beyond the specific question of immigrant families. It should be extended to explore the question of all relationships, the human family. For your new exhibition in Seoul, Kimsooja: Archive of Mind,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MMCA), Seoul, you installed a huge oval table covered with clay balls that are made by the audience. Can you explain this project and its participatory aspect? -
Kimsooja
I've been interested in clay and ceramics for a long time. My interest is more in the void that the vessels create, rather than the vessel itself. I was invited to participate in Water Event for Yoko Ono's solo show, LumiËre de líAube, at the MusÈe díart contemporain, Lyon, 2016; the Biennale de Lyon invited artists to create water containers. At the time, I was thinking about the clay ball as a Bottari, but also as the Earth, as a container. So rather than creating a void to contain water, I decided to make a clay ball as a pre-existing water container and address environmental issues. I sent a small clay ball that was still drying. Since then, I have been contemplating the formation of clay balls, how its creation has a psychological and meditative effect on the maker. When you make a clay ball you have to push your fingers and palms toward the center. A sphere is made by pushing from every point on the surface. It's not easy to make a perfect sphere because you need to smooth every angle. The action of pushing opposing sides toward the center is similar to producing gravity within the sphere. To make the smoothest sphere, you roll the clay ball between your palms. It's like a wrapping action, similar to making Bottari. This repetitive rolling action creates a spherical shape in your mind. I was working with my assistants with this clay and we reacted to it instinctively, enthusiastically touching it, rolling it. I found this instant reaction and concentration very interesting. It made me think that this project is not only for me to experience, but might even be more important for the viewers as participants. I decided to make an enormous communal table, bringing everyone together, sharing this experience at this elliptical wooden table, 62 feet (19 m) long. Each person has his or her space and time, but the work also creates a communal space, a communal society, working together toward a certain state of mind, creating a kind of cosmic landscape, a mind-galaxy. -
Hou Hanru
Like a field? -
Kimsooja
Yes. I made the large table out of 68 smaller tables, which are made from irregular shapes to construct the elliptical geometric shapes. I also installed a sound piece, Unfolding Spheres (2016), with thirty-two speakers under the table, and a 16-channel soundtrack. One part is the sounds of the dried clay balls rolling, crushing, and touching, recorded with 4 or 5 different microphones. Because sound is only made when the ball touches an angled corner, it reveals the geometry of the clay ball. At the same time, it creates a cosmic sound: when the balls bang loudly, it produces a sound like a thunderstorm. I also made an audio performance, gargling with water in my throat, like a grrr sound. Sometimes it sounds like a stream, then it reveals more of the verticality of the rolling spheres, pushing air against gravity. It has a vertical force or movement, while the sound of the clay balls rolling reveals a horizontal axis. Iive engaged in this vertical-horizontal structural relationship since the late 1970s. I also showed Structure ─ A Study on Body (1981); for this series of prints, I moved my arms at 90? to create geometric shapes, such as a triangle, circle, octagon, or square, to connect my body to the earth and the sky. I also included different colors to create different geometric shapes between my body and to determine the space around it. These prints directly connect to my sewn works, which have vertical-horizontal structures. -
Hou Hanru
You mentioned a cosmic sensation, the connection between the body and the world. I think one interesting aspect of this work is the relation between the body and architecture, highlighted through your use of light. For example, with your installations, Respirar ñ Una Mujer Espejo / To Breathe ñ A Mirror Woman, at the Palacio de Cristal, Madrid (2006), To Breathe: Bottari for the Korean Pavilion at the Venice Biennale (2013), and now To Breathe (2016) in the exhibition at the MMCA, you have created beautiful environments with diffraction grating film applied to the windows. The light enters and creates a rainbow spectrum; it transforms the interior, giving it a cosmic feeling. On the other hand, in the Korean Pavilion there was an additional room, which was completely dark and silent. This is a fascinating contrast between the two aspects of cosmic existence. It seems to be a new dimension of your work developed in the last few years. -
Kimsooja
In the MMCA courtyard I used the same film as in the Palacio Cristal and the Korean Pavilion. In a way, the painting or pigment was transmitted into light. This particular film has thousands of vertical and horizontal lines in every inch. It has a woven structure and functions like a prism, creating iridescent light when light passes through it. This is one of my investigations into the structure of painting, of canvas, and of color and pigment in relation to light. I created a completely dark and silent space, an anechoic room, to define the nature of light and sound. It was the opposite state of visualization, operating in connection with my questions of duality in both life and art. My questioning of duality the vertical and horizontal structure of the canvas relates to the psychological structures, the mandalas in our mind. -
My Master's thesis was on the symbol of cross, from antiquity up to contemporary painting and sculpture. This cross and the horizontal-vertical structure are always present in art. Iím curious how it constantly reappears despite contemporary art's desire for creativity and innovation. Many artists reach this point, confronting this very basic structure: Piet Mondrian, Kazimir Malevich, Joseph Beuys, Antoni T‡pies, Lucio Fontana, Frank Stella, and many more. Iive always questioned the inner structures of our world and our psychology. In my thesis I identified a relationship with psychological geometry of the Mandala, which utilizes cross structures and Carl Jung's archetypal phenomena theory. This isn't unrelated to my question of duality in art and life.
-
When I was planning the Korean Pavilion, I experienced Hurricane Sandy in New York. I was living in complete darkness without any electricity for more than a week. I questioned the fear I had while walking in the dark in my building and on the streets, especially when someone is walking toward you. I realized that the fear occurs in our mind because of the unknown ignorance of the Other. The unknown and the ignorance in the human mind were the questions I had at that time. Eventually, the relationship between light and darkness, sound and silence forming an architecture of bottari was what I created in the Korean Pavilion.
-
Hou Hanru
This can be a perfect conclusion. Now we all live in a kind of darkness, and we need to find a way out, to create new light. -
Kimsooja
Precisely.
— Essay from Exhibition Catalogue 'Kimsooja: Archive of Mind' published by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Korea, 2017. pp.18-85.
 Archive of Mind, 2016, participatory site specific installation consisting of clay balls, 19 m elliptical wooden table, and sound performance Unfolding Sphere, 2016. Installation view at Kimsooja - Archive of Mind at MMCA, Seoul. Courtesy of MMCA and Hyundai Motor Co. and Kimsooja Studio. Photo by Aaron Wax.
Archive of Mind, 2016, participatory site specific installation consisting of clay balls, 19 m elliptical wooden table, and sound performance Unfolding Sphere, 2016. Installation view at Kimsooja - Archive of Mind at MMCA, Seoul. Courtesy of MMCA and Hyundai Motor Co. and Kimsooja Studio. Photo by Aaron Wax.
새로운 빛을 밝히다
김수자, 후 한루 대담
2017
-
Hou Hanru
여행에 관한 이야기로 우선 시작해보자. 요즈음 우리는 끊임없이 여행을 한다. 지난주 우리는 뉴욕에서 만났는데, 이제 당신은 베를린에 있고 나는 로마에 있다. 일상에서든 미술에 관한 것이든, 여행은 오늘날 우리 삶에서 필수적인 활동이 되었다. -
Kimsooja
그렇다, 여행은 점점 삶의 방식으로 자리 잡고 있고, 우리는 이동하며 살고, 또 이동하며 일하고 있다. -
Hou Hanru
이렇게 여행하는 삶은 우리 존재의 일부가 되었고, 또 여행은 당신의 작업에서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초기부터 한국 전통 이불보를 사용한 보따리를 만들며, 여성의 관점에서 정체성 문제를 제기해왔다. 또한, 끊임없이 여행하고 이동하는 노마드와 이주자의 관점을 통해 세상을 바라본다고 할 수 있겠다. 현대인에게 여행은 자신의 정체성을 되묻는 하나의 도구가 되기도 한다. -
Kimsooja
그렇게 된 셈이다. 사실 여행은 늘 내 삶의 일부였다고 할 수 있다. 한국에서만 하더라도 어렸을 때부터 거의 몇 년마다 이 도시에서 저 마을로 이사를 하곤 했는데, 어린 시절, 직업군인인 아버지가 근무하셨던 비무장지대 부근에서 몇 년을 살았다. 또, 결혼 후 남편이 군의관으로 근무할 때는 소록도에서 2년간 살기도 했다. 그곳은 한센병 환자들을 돌보는 국립 의료 기관이 있던 특수한 곳이어서 일반인이 살 수 없었다. 방랑하며 떠도는 가족의 일원으로서, 어린 시절부터 여행은 자연스럽게 나의 일상이 되었다. 이처럼 일시적으로 거쳐 가는 장소와 시간으로부터 큰 영향을 받으며, 자연과 인간성(humanity)에 대한 나의 시각적 경험과 관점이 형성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1978년 홍익대학교 재학 시절, 일본 오사카 대학교에 방문했던 것은 내게 중요한 여행이었다. 이 여행을 통해 나는 아시아의 여러 문화와 그 차이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기 시작했고, 이때 한국의 문화적 정체성에 관해 보다 명확하게 눈을 떴다고 할 수 있다. 당시의 일본 여행을 계기로 내가 성장해온 문화, 즉 건축, 가구, 언어, 자연, 색감 등 구조적 요소들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었다. 일본은 거리상 매우 가깝지만, 미학, 색과 형상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감성이 매우 다르다는 것을 발견했다. 당시 자연, 캔버스, 온갖 십자형의 시각적 요소에 자리한 수직과 수평의 구조에 대해 연구했고, 이를 토대로 대학원에서 고미술에서부터 동시대 미술에 나타난 십자가 형상에 대한 졸업 논문을 썼다. 1984년 나는 프랑스 정부 장학금을 받아 6개월간 파리에 머무르게 되었다. 이 시기에 유럽의 고전 문화와 미술을 직접 접하게 되었는데, 이때 나는 ‘유럽 미술사 이후에 어떤 새로운 미술과 문화가 있고, 또 어디에 있는 것일까?’라고 자문하기 시작하며 무관심했던 미국 문화에 비로소 흥미를 느끼기 시작했다. -
Hou Hanru
이 경험을 통해 당신의 삶과 작업 모두가 새로운 방향을 갖기 시작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또한, 당신이 여행하면서 겪은 일들은 지역적인 것에서 세계적인 것으로 변화했다. 그러면서 보따리의 이미지는 집이라는 보금자리에 머무르려는 것과 전 세계를 여행하는 것 사이의 긴장 관계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
Kimsooja
당신과 한스 울리히 오브리스트(Hans Ulrich Obrist)가 공동 기획했던 《떠도는 도시들 Cities on the Move》(1997)에 선보였던 퍼포먼스 및 비디오 프로젝트 <떠도는 도시들-2,727km 보따리 트럭 Cities on the Move-2,727km Bottari Truck>(1997) 전까지 우리 가족은 매번 보따리를 싸고 풀었는데도 그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 이 프로젝트는 나
의 여행이 지역 단위에서 국제적인 범주로 확장하는 계기가 됐다. 이 작업을하며 떠돌았던 여행은 매우 개인적이었기 때문에, 나는 내가 글로벌리즘과 연관되어 작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본 적이 없었다. 오히려 이 프로젝트는 나와 우리 가족의 뿌리에 관한 기록에 가까웠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많은 사람들은 내가 글로벌리즘에 관해 논하고 있다고 여겼다. 그 퍼포먼스가 이주에 관한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는 그러한 견해가 틀린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결국 《떠도는 도시들》은 전 세계 여러 도시를 순회하게 되었는데, 제목처럼 전시도 그 방랑의 운명을 따랐고, 미술계의 국제 교류도 보다 더 활발히 진행되기 시작했다 -
Hou Hanru
뉴욕으로 이사했을 때에 관해 더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 -
Kimsooja
내가 뉴욕으로 떠났던 것은 일종의 ‘문화적 망명’이었다.
돌이켜 보면, 이 시기는 내게 매우 중요했고, 나의 중요한 퍼포먼스 작업인 <바늘 여인 A Needle Woman>(1999∼2001)과 <집 없는 여인 A Homeless Woman>(2000∼2001), <구걸하는 여인 A Beggar Woman>(2000∼2001)
시리즈도 뉴욕으로 이주했던 바로 직후 제작되었다. 마치 벼랑 끝에서 한 발을 공중에 내디딘 채, 나머지 한 발을 허공에 내딛고 서 있는 것 같았다고 할까? 한국을 떠나기로 결정한 것은 큰 모험이었고, 그로 인해 나의 주변 상황과 인간적 조건에 대해서도 더욱 철저하게 고민하게 되었다. 2008년 이후 수년간 파리를 오가며 일하다가 올해 들어 베를린에서 조금씩 머물기 시작했는데, 아직 확실하지 않지만 뉴욕과 베를린을 오가며 일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1990년대 후반 뉴욕에서의 삶이 시작되어 고심하던 때로 돌아가는 것 같아 내 삶의 우여곡절이 흥미롭기도 하다. 당시 새로운 사회에 나를 적응시키던 걸음 걸음이 무척이나 힘겨웠었다. 현재 베를린에서는 여러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사는 모아비트 지역에 머물고 있다. 이곳이 흥미롭기도 하지만 꽤나 낯선 느낌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작가로서 불확정적인 이 상황을 소중히 여기기도 한다. 거리감과 낯섦은 언제나 내가 더욱 객관적이고 비평적인 관점을 견지하도록 이끌어준다. 이러한 비평적 거리감을 늘 유지하고 싶은데, 그러한 면에서는 뉴욕이 내게 적합한 도시이다. 여행을 마치고 뉴욕으로 돌아올 때마다 이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이 도시를 새롭게 정의하게 되고, 또 전에 느끼지 못했던 특별한 감정을 느끼곤 힌다. 어떤 비판적인 관점을 잃어가는 것 같다고 느끼면 나는 나 자신을 또 다른 생경한 곳으로 밀어 넣곤 하지만, 결국 나 역시 평이한 삶의 리듬과 친숙함을 어느 정도 원한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 -
Hou Hanru
당신은 나에게 유교적 가치관에 영향을 받은 가정에서 한 한국 여성으로 살아가는 것에 관해 말해준 적이 있다. 1980∼1990년대에 한국이 매우 중요한 사회적, 정치적 변화에 놓여 있었다는 것을 당시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 같다. 군인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 변화를 다른 사람들은 인지하지 못했을 방식으로 느끼진 않았을까 한다. 이러한 배경이 당신의 사고방식과 작업 방식에 얼마나 영향을 끼쳤을까? 그러한 조건과 환경에서 해방되는 순간도 있었을까? -
Kimsooja
부모님 모두 몇 대째 가톨릭 신앙을 이어 온 집안에서 자랐다. 부모님은 매우 개방적인 분들이었으나 우리는 종손으로서 유교적인 한국 가정의 시스템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동시에 마치 피난민처럼 이곳저곳 정처 없이 이주하며 살았다. 때로는 위험한 지역을 오가며. 초등학교 시절에는 비무장지대 근처, 철원과 대광리 안팎을 오가며 살았는데, 이 지역은 과거 북한으로 이어졌던 경의선 종착지 바로 직전의 정거장이 있었던 곳이다. 월남한 간첩에 관한 이야기를 자주 듣기도 했고, 사고가 오늘내일 끊이지 않았다. 우리 가족이 살던 곳은 지뢰밭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다. 동네 아이들은 탄피를 주워서 놀기도 했고, 지뢰 때문에 크게 다치거나 동상에 걸려 손가락을 잘라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 나는 한국 전쟁이 발발하고 몇 년 후에 태어난 세대에 속하기 때문에, 우리 일상에 난입했던 전쟁과 갈등의 양상을 직간접적으로 겪었다고 할 수 있다. 더구나 국경 주변에서 일상적으로 겪었던 일들 때문에 나는 늘 ‘타자’를 인식하며 살아왔다. 경계와 그 경계 너머에 살아가는 이들을 생각하면서 나 자신과 타인의 관계에 대해 자문하게 되었던 것 같다. 경계(border)라는 개념, 그리고 이것에 대해 질문을 던지는 것은 내가 화가로 살아가는 태도와도 관련이 있다. 또 다른 경계인 캔버스에 반응하는 것처럼. 나는 내 앞에 놓인 경계 혹은 한계를 극복하고, 그 너머의 타자와 소통하려 노력해왔다. 바느질 작업의 심리 작용 역시 이와 같다고 할까. 보따리로 무언가를 싸는 행위는 삼차원적 바느질과도 같다. 그런 의미에서 감싸기는 통합하는 것이고. 경계는 언제나 내 작업의 기저를 이루고 있는 심리적 상태이자 과제인 셈이다. -
Hou Hanru
1980년대 한국은 군사독재에서 민주주의 사회로 변화했다. 당신 역시 이 시기 대중 앞에 작품을 전시하기 시작했는데, 초창기 전시 경험에 대해 이야기해 줄 수 있겠나. -
Kimsooja
처음 전시에 참여한 것은 1978년 대학교 3학년 때였다. 지금은 사라진 서울 그로리치 화랑에서 열렸던, 대학 동기 이윤동과의 2인전이었다. 나는 나무로 된 한국의 전통적인 격자형 문창살을 들고 숲속에 선 나의 퍼포먼스를 촬영한 사진과, 내가 제거된 상황을 투명한 필름에 실크스크린으로 인쇄하여 빨랫줄에 걸어 전시했다. 바닥에는 몇 토막으로 자른 가는 통나무를 선이 흐르는 방향을 따라 어긋나게 설치하고, 그 갈라진 틈에 투명한 사각 플라스틱을 끼워 넣어 투명성과 수직·수평성을 드러내고자 했다. 함께 전시했던 이윤동은 캔버스 천에 검은색 콜타르 염료를 드리핑(dripping) 기법으로 실험한 작업을 출품했는데, 이 작품은 중력, 물질성, 리듬에 관해 질문하고 있었다. 이후 나는 1980년대 중후반 일본과 대만에서 몇 차례 전시했고, 1990년대 초반부터는 워싱턴과 뉴욕 MoMA PS1, 뉴 뮤지움에서 작업을 선보였는데, 1990년대 중반부터 비엔날레를 무대로 본격적인 국제활동을 시작했다. 1995년 뉴욕의 브롱크스 미술관에서 LA 현대미술관으로 순회했던 《노동의 영역: 현대미술에서의 여성의 작업 Division of Labor: Women
’s Work in Contemporary Art》, 1995년 제1회 광주 비엔날레, 1996년 로테르담의 보이만스 반 뵈닝겐 미술관에서 열린 제1회 마니페스타, 1997년부터 세계 각지에 순회했던 《떠도는 도시들》, 1999년 하랄드 제만(Harald Szeeman)의 제49회 베니스 비엔날레 본전시 등이 있다. 그 당시 세계화의 확산은 우리의 사고방식과 작업 방식, 삶의 방식에 영향
을 끼쳤고, 이제는 국제적으로 일하는 것이 거의 불가피한 일처럼 되기 시작했었는데, 1990년대 중후반에 들어오면서 나 역시 점차 세계 도처에서 장소 특정적 퍼포먼스, 설치, 영상 작업 등을 하게 되었다. -
Hou Hanru
1990년대의 전환기 동안 많은 여성 작가들이 매우 대담한 작업, 특히 퍼포먼스를 다루었다. 당시 활발히 활동하던 또 다른 여성 작가 중 이 불 등도 마찬가지이다. 이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또한, 1998년 제24회 상파울루 비엔날레에 참여한 직후, 이듬해 왜 돌연 한국을 떠나기로 결심하였나? -
Kimsooja
나를 포함한 1990년대 한국의 여성 작가들은 자신의 신체를 통해 사회적인 억압을 표출하는 퍼포먼스 작업을 많이 했다. 이는 당시 가부장적 사회에서 한국 여성이 대면하는 사회적 지위, 또 억압과 관련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당시 많은 여성 작가들이 페미니즘을 지향하고 있었다. 하지만 퍼포먼스 아트는 1970년대와 1980년대 이미 한국에서 해프닝이나 이벤트의 형태로 성행하고 있었는데, 대체로 AG(Avant-Garde)나 여성 작가 정강자 외에는 주로 남성 작가로 구성된 ST(Space and Time)가 주도하고 있었다. 1990년대 중반 한국 여성들은 오늘날만큼 평등한 권리를 누리지 못했고, 일반적인 여성의 일상은 유교적 가치 체계와 사회적 가부장적 힘에 의해 좌지우지되곤 했다. -
1992년부터 이듬해까지, 뉴욕 MoMA PS1의 레지던시 프로그램에 참여한 후 서울의 서미 갤러리에서 첫 개인전을 가졌다. 여기서 <바느질하며 걷기 Sewing into Walking>(1994)라는 3개의 퍼포먼스에 의한 최초의 비디오 작업과 MoMA PS1 이후 한국에서 처음으로 보따리 설치 작업을 선보였다. 이미 싸매진 보따리로 갤러리 공간을 다시 ‘감싸는’ CCTV 영상과 함께 ‘미디어 보따리’로서 TV 모니터와 보따리를 설치하고 헌 옷들을 갤러리 바닥에 깔아 관객이 그 위를 걷게 했다. 이러한 작업들은 페미니즘과 쉽게 연결할 수 있었는데, 나는 이 ‘페미니즘’이라는 타이틀을 거부해왔다. 페미니즘은 나의 보따리가 가진 형식적이고 개념적인 요소, 그리고 내가 접근하려 했던 통합과 보편성이라는 가치를 대변하기에는 적절치 않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여성 작가들은 개인전이나 단체전에서 자신의 사회적 위치에 대한 반감을 표출했다. 여성 작가 개인으로, 이처럼 서열화된 한국 사회에서, 심지어는 국제 미술계에서조차 살아남기가 쉽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
1993년 MoMA PS1 레지던시를 마치고 서울로 돌아온 후, 이러한 한국의 사회적, 문화적 이슈들을 더욱 분명하게 인지할 수 있었다. 당시 한국은 경제 발전 덕분에 사회적으로 다양하게 변하고 있었지만 1997년 시작된 경제 위기로 급속히 흔들리게 되었다. 나는 제24회 상파울루 비엔날레의 한국 대표 작가로 선정되었지만, 정부로부터 타당한 재정적 지원을 받지 못했다. 브라질의 한인 지원과 이전에 아르코(ARCO)로부터 받은 특별지원 외에, 나는 당시 한국으로부터 그 어떤 충분한 지원도 받을 수 없었다. 때문에 내가 출품하려 했던<떠도는 도시들-11,633마일 보따리 트럭 Cities on the Move-11,633 Miles Bottari Truck>(1998)을 상파울루로 운송하는 것조차 어려웠다. 이 상황이 무척 실망스러웠고, 또 나를 무기력하게 했다. 결국, 이러한 상황을 알고 개인적으로 지원해주겠다는 한국계 브라질 이민자의 도
움까지 받기에 이르렀다. 여러모로 나는 한국에서 더이상 희망이 없다고 판단했고, 가족과 생이별을 하며 결국 뉴욕으로 떠나게 된 것이다. -
지금까지도 한국 미술계는 한국을 떠나 외국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작가들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나는 한국으로부터의 소외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도움 없이 작가로서 입지를 굳혀왔다. 1990년대 후반 경제 위기 이후, 서서히 성장하던 한국의 미술시장과 저널리즘은 공공연하게, 아전인수 격으로 관객의 눈을 가리고 미술계를 왜곡해온 사실이 많았다. 작가로서 내가 걸어온 길은 정부와 갤러리로부터 지속적인 지원을 받으며 기득권을 누려온 몇몇 한국 작가들과 완전히 다르다고 할 수 있다.
-
Hou Hanru
그 당시 기존 권력에 반대하던 학생들이 몇몇 중요한 미술 운동을 전개하고 단체를 조직한 것으로 알고 있다. -
Kimsooja
민중미술이 대표적인 사례인데, 1980년대부터 난지도, 메타복스(META-VOX)같이 기존의 흐름에 반기를 든 세대와는 다른 모더니즘과 포스트 모더니즘 단체의 활동도 이어졌다. 주로 내가 수학했던 홍익대학교 출신 작가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단체들이 만들어졌고, 뒤따라 뮤지 엄(MUSEUM), 타라(TARA), 로고스 & 파토스(Logos & Pathos) 등이 결성되어 활동했다. 이들 단체의 일부 구성원을 잘 알고 있었지만 나는 이런 흐름에서 완전히 독립되어 있었다. -
Hou Hanru
당시 민중미술과 당신 세대의 작가들이 개념적이고 실험적인 형태의 작업을 시도하는 새로운 경향을 드러냈는데, 특히 퍼포먼스와 설치 작품이라는 분야에서 두드러졌다. 여기서 당신은 어떤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는가? -
Kimsooja
우리 세대에 앞서, 단색화 작가들과 동시대에 활동했던 AG, S.T그룹 같은 실험적이고 개념적인 미술 단체의 모더니즘 운동이 있었다. 단색화는 특히 홍익대학교 교수들을 주축으로 그 담론을 구축하며 세력을 공고히 하고 있었지만, 나는 개인적인 관계를 떠나 단색화 이론이나 활동, 그 어느 것도 따르지 않았다. 내 또래와 단색화 작가들 사이에는 큰 세대 차이가 있기도 했고. -
홍익대학교에서 1976년부터 1980년까지 학사 과정, 이후 1982년부터 1984년까지 석사 과정을 밟고 있을 때, 민중미술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이 운동을 주도하는 일부 구성원을 개인적으로 잘 알고 있었다. 지적인 차원에서 관심을 두기는 했지만, 그들이 나에게 민중운동에 동참하기를 바랐을 때 그럴 수 없었다. 왜냐하면, 나는 정치적 이슈에만 몰두하는 것에 일종의 거부감 같은 것이 있었고, 일부 정치적 미술이 내재한 공격적 측면에 공감할 수 없었다. 당시 나는 추상적이고 행위적이며, 개념적인 순수 미학을 지향하고 있었다. 지금까지도 그 어떤 단체나 집단 활동에 전혀 관심이 없다. 대학생 시절, 나는 교수, 화가 대부분이 속해 있던 단색화 그룹이 화단을 지배하다시피 하는 경향에 질문을 던지면서 여기서 나를 분리하고 독립하려고 노력했다. 또한, 동기들에게 여러 가능성과 관점을 제안하고 대화의 창구를 열기 위해 수업 시간에 의도적으로 단색화 교수들과 상반되는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정치적 서열, 미술계의 위계와 단절하기 위해, 또 나 자신 본연의 모습을 지키고자 자신을 완전히 고립시켜왔다. 지난하고 외로운 여정이었다. 내 퍼포먼스와 설치작업의 영향력에 관해서는, 대형의 장소 특정적인 설치작업 혹은 1990년대 말과 2000년대 초반의 글로벌한 퍼포먼스 작업이 젊은 작가들에게 영향을 끼친 것 같다. 이후 그들의 작업 규모나 재료에서, 또는 장소성에 있어 글로벌한 이슈를 다루는 것을 자주 목격해왔다. 그리고 최근 나의 관심사 중 하나로서 지속적으로 문맥화하고 있는 바느질과, 그에 연관된 바늘과 실의 관계, 거울, 싸매기, 풀기 등의 개념들이 서서히 현대미술 사조 내에서 확산되고 언어화되고 있는 것을 자주 목격한다. 특히 몸의 정체성과 직조의 방식에서.
-
Hou Hanru
사람들은 미술계를 주도하는 인물로서 당신을 이불이나 최정화 작가 같은 좀 더 젊은 세대와 자주 동일시하곤 한다. 이들은 그 시기 사회정치적 상황에 정면으로 맞서면서 유사한 입장을 표출했다고 할 수 있다. 이 불의 작업은 압제에 반대하는 일종의 보복적 성격을 띠는 반면, 당신의 작업은 명상과 초월성에 훨씬 더 가깝다. 그리고 당신은 직물이나 보따리같이 사람들이 친밀하게 느끼는 소재를 사용했다. 어떻게 이러한 조형 언어를 구사할 수 있었나? -
Kimsooja
나는 천성적으로 그 어떤 종류의 폭력이나 정제되지 않은 감정 표현을 꺼리는 사람이다. 그렇기에 지속적으로 비폭력성을 다루는 자기성찰적 작업을 해왔고, 이것이 개인과 사회에 대한 나의 입장이기도 하다. 그 어떤 정치적 이슈에도 직접 관여하지 않았고 또 그럴 수도 없었다. 내가 만들어낸 미술 언어는 언제나 치유와 관조의 관점에서 비롯했는데, 아마 폭력에 민감한 나의 취약성과 인간에 대한 연민에 기인했을 거라고 본다. -
이 취약함은 어린 시절 휴전선 근방에 살았던 나의 경험에 근간을 두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나는 선천적으로 상처받기 쉬운 성격이고, 그 어떤 폭력적 장면도 볼 수 없다. 하지만 오랜 시간 소리 없는 저항과 인내로 내성이 생긴 것도 사실이다. 나는 대체로 주변 사람들을 포용하고 또 소통하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 그러한 성향은 캔버스의 표면에서도 반응하며, 나를 구조적인 측면 이외에 치유를 위한 하나의 방법론으로서 바느질에 주목하게 만들지 않았나 한다. 바늘의 잠재적인 폭력성에도 불구하고. 나만의 예술 매체를 탐색하며 이 세상에 산재한 십자형의 구조들을 집요하게 주시했다. 1983년 어느 날, 어머니와 이불보를 만들었던 경험을 통해 회화의 방법론으로서 바느질을 발견했다. 어머니와 마주 앉아 뾰족한 바늘 끝으로 부드럽고 선명한 색깔을 가진 비단을 막 꿰매려던 찰나, 마치 온 우주의 에너지가 나의 몸을 통과해 바늘 끝에 닿는 것 같은 전율과 함께 놀라운 충격을 받았다. 이때 곧바로 경계와 표면, 그리고 바늘이 꿰뚫고 가는 종횡의 직물 구조와의 관계를 인지했다. 대부분의 천은 수직·수평의 패턴으로 직조되어 있는데, 나는 이를 하나의 회화로서, 표면의 구조를 탐구하는 또 하나의 방식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경험은 선천적으로 상처받기 쉽고, 주변을 감싸고 연결하고자 노력하는 나 자신을 ‘함께 엮어 직조’하는 순간이기도 했다.
-
동시에 이때는 내가 캔버스의 표면 구조에 관한 미학적 딜레마를 겪고 있었던 시기였다. 대학 생활을 시작한 후 여러 해 동안 나만의 회화적 방법론을 찾고자 노력하던 중, 일상의 천을 캔버스 삼고 바늘을 붓 삼는 바느질을 발견했던 거다. 바늘과 바느질이라는 개념은 자연스럽게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차원으로 확장되어 나갔고, 나의 최근 작업까지 광범위하게 확장되어 왔다.
-
Hou Hanru
이처럼 당신은 오랫동안 이불보를 싸고 풀고, 함께 여행할 뿐 아니라, 이를 설치 작업으로 전개하며 바느질 작업을 점진적으로 발전시켜왔다. 이 이불보는 짐이라기보다 함께 다니는 동료에 가까운데, 말하자면 같이 여행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된 거다. 당신이 세계 이곳저곳으로 이동할 때 동반할 수 있는 하나의 삶을 갖게 된 것과 같다고 할까? 지난 몇 년간 다른 지역과 문화에서 비롯한 다양한 직물까지 다루면서 이러한 관심사를 확장해온 것처럼. 즉, 페루에서 그 지역의 여성들과 작업하고, 또 그 직물문화를 영상에 담은 <실의 궤적 I Thread Routes - Chapter I>처럼 말이다. -
Kimsooja
그렇다. 나의 최초의 영상 작품인 <실의 궤적 Thread Routes>(2010~2016) 연작은 유럽의 레이스 문화(II장), 인도의 자수와 판목 날염 문화(III장), 중국의 자수문화(IV장), 그리고 미국 원주민의 직물과 바구니 제작 문화(V장) 등을 다루었다. 조만간 아프리카에 관한 작업(VI장)을 진행하고자 한다. -
Hou Hanru
그러한 작업을 통해 당신의 이상(vision)에 새로운 문화가 더해지리라 보는데, 어떤가? -
Kimsooja
<실의 궤적>은 과거 실과 바늘, 캔버스이자 구조로서의 직물과 자연, 그리고 건축과 문화 전반에 어떻게 접근했는지를 총망라한 회고적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작업에 대한 아이디어는 2002년 벨기에 브뤼주 길거리에서 레이스를 만들고 있는 중년 여성의 손동작과 그 보빈 레이스 (bobbin lace) 기구의 움직임을 처음 보았던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나는 그 자리에서 이 레이스 제작을 그 지역의 남성적인 건축 구조물들과 비교 해석하며 영감을 얻었다. 하지만 이 프로젝트를 실제로 구현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렸고, 결국 2010년에 16mm 필름 카메라를 사용하여 페루의 직물 문화부터 촬영하기 시작했다. 서사(narrative)가 없는 시적 다큐멘터리 필름으로, 촬영지 주변 환경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소리와 시각적 요소만을 최소한으로 사용했다. 나는 ‘인류학적 시(anthropological poetry)’로서 이 프로젝트에 접근하고 싶었다. 그래서 전 세계 여러 직물 문화를 다루는 길고도 고요한 여정을 통하여 서로 다른 제작 방식과 문화적 유사성, 차이점을 드러내고자 했다. 카메라 렌즈를 통해 각 문화가 가진 특수성, 직물, 건축, 자연, 삶의 방식, 의상 등을 살아있는 상태로 나타내고 싶었던 거다. -
지금까지 누군가 사용했던 이불보를 작업에 사용해 온 이유는 내가 오리엔탈리즘이나 한국의 지역적 미학에만 관심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한국의 이불보야말로 한국에서 살았던 내 삶의 정체성에 있어 큰 부분이었기 때문이다. 유럽인이나 미국인이 그들 지역의 재료를 사용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기에 이불보 역시 전혀 이국적이지 않다고 해야 맞다. 서구 중심적 사고가 여전히 이불보를 그런 식으로 보고 있는 것뿐이다. 보따리 작업을 위해 선택한 이 이불보라는 타블로(tableau)는 원래 몸 이외에 무엇을 싸매기 위한 천이 아니었다. 처음에 감싸는 작업 방식을 위해 이불보를 선택했던 것은 우리가 태어나고, 사랑하고, 꿈꾸고, 고통받으며, 죽어가는, 즉 삶을 압축한 하나의 ‘틀’로서, 또 우리가 몸을 누이고 쉬는 장소가 바로 ‘이부자리’이기 때문이었다. ‘이부자리’라는 이 상징적 장소는 우리의 삶 전체를 포괄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이불보는 강한 색채가 유난히 눈에 띄고, 때로는 매우 극단적인 보색으로 이뤄져 있는데, 어떤 미학적인 이유로 그러한 색을 선택한 것은 아니었고, 이미 그 천과 문화적 코드의 상징적 요소로 따라왔을 뿐이다. 나는 그저 이미 만들어진 것, 그리고 결혼하면서 우리 조상과 부모님이 물려 주신 것을 그대로 차용하였던 것일 뿐이다.
무언가를 싸고 푸는 방식은 1993년 어느 날 MoMA PS1 스튜디오에서 내가 만들어 놓았던 보따리 하나를 바라보다가 문득 재발견한 것이다. 그 보따리는 우리가 어느 문화권에서든지 찾아볼 수 있는 평범하고 보편적인 사물이었다. 그러나 나는 그때 그 보따리가 완전히 다른 맥락에 놓여 있음을 발견했다. 감싸진 이불보가 갖는 캔버스로서의 회화, 레디메이드, 그리고 이미 사용된 오브제(readyused object), 형상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하나의 조각으로서의 보따리를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된 것이다.
-
Hou Hanru
당신의 최근 작품 중 <앨범: 경계를 엮기 An Album: Sewing into Borderlines>(2013)는 몇 해 전 미국 연방정부(GSA)의 예술 프로그램으로 제작되었다. 이 작품은 미국과 멕시코 국경을 다루고 있는데, 처음에 당신은 미국 정부가 추방한 사람들과 작업하려 했으나 연방정부가 협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미국과 멕시코 국경을 넘어 출퇴근하는 이민자들과 작업하기로 했다. -
Kimsooja
미국 국경을 넘나드는 멕시코 이민자들을 위해 이민과 관련된 개인사를 다루며 긍정적이고 포용적인 측면에 보다 집중한 작업이었다. 당시 오바마 정부는 경제 위기가 시작된 이래 작가들의 활동을 지원했다. 이민 문제가 거부보다는 환영에 가까웠을 때다. -
Hou Hanru
하지만 새로 들어선 트럼프 정부의 정책 때문에 이 문제에 관해 새로운 질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새로운 정치 구조로 인해 또 다른 상황이 주어진 거다. 이러한 변화가 당신의 작품 활동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보는가? 당신은 남성들과는 매우 다른 삶과 경험을 가진 여성 이주민들에 관심을 기울여 왔다 -
Kimsooja
사실 이민 문제에서 여성은 그 중심에 있다. 여성은 모든 가족 구성원을 연결하는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이들은 주로 기차, 자동차, 버스같이 가시적인 수단을 통해 이동하는데, 불법 이민일 경우 체포될 가능성이 높은 방식이다. 때문에 통상 3분의 1에 해당하는 이주 여성이 추방된다. 남성은 위험 요소가 더 큰 방식을 택하는데, 주로 도보로 사막을 횡단하거나 보트를 타고 간다. 심지어 국경을 넘기 위해 파놓은 지상과 해상의 터널들도 있다. 여성은 보통 다른 이들을 위해 일을 하며 점진적인 이민 방식으로 생존해간다. 예를 들어 다른 가정이나 작은 상점 등에서. 이들은 단기간 한 장소에 머물고, 일정 수익을 얻으면 다시 이동한다. -
Hou Hanru
이 프로젝트는 이민자들이 붙잡히고 구금되는 미국과 멕시코 국경 바로 위에서 전개되었다. -
Kimsooja
그렇다. 이 프로젝트는 애리조나 주의 새로 확장한 마리포사 입국장에 입항할 수 있는 입구이자 출구에 영구적으로 설치됐으며, 미국과 멕시코 국경선 바로 위에 자리 잡고 있다. 대형 LED 화면에는 출퇴근하며 매일 국경을 넘나드는 이민자들의 얼굴이 리드미컬하게 떠올라 머무르고, 또 사라진다. 심리적 여정의 시간 흐름을 보여주며 각 인물의 앞모습과 뒷모습을 촬영했는데, 내가 개개인의 이름을 부르면 카메라를 향해 돌아보는 방식이었다. 이는 그들 자신과 다른 사람 사이의 심리적 경계를 만드는데, 첫 번째 타자는 카메라, 그다음 타자는 관객이다. 나는 이들의 정신적 경계와 작품이 설치된 정치적 경계의 접점에 주목했다. -
사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미국 이민의 현실과 멕시코인들의 삶의 조건을 더 이해하게 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정책, 특히 멕시코에 관한 정책 때문에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지형도가 변했다. 우리는 새로운 시각으로 이민을 바라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는 현재 전 세계인들에게 매우 시급하고 중대한 사안이 되었다. 나는 지난해 멕시코 이민자들이 마주하는 새로운 현실을 리서치할 기회가 있었다. 멕시코의 여성이민협회 등 여성들의 이민을 지원하는 다양한 기관이 활동하고 있는데, 흥미로운 점은 여성이민협회가 미국의 비영리 기관의 지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다. 나는 남미, 특히 멕시코에서 이주하는 여성들이 놓인 여러 상황을 조사했다. 멕시코를 통한 이민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고, 이민을 돕는 기관들은 억류된 가족 구성원, 여성 혹은 아이들에게 안식처를 마련해주며 교육 프로그램을 비롯한 많은 지원책을 제공하고 있다. 일반적으로는 이주 과정에서 가족은 흩어지고, 여성들은 구금되거나 멕시코로 되돌려 보내지기도 하는데, 이들의 자녀들이 미국에서 태어났다면 지원 기관들의 관리를 받을 수 있다. 아이들은 새로운
보금자리로 이동하게 되는데, 안타깝게도 불법 이민자인 어머니는 자녀를 만날 수 없다. 이후 미국인이 아이들을 입양할 수 있고 아이들의 성과 이름이 바뀐다. 그리고 이들의 생물학적 어머니들은 자녀에 대한 그 어떠한 권리도 가질 수 없게 된다. 그래서 이러한 가족들이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지원 기관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이 문제는 단지 한 개인의 이민 문제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 관련된 전반적인 이슈이기도 하다. -
이민 가정 내에서 여성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으면서, 새로운 필름 작업에 여성을 중심 인물로 고려하기 시작했다. 새로운 멕시코 이민 프로젝트에는 여러 국기를 몸에 걸친 여성 퍼포머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과거 스페인이 멕시코를 침략했던 경로를 배경으로 하여, 멕시코 밸리의 두 화산 사이에서 퍼포먼스를 촬영할 계획이다. ‘이츠타치우아틀(Iztaccíhuatl)’과 ‘포포카테페틀(Popocatepetl)’ 화산 사이이다. 이츠타치우아틀 화산은 ‘라 무헤르 도르미다(La Mujer Dormida)’, 즉 ‘잠자는 여인’이라고도 알려져 있는데, 이 두 화산에는 멕시코인에게 잘 알려진 남녀 사이의 슬픔과 영원한 사랑을 상징하는 신화가 있다고 한다.
-
Hou Hanru
이는 분명 이민 가정을 둘러싼 특정 문제를 넘어 다양한 이슈를 아우르고 있다. 나아가 모든 이들의 관계, 혹은 가족 관계의 문제를 연구하는 것으로 확장되어야 하겠다. 이번 서울관의 전시에서는 관객이 직접 만든 찰흙 공으로 뒤덮인 커다란 타원형의 탁자를 선보였다. 이 관객 참여형 작품에 관해 설명해 줄 수 있겠나? -
Kimsooja
나는 오랫동안 세라믹에 관심을 갖고 주시해왔다. 한 번도 실제로 제작해 보진 않았지만, 용기 그 자체보다는 그릇이 만들어 내는 허 (viod)의 공간이 더욱 흥미로웠다. 2016년 리옹 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요코 오노(Yoko Ono)의 개인전
《여명의 빛 Lumière de l'aube》을 위해 마련된 ‘워터 이벤트(Water Event)’에 미술관 관장으로부터 초청된 적이 있다. 요코 오노는 미술가들에게 물을 담는 용기를 제작해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나는 찱흙을 만지게 되었는데, 하나의 보따리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이자 무언가를 담는 용기로 찰흙 공을 떠올렸다. 물을 담기 위해 어떤 빈 공간을 만들기보다는, 이미 물기를 머금은 찰흙 공을 만들어 전시함으로써 환경 문제까지 다루고자 했다. 그래서 말라가고 있는 작은 찰흙 공 하나를 보냈다. 그때부터 찰흙 공의 여러 형상에 주목하며 찰흙 공을 만드는 행위가 이를 만드는 사람에게 어떠한 심리적, 명상적 영향을 끼치는지 관찰하게 되었다. 찰흙 공을 만들려면 손가락과 손바닥을 전부 중앙으로 밀며 힘을 가해야 한다. 또, 그 표면에 있는 모든 모서리 부분을 밀어 넣으며 매만져야 한다. 각진 부분을 매끄럽게 만들어야 하므로 완벽한 구 형태를 만드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양쪽에서 중앙으로 힘을 가하는 행위는 이 찰흙 공에 작용하는 중력을 만들어내는 것과 흡사하다. 가장 완벽하고 매끄러운 구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는 양 손바닥 사이에 찰흙 공을 굴려야 한다. 보따리를 만드는 것처럼, 두 손으로 무언가를 감싸는 행위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구를 만들기 위해 찰흙을 굴리는 행위를 반복하다 보면 마음속에 구 형상을 떠올리게 된다. 스튜디오에서 어시스턴트들과 찰흙으로 작업했을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 재료에 반응했고, 매우 열중하여 찰흙을 만지고 굴렸다. 이 즉각적 반응과 집중은 매우 인상적이었다. 그래서 이 작업은 나보다 참가자들에게 훨씬 중요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그래서 세계 내지는 우주를 상징하는 길이 19m의 거대한 타원형 탁자를 만들고, 관객을 그 자리에 모아 그 경험을 공유하도록 했다. 이 작품에서 참여자들은 각자의 공간과 시간을 누리지만, 어떠한 물리적 결과물과 마음의 상태에 도달하도록 함께 작업하는 프로젝트인 셈이다. 또 우주적 풍경, 마음의 우주를 만들어내면서 함께하는 공간, 공동의 커뮤니티를 창조해낸다. -
Hou Hanru
광장처럼 말인가? -
Kimsooja
그렇다. 이 거대한 타원형의 탁자는 총 68개의 불규칙적이고 기하학적 형태의 작은 탁자가 모여 이루어진 것이다. 탁자 아래에는 32개의 스피커와 16트랙의 사운드 작품 <구의 궤적 Unfolding Sphere>을 함께 설치했다. 이 작품은 완전히 마른 찰흙 공들이 구르고, 부딪혀 굴러가고, 스치는 소리를 담고 있으며, 4∼5명이 움직인 찰흙 공들이 각각의 다른 마이크에 녹음되고 편집되었다. 찰흙 공이 굴러가며 테이블의 각진 코너에 부딪힐 때 소리가 나기 때문에, 이 소리는 공의 기하학을 드러내는 셈이다. 그래서 사운드 작업의 제목도 ‘구의 궤적(Unfolding Sphere)’이라고 정했다. 공들이 큰 소리를 내며 부딪힐 때는 천둥 같은 소리, 우주적인 소리를 내기도 한다. 연이어, 오디오 퍼포먼스로써 내가 직접 물을 머금고 ‘그르르르’하며 목을 울리는 음향이 함께 편집되어 있다. 때로는 작은 시냇물이 흐르는 듯한 소리로 들리기도 하는데, 목에서 구르는 수포가 중력을 거슬러 공기를 밀어내기 때문에 움직이는 공의 수직성이 두드러지게 된다. 찰흙 공이 굴러가는 소리는 수직적인 힘이나 움직임을 갖고 있으면서도, 탁자의 수평축을 드러내게 된다. 나는 1970년대 후반부터 이와 같은 수직과 수평의 구조에 깊이 관심을 가져왔고, 이번 전시에서는 이러한 맥락에서 제작된, 나의 퍼포먼스 사진을 활용한 실크스크린 판화 작품 시리즈 〈몸의 연구 Structure-A Study on Body>(1981)도 선보인다. 이 작품에서 나는 팔을 90도로 기울여 삼각형, 원, 팔각형, 사각형 등의 기하학적 도상을 만들고 있다. 나의 신체와 그 움직임의 형태 사이에서 생성되는 기하학적 공간을 규정하기 위해 삼원색(빨강, 노랑, 파랑)을 사용했다. 이 작업들은 이후 수직·수평의 구조를 가진 나의 바느질 작업과 <바늘 여인>과도 직접 연계된다고 할 수 있다. -
Hou Hanru
우주적인 감각, 즉 신체와 세상의 연결을 언급하고 있다. 이 작업에서 흥미로운 점은 빛을 사용하면서 강조된 신체와 건축물 사이의 관계성인 것 같다. 예를 들어, 당신은 2006년 스페인의 마드리드 크리스털 궁전, 2013년 베니스 비엔날레의 한국관, 이번 국립현대미술관 전시의 설치 작업처럼, 창문에 회절격자 필름을 부착해 스펙터클한 환경을 조성해냈다. 빛이 스며들어와 무지개 효과를 만들며 내부 환경에 변화를 주면 우주 같은 느낌을 자아낸다. 베니스 비엔날레의 한국관의 <호흡: 거울 여인 Respirar–Una Mujer Espejo/To Breathe–A Mirror Woman>(2013)에서 빛과 소리가 완전히 차단된 적막한 공간이 설치되기도 했다. 이는 우주의 존재감을 나타내는 두 가지 측면 사이의 대조를 환상적으로 보여주는 거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전개된 새로운 작업인 것 같다. -
Kimsooja
이번 국립현대미술관 전시에도 크리스털 궁전과 베니스비엔날레에서 사용했던 필름과 같은 것을 사용했다. 이러한 작업은 회화나 안료를 빛으로 전환한 것이다. 특수 필름은 인치(inch)마다 수많은 가로, 세로의 금이 나 있어 직조된 듯한 구조를 보인다. 빛이 이 필름을 통과하면 보는 각도에 따라 색이 변하여 무지갯빛을 만들어낸다. 프리즘처럼. 이는 빛과 관련하여 내가 지속해오고 있는 회화, 캔버스, 색채, 안료의 구조에 대한 연구 중 하나이다. 나는 빛과 소리의 성질을 밝혀내기 위해 칠흑같이 어두운 절대 침묵과 암흑의 공간을 만들었다. 시각화하는 방법은 다른 작업과 정반대지만, 이 작업은 내가 삶과 예술에 내재한 이중성에 대해 던져왔던 질문들과 연결된다. 캔버스의 종횡 구조처럼 내가 이중성에 관해 제기하는 문제들은 정신적인 구조들, 우리 마음속의 만다라와도 깊은 관련이 있다. 나의 석사 논문 『조형기호의 보편성과 유전성에 관한 고찰: 십자형 기호를 중심으로』(1984)는 고대 유산부터 동시대 회화와 조각에 이르기까지 여러 작품에 나타난 십자 형태의 상징을 다룬다. 미술사 전반에 걸쳐 이 십자 형상과 구조를 찾아볼 수 있고 현재까지도 그 지속성을 발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구조와 모티프가 창조성과 혁신성을 갈구하는 동시대 미술에 어떻게 끊이지 않고 나타날 수 있는지 참으로 궁금했다. 피에트 몬드리안 (Piet Mondrian), 카지미르 말레비치(Kazimir Malevich), 요셉 보이스(Joseph Beuys), 안토니 타피에스(Antoni Tapies), 루치오 폰타나(Lucio Fontana), 프랭크 스텔라(Frank Stella) 등을 비롯한 많은 작가들이 이러한 근본적인 십자 구조를 대면해왔다. 나 역시도 예외가 아니며, 늘 세계와 인간의 정신에 깃든 내적 구조들에 관해 질문해왔다. 석사 논문에서 십자형 구조들과 칼 융(Carl Gustav Jung)의 원형 이론(archetypes theory)을 적용하여 만다라의 심리적 기하학 관계를 밝혀내고자 했다. 이는 예술과 삶의 이중성에 관한 나의 물음들과 무관하지 않다. -
베니스 비엔날레의 빛과 암흑 공간에 대해 더 이야기하자면, 뉴욕에서 이 전시를 준비하는 동안 허리케인이 몰아닥친 일이 계기가 되었다. 일주일이 넘도록 전원이 끊긴 완전한 암흑 속에 살아야 했다. 나는 그 시기 동안 칠흙 같은 어둠 속에서 지내던 아파트 건물과 거리를 걸으며, 누군가 나를 향해 걸어올 때 공포감을 느끼곤 했다. 그리고 결국 이러한 공포감이 타인에 대한 나의 ‘무지(ignorance)’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내 마음 속에, 또 관계 속에 자리한 이 무지는 내가 작품에서 만들어낸 공간에서 경험하는 어둠과도 같고, 결국 그 무지에의 질문을 관객에게 던지는 것이었다.
-
Hou Hanru
완벽한 마무리인 것 같다. 현재 우리는 일종의 암흑 속에 살아가고 있다. 우리는 이 암흑을 헤쳐 나갈 새로운 빛을 창조해내야 한다. -
Kimsooja
정확하게 그렇다.
— Essay from Exhibition Catalogue 'Kimsooja: Archive of Mind' published by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Korea, 2017. pp.18-85.